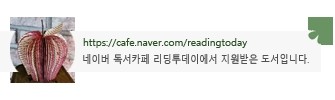이게 대체 무슨 결말인가-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이지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분위기와 심리 묘사가 탁월한 작품들이다. 마치 한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이야기들로, 읽다 보면 어느 새 작품에 푹 빠져 분위기를 음미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순간은 대체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것으로, 위대한 칭송을 받는 작가 모두의 작품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가가 그리는 사건들 속에서 한때 내가 경험했거나, 경험하지 않았어도 작가와 나의 궁합이 맞아야만 찾아오는 공감의 순간들. 표제작 <죽은 사람들>과 함께 실린 <애러비>와 <가슴 아픈 사건> 모두 '제임스 조이스'라는 작가의 존재를 알게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있다 여겨질 정도로 생각되는 주옥같은 작품들이었다.
<애러비>는 애러비 바자에 가지 못하게 된 짝사랑하는 소녀를 위해 대신 선물을 사다주기로 한 소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토요일 아침 숙부에게 애러비 바자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으나 숙부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그날 늦게 들어왔고, 소년의 초조함은 짙어져간다. 결국 늦게 귀가한 숙부에게 돈을 받아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에 도착했지만, 이미 불은 꺼지고 소년은 어둠 속에 잠겨 있다. 내용만 보면 '이게 뭐야??!!' 할만하지만, 소년의 무너지는 마음에 대한 분위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지다. 짝사랑하는 소녀를 향한 연정, 그 연정으로 인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던 마음, 아이의 바람을 아무렇지 않게 무너트린 숙부의 가혹함, 우여곡절 끝에 당도한 바자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어둠에 휩싸여야 했던 좌절된 소년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온다.
<가슴 아픈 사건>도 <애러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외롭고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던 한 남자가 어쩌다 마음이 통하는 여인을 만났다. 안타깝게도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몸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영혼의 교류는 한동안 지속된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버린 여인. 남자는 불에 덴 듯 그녀와의 교류를 곧바로 중지한다. 그러다 4년 후 우연히 여인의 죽음을 알게 된 남자. 자신과 교류가 끊긴 그 4년 전부터 망가져버렸다던 여인의 삶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된 남자는, 조용히 여인의 죽음과 삶을 떠올린다.
나는 이 남자도 여인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이라 생각했다.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것만이 그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라 여겼지만, 여인은 너무나 쉽게 자신의 마음을 남자에게 전달해버린다. 자신은 그런 부정한 남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사랑 앞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일까. 헤어진 후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나, 남자는 같은 하늘 아래 여인이 살아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았던 것이리라. 때문에 그녀와 헤어진 4년 전이 아니라,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금에서야 진정으로 혼자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불결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그 사랑을 거부한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타락이었음을 깨달은 남자. 그의 진한 고독과 외로움이 글자를 통해 생생히 전달된다.

<죽은 사람들>은 마지막 장면이 인상깊다. 눈이 내리는 밤, 아내가 잠든 숙소의 조용한 방에서 게이브리얼은 죽음과 삶에 대해 생각한다. 자신이 숨 쉬고 있는 이 세상에 생각보다 '죽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느낀 남자. 풍경과 게이브리얼이 느끼는 심리가 묘하게 맞아떨어져, 마치 책을 읽고 있는 나의 창 밖에 눈이 내리고 있고, 나와 이 책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줄거리 위주로 작품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도 있다.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들은 처음 읽었지만 이 작가는 줄거리에 중점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과 배경들의 묘사 속에서 독자들이 자신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기를 원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디 제임스 조이스가 선사하는 분위기에 푹 빠져들어보시기를. 그리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