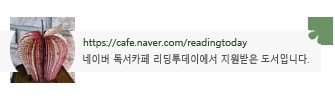-

-
핏빛 자오선 ㅣ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378
코맥 매카시 지음, 김시현 옮김 / 민음사 / 2021년 6월
평점 :




10여년 전쯤 알게 된 코맥 매카시. 지인의 추천으로 읽게 된 작품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였는데, 독서내공이 얼마 되지 않은 때 읽어서인지 이해하기 너무 힘들었다. 지인은 어떤 점에 매력을 느꼈을까 궁금해서 그 뒤 한 두 권 정도 더 읽어보기는 했지만 결국' 어렵다'는 인상만 가진 채 등한시. 그 코맥 매카시의 작품들이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으로 재탄생되었다. 예전 기억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마음으로 단단히 각오를 하고 읽기 시작한 책은 [핏빛 자오선]이다. [모두 다 예쁜 말들], [국경을 넘어], [평원의 도시들]을 포함한 '국경 삼부작'을 예고하는 작품이라는 평가에, 매카시월드를 제대로 접해보고자 단단히 마음 먹고 도전! 여전히 어려웠지만, 작가가 자아내는 시적인 문체와 그만의 세계에 푹 파묻혀 보낸 시간들이었다.
1833년 테네시에서 태어난,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소년이 열네 살이 되던 해 가출한다. 그 시기에 미국은 멕시코와의 전쟁이 끝난 뒤였지만 미국의 불법 군대들이 여전히 멕시코를 유린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멕시코는 미국의 위협과 내부의 인디언의 반란으로 혼란에 처해 있었는데, 반란자들을 색출하고 진압하기 위해 미국인 용병을 고용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 미국인 용병들은 잔혹한 아파치 대신 평범한 인디언이나 멕시코인을 죽이고 벗긴 머리 가죽으로 멕시코 정부를 속여 돈을 뜯어내기에 바빴다.
소년 또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정처없이 방황하고, 약탈과 살인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미국의 서부 지대를 통과한다. 우연히, 그러나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진 첫 살인 이후 입대하게 된 미국의 비정규군 부대. 그 곳에서 예전에 안면을 텄던 판사와 조우하면서 피와 살육 이외에는 그 무엇도 남지 않은 학살의 현장에 자리잡는다. 오랜 시간 계속되는 방화와 탈주와 학살. 인간의 거리낌없는 욕망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세계에서 소년과 판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판사는 왜 소년을 눈여겨 봤을까.
온몸이 마치 달처럼 반짝였다. 너무도 하얀 데다 커다란 콧구멍이든 귓구멍이든 가슴이든 눈썹이든 정수리든 그 거대한 몸 어디에도 털 오라기 하나 없었다.
p240
처음 판사의 몸에 대한 묘사가 등장한 이후 이상하게 자꾸만 그의 외모가 신경에 거슬렸다. 그 험한 길과 시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그런 몸을 가질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 판사에 대해 내가 가진 이미지는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자'였다. 작품 초반에 판사는 내커도처스 시내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린 목사를 모함해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한다. 목사의 이야기를 경청하던 사람들은 이내 폭도로 변해 설교가 이루어지던 천막은 찢겨지고 총성이 울리며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하는데, 이후 술집에서 다시 판사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린 목사가 행한 범죄를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오늘 처음 보았다'고. 판사는 분열을 조장하는 자, 껄껄 웃으며 사람들의 악행을 뒤에서 지켜보는 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부추김에 '사심'이 없다. 그저 매 순간을 즐기고 사람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제공할 뿐. 그런 그의 언행들과 대비되는 듯한 그의 몸은 그래서 더 기이하게 다가온다.
남자라면 누구나 그 감정을 잘 알고 있지. 공허와 절망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던가? 피는 바로 그 감정이 바짝 굳지 않도록 해 주는 완화제이지 않은가? 판사가 바싹 기대었다.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은 죽고 없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가? 답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인가? 아니면 인간이 감히 논할 수 없는 주제인가? 죽음이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이고자 하는 걸까?
p 456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보였던 판사지만 어쩌면 그는 오히려 더 죽음과 운명에 얽매여 있던 인물로 보인다. 인간의 목숨이 큰 가치가 없던 시대, 단 한순간에 누구나 죽을 수 있었던 시대에 그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 판사는 총을 들었나.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큰 의미를 둘 수밖에 없었고 전쟁이야말로 고귀하고 명예로운 삶의 현장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부추겨 죽음과 공포를 증식시키는 것이야말로 판사의 크나큰 즐거움, 자신만의 허무와 절망을 이겨내는 방법이었을까. 이 판사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해답을 알 수 없는 의문들이 꼬리를 잇는다.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된 작품이지만 그가 전면에 부각되지는 않는다. 마치 작품 속에 소년의 존재가 숨겨져 있는 듯한 기분. 중간중간 드러나는 소년의 모습은 마치 관찰자같기도 하다. 심지어 입대한 비정규군 부대가 인디언들을 학살하는 장면에서조차 어쩐지 그는 어딘가 한 구석에 몸을 숨긴 채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가출하고 첫 살인을 저지른 장면에서조차 세상을 초월한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 소년은, 그래서 더 판사와 대비된다. 마치 판사가 소년을 이 죽음의 현장에서 너도 날뛰어보라고, 너도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외치는 것만 같다. 느긋하게 웃고 있지만 내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허무와 절망으로 가득찬 판사와, 삶이라는 혼돈 속을 지나고 있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한 초연한 분위기를 내는 소년. 그래서 판사가 소년을 주시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그저 살아있으니 살아가는 듯한 사람들 속에서 인간은 날것 그대로의 욕망을 가득 분출시킨다. 그 자리에 자비란 없다. 어린 아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피와 공포로 가득해진 자오선. 선혈이 낭자하고 머리가죽을 벗기는 장면의 묘사가 잔혹해 질척거릴 것만 같은 이야기지만, 기이하게도 사막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건조하고 메말라있다. 어쩐지 흑백의 그림자극장을 연상시키는 작품 안에서 작가의 잔혹하고 시적인 언어만이 색채를 띠며 생동한다.
근래 읽은 소설 중 제일 어려웠던 작품. 오죽하면 [핏빛 자오선 읽기 지침서], [핏빛 자오선 해설] 이라는 책까지 나왔을까. 기회가 된다면 국내에서도 이 책들의 번역판을 만나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