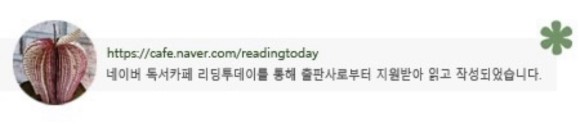-

-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김열규 지음 / 사무사책방 / 2021년 1월
평점 :




삶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했다. 숨이 멈춰지고, 이승이 아닌 저승으로 가는 것. '저승'이라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저 세상의 존재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이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었을까.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과는 달리 죽음은 예습할 수 없다. 아무리 죽음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묘사한 책이나 영상을 접해도 죽음의 순간이 아니면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갖는 두려움의 원천이 아닐까.
저자에 따르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죽음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여겨졌고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안하다며 꺼려지는 대상이다. 오죽하면 어지간한 빌딩에서는 3층 다음이 4층이 아니라 5층이거나 숫자 4가 아닌 F로 표기되었겠는가. 죽음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죽은 이의 영혼에 대해서도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가족의 영혼이라 해도 유령은 유령인 것이다. 그리하여 초상을 치를 때 입관하기 전에 염을 하고 수의를 입히고 시신을 일곱 매듭을 지어 묶는 것은 사령에 대한 공포감으로부터 비롯된 행위다. 공포는 대상을 따지지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까지 옮겨진다. 예전에는 아기무덤의 일부는 땅에 묻힌 옹기 뿐으로, 그 속에 아기시신을 구겨서 넣고는 땅에 묻은 뒤 큰 바위로 눌러버렸다고 한다. 아기, 처녀, 총각. 아이들과 미성년의 죽음을 무서워한 어른들. 저자는 그들을 애처롭다 여겼다.
죽음에 대한 이런 공포와 두려움의 이유를, 저자는 삶과 죽음을 따로 떨어트려 놓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되도록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풍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저자는 '인간은 죽음과 화해해야 한다' 고 이야기한다. 우리의 삶 안에 바로 죽음이 있다. 이런 생각은 비단 저자만의 견해가 아니라 조상들의 풍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동남은 예전부터 삶의 방향, 서북은 죽음의 방향이라고 특정지어져 왔다. 그런데 옛신라인은 죽은 이의 머리 방향을 구태여 동남으로 잡아주었는데, 저자는 이를 죽음을 삶의 연장선이라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다. 생과 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속에서 바라본 죽음에 대한 생각들. 용어들이 다소 낯설어 어렵게 다가온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도 생활 곳곳에 남아있는 풍습들을 읽어가며 과연 죽음이란 무엇이고 사는 내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정면으로 마주보게 되었다. 결국 저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 고민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웃음을 들이키소서. 죽음 앞에서, 부디 부디.
p 370
여든이 넘은 나이에 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면서도 지금의 삶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고 '몇 년간 까불고 살았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저자. 죽음에 대해 오랫동안 깊게 사색해온 어르신은 과연 죽음을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본인이 말씀하신대로 죽음 앞에서 웃음을 들이키면서 한평생 잘 살았다고 편안하셨을까. 여전히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지만, 우리 모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겸허히, 후회 없이 살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