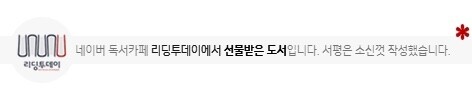-

-
당신을 막내딸처럼 돌봐줘요
심선혜 지음 / 판미동 / 2021년 6월
평점 :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는 되도록 읽지 않는다. 나 아프다, 힘들다-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기보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할 지 잘 모르겠어서. 감기처럼 가벼운 병도 아니고 어쩌면 죽음을 맞아야 할지도 모를 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의 책을 읽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괜찮아질 것이다, 꼭 나을 것이다, 힘내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도 나는 그런 말을 잘 하지 못한다. 옆에 그 사람이 있다면 등이라도 토닥여줄텐데. 도오저히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아이가 태어난 지 고작 3년이 되었을 때 림프종에 걸렸다. 장난처럼, 거짓말처럼 귓가에 들려온 병명. 림프종이 뭔지도 잘 몰랐던 저자는 일찍 퇴근하겠다는 남편에게, 오늘 회식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밥이라도 먹고 들어온다. 그런 아내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림프종이 암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하는 남편의 심정도 오죽했을까. 바로 입원했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저자는 생활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내가 왜 병에 걸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마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버티게 해준 것은 우연히 만난 누군가들이었다. 골육종에 걸린 수험생 딸과 함께 병원을 찾은 한 어머니. 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태연하게 꺼낸 그 어머니는 수능을 보고 싶다는 딸에게 문제집을 사다줬단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이가 수능은 봐서 뭐하냐는 친척들의 말에 '젊은 애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길 바라냐'면서 악다구니를 썼다는 그 엄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울음이 터졌다.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죽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중 대부분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아간다.
병에 걸린 후부터 자꾸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뭘 시작하려고 해도 자신이 없다는 저자에게 자원봉사자인 칠십 대 할머니가 이렇게 조언한다. '자신을 막내딸이라 생각하고 아이보다 자신을 더 돌봐줘요'라고. 아이도 중요하지만 엄마인 자신이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는 아이 돌봄도 힘들다는 것을 나도 안다. 아플 때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종종, 엄마들은 자신을 아이처럼 돌봐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생겨도 억울하지 않고,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게 된다.
비가 오면, 카페에서 비를 피했던 것처럼 잠시 비가 지나가는 걸 바라보면 된다.
어떤 드라마에서 우산이 없을 때조차 비가 와도 괜찮다는 대사를 들었다. 그냥 좀 맞아도 된다고. 조금 맞으면서 집까지 돌아가면 된다고. 우리 인생에 내리는 비를 원망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거나 괜히 마음을 다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비가 지나가기를 기다려보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우아함이다.
고생하셨어요. 앞으로 내내,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