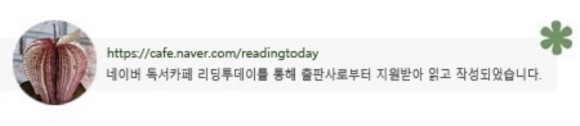-

-
보이지 않는 가위손 - 공포의 서사, 선망의 서사
도정일 지음 / 사무사책방 / 2021년 3월
평점 :




<사무사책방> 시리즈의 다섯 번째 도서, 도정일 작가님의 책으로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도서다.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만인의 인문학]과 [공주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위손] 중 이 [보이지 않는 가위손]은 꼭 누구나 읽어보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다. 앞의 두 도서에 담긴 인문학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통찰도 인상 깊었지만, 특히 [보이지 않는 가위손]에 실린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라 생각한다. 시간 차이는 좀 있더라도 예전과 현재의 모습이 그리 크게 변하지 않은 데다, 변하기는 커녕 더 악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의 주요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다. 시장전체주의, 공포의 문화, 선망의 문화. 시장전체주의는 경쟁을 기본으로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명목 아래 모든 것을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킨다. 시장전체주의가 낳는 경쟁의 무차별적 일상화를 특징으로 하는 정글사회의 도래라는 공포는 결국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낙오자, 열패자, 노숙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삶의 안정적 전망을 상실할 가능성에 대한 공황심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공포의 문화'라 부른다.
이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탈출구부터 찾는다. 공포의 문화를 조장하고 대중의 공황심리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착취하려는 사회세력은 이런 사람들에게 공포를 벗어날 방법, 행동지침과 목표, 성공의 모델을 끊임없이 제시해서 사람들이 그 처방을 따르도록 유도한다. 이것을 '선망의 문화'라 부르는데 '선망의 문화'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으로, 우리 시대의 문화, 광고, 상업시설, 교육까지도 '부자 되기의 서사'에 따라 움직이게 한다. 결국 시장전체주의와 공포의 문화, 선망의 문화가 끝도 없이 순환하면서 점점 악화되는 사회환경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대에 작가님은 인문학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묻는다. 특히 이번 책에서는 사회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도 물론 중요하지만)보다 교육과 대학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버드 대학 같은 곳에서도 과목을 재편할 때 교양과목을 중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양과목을 등한시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인문학을 지켜내기 위한 대학 내 교수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반성을 촉구한다. 분명 쉽게 꺼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미있게 다가오는 목소리다.
이 책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일본이 과거를 인식하는 시각에 대한 문제였다.독일과 일본의 차이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 인상적인 이유는 '자신이 자신을 객체화 한다'는 관점에 대해 알았기 때문이다. 자신을 객관화하는 서술방식 자체를 거부하는 일본.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나름 정리한 것을 적어본다.
-일본이 자기를 회복해내는 기억의 서사에서 과거의 일본과 현대 일본은 단절되어 있지 않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인, 희생된 일본인 모두 '같은 일본인'
-이 상태에서는 그들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이 현대 일본인의 도리이고 의무
-과거의 일본과 현대의 일본은 분리될 수 없는 연속적 동일체
-그러므로 과거와의 단절은 부도덕 행위
-그러나 군국주의 일본의 과거는 압도적인 가해행위, 가해자의 기억
-가해행위는 일본인의 기준으로 따져도 도덕적이지 않음
-여기서 동일성 회복의 도덕성과 그것의 부도덕성이라는 상호배반적 문제가 발생
일본적 서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것은 기억의 미화, 왜곡, 변조, 사실 부정이라니, 어째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피해국가들에게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지 그 언행들이 이해가 되는 이야기들이었다. 나는 정리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이 작가님의 머리속에서 구성될 수 있다니, 그저 감탄스러울 따름이다!

지금까지 도정일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드는 감정은 답답함이었다. 시장 전체주의와 공포의 문화, 선망의 문화가 이미 활개를 치고 있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답답함. 작가님은 인문학의 가치와 교육 목표 자체를 적극적으로 '사회'에 연결시키는 전략의 구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나는 이 말조차도 어렵기만 하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경쟁에 대한 부추김. 이 책을 읽고나니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살아가게 했다는 미안함으로 어찌해야 할 지 모를 정도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점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뜨였다는 것일까. 이 책마저 읽지 않았다면 그저 '어쩔 수 없지, 사회 문제를 어떻게 개인이 해결해'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나 또한 아이들에게 세상에 맞춰 살아가기를 요구했을지도 모른다. 모두가 파도에 휩쓸려 갈 때 나라도,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라도 시장전체주의 안에서 헤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앞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보여주고, 전달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