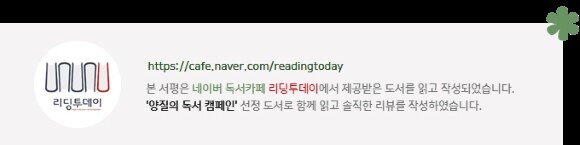-

-
네 이웃의 식탁 ㅣ 오늘의 젊은 작가 19
구병모 지음 / 민음사 / 2018년 6월
평점 :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점부터 가슴이 답답해졌다. 실험공동주택으로 이사온 은오와 요진을 맞이한 다른 세 이웃들 때문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홍단희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네'라며, 굳이, 요진이의 직장이 어디인지 궁금해하고, 그녀가 사실은 약국에서 보조로 카운터를 본다고 말하자 카운터면 어떠냐면서 강교원과 주거니받거니 위로라고 생각되는 말들을 뱉어내는 모양새를 보고 있자니 피로감이 몰려왔다.
타인과 관계맺는 것에 부정적인 편이다. 좋게 말해 부정적이지 사실은 사람을 잘 믿지 않는다. 기본적인 예의는 탑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지 않나. 누군가와 얽혀 신경쓰지 않아도 될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괜히 상처받고, 다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에 지쳤다고 해야 할까. 어느 순간부터 '남은 남, 나는 나'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들어앉아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타인에 대해서는 냉소적이기까지 하다. 방어기제라고 해도 좋지만,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호구조사를 당하는 것은 정말 사양하고 싶다.
그런 점에서 이 '홍단희'라는 인물은 느무 신경에 거슬렸다. 급기야 아이들을 모아 공동육아를 하잔다. 프로그램이 잘 짜여있고 체계적이라면 공동육아도 괜찮다. 한때 나도 집주변 공동육아를 열심히 알아봤었으니까. 하지만 너는 요리를 잘 하니 아이들 식사를 맡아라,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만들기를 좋아하니 아이들 미술과 공작을 담당하겠다-식의 주먹구구 경영이라면 불보듯 뻔하다. 게다가 모두가 협조적인 것도 아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인 효내는 아이가 깨어있는 동안에도 앞에 앉혀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판인데, 낮잠 잘 동안 간신히 짬을 내어 하는 일이 동네 주민과 알맹이 없는 수다를 떠는 일이라면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할까. 각자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 얼마 되지 않는 이웃인데 친하게 지내야지, 다수결로 이렇게 결정됐는데 너는 이 정도도 양보 못해?-식의 협조를 강요하는 상황이라니,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힌다. 내가 이랬으니 너도 이래야 해-라는 사고방식. 으아.
열두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실험공동주택에 고작 네 가구가 모였을 뿐인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누군가의 남편은 남의 부인에게 아슬아슬한 수위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워낙 적은 가구가 모여있다 보니 부부싸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대체 이 주택을 만든 사람은 무슨 정신으로 그런 널찍한 식탁을 만들었단 말인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 갈등과 다툼이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만약 현실에 이런 장소가 있다면 당장 달려가 따져물었을 것이다. 이웃, 공동체-라는 단어에서 더 이상 따스함을 느끼지 못하는 나의 메마른 정서 탓인가 싶으면서도, 결국 이것이 현실이라는 자각에, 문득 아이들은 부디 나의 이런 염세적인 성향을 닮지 않았기를 바라는 모순적인 마음이 불쑥 솟아오른다. 복잡한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