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 - 글쓰기로 한계를 극복한 여성 25명의 삶과 철학
장영은 지음 / 민음사 / 2020년 3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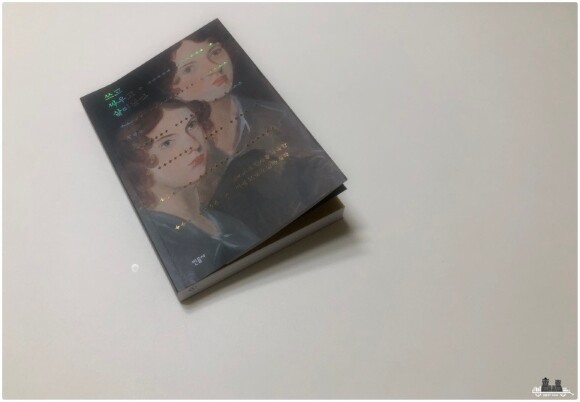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잠이 더 줄었다. 이유는 하나. 새벽에 책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첫째 아이 때는 한 1년 동안 책 읽을 엄두도 못냈었다. 책을 읽는 대신 아이를 더 챙겨야 한다는, 스스로 만든 우리 안에 갇혀서 그야말로 살신성인 육아를 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못견디겠는 거다. 아이는 물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나에게 왔는지, 경이롭고 신기했다. 하지만 반복적인 일상, 똑같은 하루하루. 그러다 1년이 조금 넘게 지난 후 조금씩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둘째가 생겼다. 둘째 아이를 낳고서는 책읽기를 도저히 놓을 수가 없어 시간을 분으로 쪼개 책을 읽었다. 새벽에 유축하면서, 아이가 낮잠을 잘 때, 잠깐 이유식을 데우면서. 아이들을 재운 뒤 다시 나와 책을 읽고 리뷰를 쓰는 나를 보면서, 남편은 다음 날을 위해 잠을 자라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에게 물었다. 잠까지 줄여가면서 책을 읽고 리뷰를 적는 의미라. 그 질문에,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말을 빌려, 이제야 나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신이 누구인지 온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했다고.
장영은의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는 글쓰기로 한계를 극복한 여성 25명의 삶과 철학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여성이라서, 유색 인종이라서, 사상이 달라서 타인에 의해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놓칠 수도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뛰어넘어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 지 격정적이면서도 담백한 문체로 풀어놓는다. 80세가 훌쩍 넘어 생각해봐도 평생 제일 좋았던 날은 책이 도착하는 날들이었다는 도리스 레싱. '나는 이제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선언했던 버지니아 울프. 누군가를 제대로 격려해주는 일이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경험했던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 더 말이 필요 없을 프리다 칼로와 '우리는 모두 거의 항상 스스로 괴물 같다고' 느끼며 살았을 앤 카슨. '구원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지금 쓰고 읽는 것에 존재한다'고 했던 제이디 스미스와 '영혼은 자신의 것이며 지옥을 피할 수 없다면 견딜 것'이라 단언한 에밀리 디킨슨.
여성이 여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삶의 원칙을 수호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와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사회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 크리스타 볼프, 문학이 인류를 발전시켰다고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마거릿 애트우드. 어떤 장애가 가로막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정신을 붙들고 싶었다는 수전 손택, 세상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간구했던 에밀리 브론테, [빌러비드]로 단번에 최애 작가가 되어버린, 인간의 이성과 역사의 진보를 긍정했던 토니 모리슨. 문학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나딘 고디머와 자신의 참된 만족과 자유가 무엇인지 탐문했던 가네코 후미코, 역경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글 쓰기를 멈추지 않은 박경리 선생님, 문학 속에서 자신의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본능을 되찾았다는 헤르타 뮐러 등.
이 수많은 여성들 속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은 인물은 실비아 플라스였다. 임신과 출산, 양육의 과정을 반복하며 미친 듯이 공부하고, 읽고, 쓰고, 일하는 삶에서 점차 이탈하고 있었던 그녀. 실비아 플라스는 '분노에 목구멍이 메고, 온몸에 독소가 퍼져 나간다'는 말로 자신의 심정을 대신했다. 결혼 후부터 줄곧 생활고에 시달렸던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글을 쓰지 않고 사는 삶이었다. 그녀에게 글쓰기는 종교적인 행위, 그래서 결국 글을 쓸 수 없는 최악의 상황과 타협할 수 없었던 실비아 플라스. 그녀에게 글쓰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렴풋하게나마 알 것 같았다. 글을 쓰지 않아도 어떻게든 살아갈 이런 나도, 새벽에라도 일어나 책을 읽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라는 인간의 정체성을 잃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신의 영혼을 전부 글쓰기에 바친 사람이야 오죽했으랴. 그녀에게 글을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을 것이다.
한명 한명의 삶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러서 쉬엄쉬엄 읽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먹먹함, 안타까움, 존경심. 그리고 오래 전부터 갖게 된 의문을 또다시 떠올린다. 나는 왜 책을 읽고 기록을 남기는가. 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더 의미있는 독서의 방향과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의 나에게 대충 흘려보내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