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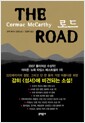
-
로드
코맥 매카시 지음, 정영목 옮김 / 문학동네 / 2008년 6월
평점 : 


먹고사는게 지장이 없다. 그런데 사는 데 불만이 많다.
남들보다 못 나가서 불만이고 남들보다 못 벌어서 불평이다. 인생이 심심하고 무료하다.
이런 배부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그런 사람들이 코맥 맥카시의 로드: The Road]를 읽게 되면 머리가 쭈빗서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인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즈음에 이야기는 시작된다. 작가는 헐리우드 상업 영화처럼 인류가 왜 이런 처지에 놓였는지 분명히 설명해주지않는다. 짐작하건대 아주 뜨거운 것에 살짝 지구를 데쳤다 놓았나 보다. 그래서 길에서 운전하던 사람들은 새까맣게 타죽었고 거의 모든 생명체들이 사라졌다. 더는 새로운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황야에 살아남은 자들이 생존을 위해 서로 약탈한다.
남자와 아이는 생존자이다. 그들은 '따뜻한 남쪽 나라'를 향해 길을 따라간다. 먹을 것이 없는 세상에서 굶기를 밥 먹듯하는 하루하루가 계속된다. 나를 먹이로 만들려는 식인종들이 바로 나와 같은 생존자이다. 이런 소설의 전제가 회색빛 칼라와 함께 이 소설의 음울한 분위기를 만드는 배경이다.
한마디로 재수 없는 내용인데 끝까지 책을 붙들고 읽게 한다. 풍요의 시절을 살았던 남자는 과거의 패러다임이지만 빈곤의 시절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희망의 패러다임인가 보다.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자는 아이의 주장, 배가 고파도 사람을 먹지는 말자는 아이의 몸짓이 최악의 상황에서 발견하는 휴머니즘이란 생각이 든다. 풍요의 기억이 현재의 빈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아이러니는 여전히 독자에게 의미가 큰 내용이다.
삶의 고차원 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이 소설을 보니 그 모든 게 '행복한 고민'이란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간다. 의식주로 고민하지 않는 따뜻한 삶을 우리가 시작한 것이 불과 오 륙십 년 전의 일이다. 참 잘살고 있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