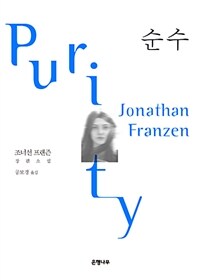
조너선 프랜즌의 새 소설이 번역되어 나왔다길래 반가운 마음에 사두었는데 어찌어찌하다가 책장에 묵혀두기만 하고 있었다. 사실 묵혀둔 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책이 있다는 것 자체도 거의 잊고 있었는데 요근래 갑자기 책장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거다. 그래서 읽게 됐다.ㅎㅎㅎ
일단 나는 이 소설 전에 나왔던 '인생수정'과 '자유'를 아주 좋게 읽었었다. 조너선 프랜즌은 소설을 아주 길게길게 쓰는 작가지만 읽다보면 그 긴 분량이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인물들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는 작가라고 느꼈다. 그리고 인물들을 다루는 방식이 진지하지만 솔직한 구석들이 참 많아서 공감 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이 책 "순수"는 그 전 소설들에 비해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
일단 나는 여기 이 소설의 인물들에 설득당할 수가 없었다. 이 사람들 다 미친거 같은데 이걸 또 이렇게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까 싶은 느낌이 소설을 읽는내내 내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소설속 인물들이 나는 너무 싫었다.
가장 비호감인 인물 안드레아스 부터 말하자면 일생을 어머니에 대한 애증에서 자유롭지 못 했던 인물이다. 어머니의 불륜으로 태어났다는 출생의 비밀을 알고부터 반항하다가 반체제 인사가 되고 어린 소녀들과의 문란한 잠자리를 하면서 한 소녀를 만나 살인자가 되고 그 살인을 평생 감추기 위해서 초조하게 살다가 결국엔 자기자신을 죽임으로써 생을 마감하는 인물.
결국 그가 했던 모든 사회적 행동들 사회 곳곳의 비밀을 폭로하면서 정의를 실현시킨다는 공적인 그 행동들의 원천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었다. 어머니가 진실하지 못 했다는 증오, 그러나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욕망. 즉 한마디로 말해 애정결핍이 안드레아스라는 인물을 만들었다. 애정결핍은 관심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발전하고 진실한 세상을 위한다는 뻔지르르한 겉모습으로 위장해서 안드레아스를 유명인으로 만들었다. 인터넷시대의 최고 수혜자라고나 할까?
하지만 그렇게 유명인이 되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결핍은 안드레아스 자신을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만다. 비극적인 결말이지만 그럼에도 이 인물에 동정이 가지는 않는다. 중년의 애정결핍 아저씨의 칭얼거림이 읽는내내 짜증이 나서였을까...
톰과 애너벨의 사연은 또 어떤가... 아 진짜 이 커플은 혈압 상승이다.
부잣집 철없는 딸 애너벨과 그런 애너벨에게 압도 당해서 자신의 자아를 던져버리고 애너벨과의 합일된 사랑을 꿈꿨던 톰. 하지만 내 자신을 타인에게 맞추기만 하면서 사랑하는 커플이 행복할 수는 없는 법. 하여튼간에 이 둘은 어마어마하게 미친 사랑을 하다가 헤어진다.
특히 애너벨의 이야기는 톰의 입으로 말해지기 때문에 이 여자가 왜이렇게 미친건가 납득이 잘 안 가기도 했다. 대체 이 커플은 왜이러는 걸까 싶은 생각만 들었다.
결국 이혼을 하고도 계속 만나다가 애너벨은 톰의 아이를 임신하고 자취를 감춰버린다.
톰은 애너벨을 버렸다는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고 어떤 여자에게도 마음을 다 주지 못 한다. 여전히 애너벨을 사랑하고 있다는 듯이......
둘은 서로 사랑하지만 같이 살면 지옥이 되어서 헤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커플이라고 한다.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비호감도로 따지자면 이 커플이 안드레아스보다는 좀 덜 하니 그래도 참고 읽었다. ㅎㅎ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란 핍.
처음 등장부터 대학 갓 졸업한 그녀가 중년의 유부남을 사랑한다고 해서 독자를 식겁하게 만들지만 다행히 그 유부남이 핍을 거부해서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그러다가 안드레아스와 엮이면서 그를 또 마음에 두게 되는데 나는 제발 핍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책장을 조마조마하게 넘겨야만 했다. 다행히 핍은 결정적인 순간 제정신이 돌아와 안드레아스를 거부한다.
아무튼 안드레아스의 농간으로 출생의 비밀을 알게된 핍은 아버지를 찾게 되고 어마어마한 상속재산도 찾고 또래의 남자와 사귀기도 하면서 해피엔딩을 장식한다.
이 소설의 제목이 퓨리티이고 그게 핍의 본명이라 나는 핍이 이 소설을 이끌어 가는 인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중년의 안드레아스나 톰에 대한 이야기는 풍부하다 못해 사족도 많은데 핍의 이야기는 참 간결하다. 그래서 내가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작가는 정말로 대체 이 작품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안드레아스와 톰의 80,90년대 이야기로 이 책은 상당한 분량을 채운다. 그리고 작가는 그 시절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잘 쓰는 분야인거 같아 보인다. 그래서 어쩐지 현재를 살고 있는 20대의 여자 핍을 억지로 끌고 와서 잠깐 맛만 보여주며 구색을 맞춘거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혼란한 세상에 그래도 퓨리티라는 희망이 자라나고 있다는 뭐 그런 밝은 이미지로...
오랜만에 길고긴 장편소설을 한 편 읽었다. 소설이 조금 불만족스럽긴 해도 호흡이 긴 이야기를 단숨에 읽었더니 뿌듯함이 밀려온다. ㅋㅋ
인물들이 비호감이라고 불평하면서 읽긴 했어도 책을 덮고나니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 아직 이 소설에서 감정이 다 빠져나오지 않았나보다.
긴 소설의 후유증이 바로 이런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한권 끝내면 뿌듯한 두툼한 소설.
조너선 프랜즌은 다음 작품도 이렇게 두툼하게 내 주시길. 아울러 분권 하지 않은 출판사 칭찬해칭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