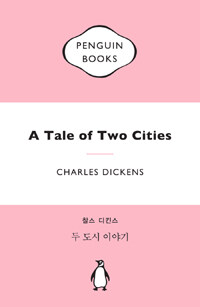드디어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를 다 읽었다. 야호~ 나도 이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이라는 이 유명한 고전 소설이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었다. 이제 아주 속이 시원하네.
사실 나는 동화책을 제외하고 찰스 디킨스 소설을 읽은 건 “위대한 유산”이 유일했다. 이것도 최근에 읽었다. “위대한 유산”은 문장마다 유머가 가득하고 상황이 코믹스러워서 매우 재밌게 읽었고 찰스 디킨스의 소설들은 다 이런 스타일 일 줄 알았다. 그래서 “두 도시 이야기”도 유머가 가득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 심각한 내용이었고 묵직한 서술이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래서 읽으면서 슬슬 ‘괜히 시작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올 정도로 약간 지루한 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꾹 참고 끝까지 읽었다. 사실 썩 재밌지는 않았다.
프랑스 혁명이 배경이 되는 소설인데, 특별한 점은 혁명 이후 혁명에 반하는 사람이라고 지목되면 마구잡이로 기요틴으로 끌고 가는 공포 정치 시대가 이 소설의 클라이맥스로써 혁명이 비인간적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와중에 찰스 디킨스의 나라 영국은 프랑스의 혼란한 상황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혀를 끌끌 차면서 영국의 체제가 더 안정적이고 우월하다는 인상을 감추지 않는다. 이 소설 속 인물들이 잔인한 프랑스 혁명가들 대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영국인들이라는 대립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 의도가 대충 파악이 되기도 한다.
급기야 영국인 인물 중 한명은 예수처럼 남의 죄를 대신하여 숭고한 최후를 맞는 것으로 소설 속에서 칭송받기까지 하는데... 아아...! 이런 부분들은 좀 낯뜨거웠다. 사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그 여자의 남편을 구해주려고 대신 죽는다는 설정의 멜로드라마를 만들려면 아예 처음부터 이 두 인물에만 집중해서 팠어야 하는데 이 소설은 이 남녀가 내내 비중 있는 주인공이 아니었다가 남자가 갑자기 사랑한다며 폭주하며 예수 같은 행동을 하니 뜬금없을 수밖에. 빅토리아 시대 소설이니 현재의 소설 스타일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요즘 이렇게 쓰면 막장드라마라고 욕먹는다고!
영국인이 썼으니 프랑스 혁명 속에서도 영국인이 부각되는 건 약간 거슬리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려니 하고 넘겨야겠지.
그렇다고 이 소설이 프랑스 혁명 자체에 대해서 떨떠름한 입장을 취하고 있냐하면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전체적으로 찰스 디킨스는 귀족의 횡포와 극단적인 빈부격차로 인해 혁명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기조를 소설 속에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혁명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초심을 잃는 상황을 비판하고자 이 소설을 썼다고 이해할 수 있다. 권력에 대항하여 권력을 잡은 인간들이 권력의 맛에 취해가는 인간 보편의 속성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것이지 혁명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어쨌든 그렇게 재밌게 읽지는 않았지만 나도 이제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를 읽은 사람이 되었다.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뿌듯한 것이다^^
이렇게 페이퍼를 끝내기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내용이 없으니까
소설의 첫 문장으로 가장 잘 썼다는 평을 듣는다는 이 소설의 첫 문장을 옮겨 놓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자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모두들 천국으로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1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