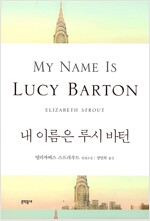인생을 아는 나이가 오긴 할까.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도 괜찮을까. 일정 나이가 되면 모든 걸 다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다는 불가능한 믿음 같은 걸 품고 사는 게 인생인지도 모르겠다. 아무렇지 않은 척, 나를 숨기고 사는 일이 상대에게는 괜찮은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 숨겨왔던 나의 상처와 조금씩 대면할 수 있는 것, 이곳으로 오기 위해 떠나왔던 그곳을 그리워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 인생은 정말 알 수 없고 쉬운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런 소설을 읽는 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오, 윌리엄!』은 앞에 언급한 그런 것들로 채워진 소설이다. 인생을 채우는 것들이 무엇인지, 버려야만 했던 것들이 무언인지.
루시가 자신의 첫 번째 남편 윌리엄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고 시작하는 이 소설은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퍼즐의 조각으로 지난 삶을 반추한다. 어떻게 만나 사랑하고 살아왔는지 왜 서로를 떠나 이별했고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담담하게 들려준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이 단지 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니라는 걸 안다.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는 일이다. 루시와 윌리엄도 그랬다. 세계는 하나로 합쳐질 수 있고 충돌할 수 있다. 그리하여 루시와 윌리엄은 이혼했다. 루시와 오랫동안 살았던 두 번째 남편 데이비드는 죽고 없다. 윌리엄에게는 세 번째 아내가 있다. 서로에 대한 이해의 한계가 있고 상처가 회복된 건 아니지만 각자의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지속했다. 이상하게도 루시에게 윌리엄은 유일한 집이었고 윌리엄에게 루시는 자신의 공포와 두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였다.
노년의 나이에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을까 싶은 정도로 소설 속 루시와 윌리엄은 서로를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러니 윌리엄의 세 번째 아내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실은 루시도 그랬으니까. 아무리 나이를 먹고 살 만큼 살았다 해도 치유될 수 없는 상실과 상처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의 실체를 꺼내 보일 수 있는 이는 얼마 없다. 그저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다. 상처를 꺼내 실체와 마주하는 일은 지우고 싶었던 과거, 도망치고 싶었던 자신의 일부와 대면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게 삶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된다. 윌리엄이 돌아가신 어머니 캐서린에 대해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 루시가 떠나온 고향(특히 어머니)의 모든 것들.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소설은 우리를 과거의 한 지점으로 불러 모은다. 저마다의 상처, 혹은 환희의 순간이다. 소설에선 윌리엄이 세 번째 아내에게 받은 ‘조상찾기’가 그 매개체다. 자신에게 이부누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루시와 동행하는 그 여정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를 안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알게 된다. 꽁꽁 숨기려 감추었던 내면 한구석에 자리 잡은 슬픔의 덩어리들. 철저하게 차단하고 선을 긋고 싶은 지점,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인간의 처절한 간절함에 대해.
우아하고 완벽하게 보였던 캐서린이 나고 자란 그곳은 루시가 떠나온 곳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다. 루시에게 보였던 그 모든 행동이 조금씩 이해됐다. 과거로부터 도망쳐야 했던 사람, 어린 딸마저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간절히 바랐던 사람. 자신의 어깨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는 죄책감과 함께 평생을 살아왔던 캐서린과 자신만의 방식으로 엄마에게 위로받았던 루시는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윌리엄에게는 두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아주 먼 존재였던 것이다. 어쩌면 이런 깨달음을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윌리엄과 캐서린과 루시의 관계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그때는 몰랐던 것들의 대부분을 지금에야 알게 된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그것이 삶이 흘러가는 방식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너무 늦을 때까지 모른다는 것.” (257쪽)란 문장처럼.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내게 없는 것들을 가진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며 나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전부를 알 것 같은 이들에게 마음을 연다. 루시가 윌리엄에게 귄위를 느꼈고 데이비드를 통해 위로를 받은 것처럼. 인생은 결핍과 상처로 시작해 그것을 채우고 위로받는 과정을 반복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생은 얼마나 많은 결핍과 상처로 가득할까. 숱한 경험과 상처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이가 과연 있을까. 저마다의 상처와 슬픔은 고유하고 차별적인 것이니까.
우리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아주 작은 부분을 빼면. 하지만 우리는 모두 신화이며, 신비롭다. 우리는 모두 미스터리다. 그게 내가 하려는 말이다. (298쪽)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소설을 통해 조금이나마 배우고 알게 된다. 인생이 뭔지 여전히 모르지만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아가기 위해 살아간다고. 그런 과정을 통해 자신을 용서하고 성장하며 상대를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애쓴다는걸. 그게 인생이라는 걸 말이다.‘루시’가 등장하는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소설을 조금 더 많이 읽고 싶다. 자신을 알아가며 성장하는 소설들. 우리는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쳐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