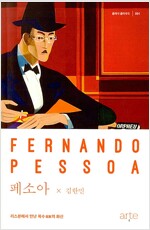페소아에게 다가가고자 들어선 거대한 텍스트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나는 누군가를 붙잡았다. 정확한 길을 안내해주리라고 기대하진 않았다. 그저 한 명 한 명에게서 얻은 작은 이야기 조각들을 잘 맞추면 어렴풋하게나마 한눈에 들어오는 지도를 그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흘러 다녔을 뿐이다. 그 사람들 중에는 실존한 인물도 있고 가공의 인물도 있었으니, 페소아라는 회로를 통과할 때마다 그 경계는 점점 흐려졌다. 그가 만들어낸 사람, 그가 읽던 사람, 그가 알던 사람, 그가 섬기던, 그가 무시하던, 그가 질투하던, 그가 모방하던, 그가 흠모하던, 그가 흠집내던, 그가 그리워하던, 그가 사랑하던 사람……. (프롤로그, 21쪽)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꿈꾼 적이 있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도 종종 내가 아닌 다른 나를 꿈꾼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다른 내가 되기를 바랄 것이다. 지금 이 공간도 그런 바람의 실현이 아닐까 싶다. 자목련이라는 이름은 나를 대신하면서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니까. 처음 블로그를 개설하고 이곳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닌 다른 나였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곳의 나는 글 밖의 나와 다르지 않다. 다르기를 꿈꿨으나 어느 순간 글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나를 발견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글을 쓸 수 있기를 바란다. 나를 떠올리지 않는 글, 나와 정반대에 서 있는 글, 글에서 나를 찾을 수 없는 글 말이다. 페르난두 페소아가 수많은 이명(異名)으로 글을 쓴 이유도 나처럼 작은 갈망에서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김한민 쓴 『페소아』를 만났다.
전혀 몰랐던 한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를 가깝게 여기는 건 당연하다. 부재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의 흔적을 직접 경험하고 싶기 마련이다. 김한민에게 페소아는 그런 대상이었다. 그의 글을 읽고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의 삶의 일부로 뛰어들기 위해 리스본에서 몇 년 동안 거주하기에 이른다. 오직 한 사람, 페소아 때문에 말이다. 잠깐 스치는 여행이 아닌 일상의 기록이라 글을 통해 페소아와 더 밀착되는 기분이다.
페소아라는 시, 지금도 리스본 시내를 유령처럼 떠돌고 있을 것 같은 시. 그 ‘불가해성’으로 말하자면 정말로 시를 닮았다고 할 수 있는 페소아를 직접 만났던 사람들은, 거의 한결같이 가면으로 가려진 듯한, 거기에 있으면서도 있지 않은 듯한 그 특유의 알 수 없는 존재감을 이야기한다. (235쪽)
어린 시절 어머니의 재혼으로 남아공으로 떠났다 다시 리스본으로 돌아온 페소아는 리스본에서 생의 전부를 보냈다. 리스본은 곧 페소아였고 페소아에게 리스본은 삶이자 문학이었다. 여행자들이 리스본으로 동경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아마도 그곳에 페소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포르투갈의 대표 시인, 그러나 시집보다는 그가 죽고 난 후의 『불안의 책』으로 잘 알려진 작가 페소아. 어쩌면 우리가 페소아라고 부르는 이름도 120여 명의 이명(異名)의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는 엉뚱한 생각이 들 정도다.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명은 그만의 창작 기계였다고 한다. 모든 것이 되어 모든 것을 느끼고 싶었던 그의 대단한 문학적 열의에 놀라고 만다. 하나의 이름에서 다른 이름으로 분리되는 순간, 수많은 이명과 페소아 사이를 오가며 그는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자목련이라는 닉네임과 나 사이에서도 때로 그런 감정을 느끼는 나는 닿을 수 없는 경지에 페소아가 있다.
그는 창작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다. 작가, 번역가, 시인, 문예지 활동가로 자신의 전부를 모두 문학에 쏟아부은 열정은 미발표 원고로도 충분하다. 120여 개의 이름으로 글을 발표하고 문단을 비평했지만 그가 완성한 글은 많지 않았다. 완벽한 글을 써야 한다는 집착과 불안 때문이었을까. 끊임없이 작품을 구상하고 쓰기 시작했지만 그가 남긴 트렁크 속 원고처럼 마침표를 찍은 건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이유로 우리는 여전히 페소아의 글을 탐미하고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다.
책을 통해 페소아의 문학에 대한 열정과 소신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잡지 『오르페우』창간과 활동이었다. 1915년 3월 페소아의 영혼의 친구라 할 수 있는 시인 마리우 드 사-카르네이루를 주축으로 잡지를 만들었다. 창간호에 대한 문단의 비평은 악평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런 반응은 『오르페우』를 만든 페소아에게는 극찬이었고 바라던 바였다. 다른 문학, 다른 곳을 지향하는 문학으로의 지평을 연 것이다. 발행 2호에 그쳤지만 지금까지 『오르페우』는 페소아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된다. 그와 함께 사-카르네이루와 나눈 편지도 무척 인상적이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세 살도 되기 전 어머니를 잃은 그에게 쌍둥이처럼 따라붙은 우울과 불안은 수차례 자살 시도에 이어 성공에 이르게 되었다. 사-카르네이루가 자살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문학적 교류뿐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 비주류의 세계를 선도하지 않았을까 짐작해본다.
그럼 페소아의 우정이 아닌 사랑은 어땠을까. 셰익스피어를 좋아했기에 오펠리아란 이름을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일까. 페소와의 오펠리아의 사랑은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제까지 페소아의 성향을 생각하면 오펠리아가 바랐던 안정적인 결혼생활은 페소아가 바라는 삶의 방향이 아니었다. 오펠리아의 사랑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페소아의 사랑은 그의 생에 있어 짧은 외도와도 같았다. 오펠리아가 전하길 페소아는 남의 이야기에는 경청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스스로 고립되어 고독에 빠져 살았던 페소아는 자신이 만들어 낸 이명의 존재에게만 은밀한 고백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한눈에 그를 알아볼 것만 같다. 까칠하고 예민한 표정으로 리스본을 걸어가는 그림자 같은 남자.
이렇게 짧게 만났는데도 페소아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끝을 알 수 없는 미로와 같았기에 더 알고 싶고 더 읽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니 『불안의 책』을 꺼내 펼치지 않을 수 없다. 폭염의 날들이 이어지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맑다. 누군가는 자살을 하고 절규하듯 매미가 우는 여름 날, 페소아가 바라본 오늘은 어떤 기록으로 남을까.
타인의 실존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이 살고 있고, 자신처럼 생각하고 느낀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차이가, 구체적인 거리가 있을 것이다. 다른 시대를 표상하는 상징이나, 책에서 나온 환영-이미지가 있다. 그것은 테라스에서 우리와 말을 하거나 전차에서 우연히 우리를 쳐다보거나 활기 없는 도로를 지나갈 때 우리는 스치는 의미 없는 육신들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현실이 된다. 우리에게 타인들은 그저 풍경일 뿐이다. 항상 그렇듯이 유명한 거리의 보이지 않는 풍경일 뿐이다. (『불안의 책』, 51~5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