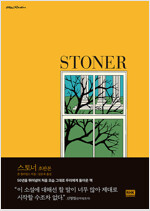‘윌리엄 스토너‘라는 한 개인의 삶과 죽음을 서술하고 있는 소설 『스토너』는 출간 이후 많은 독자에게서 ‘인생 책‘으로 꼽혀 왔다. 혹자는 솔직히 좀 지루한 작품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이런 극명한 차이는 삶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삶은 언제나 동어 반복의 연속이다. 주어로서의 나 자신은 물론이고, 주요 성분인 동사와 목적어까지 전부 어떤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나는 밥을 먹고, 나는 일을 한다. 이토록 권태로운 삶이지만 누군가는 그 속에서 어떤 번뜩이는 순간들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스토너』가 ‘인생 책‘이 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제쳐놓고, 그렇다면 나는 어땠는가. 무한히 반복되고 침묵하는 일상 속에서 갑작스레 열정이 솟아나는 그의 인생을 사랑했다. 물론 그의 마지막까지 동행했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생겨났겠지만, 나는 죽음 이전에도 그의 삶을 애정 했다. ‘스토너‘에게 그랬듯이 대학은 나에게도 더없이 소중한 곳이었고, 문학은 언제나 내가 세상을 더 깊고 생생하게 감각하도록 돕는 도구였다. 무감각하게 반복되는 삶을 인내하며 나아가는 ‘윌리엄 스토너‘의 일대기는 시시하지만 그래서 더 두렵기도 하다. 책을 읽어 나갈수록 그의 권태로운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이 소멸하는 순간 나는 코앞에 죽음을 마주한 사람처럼 마음이 저릿해진다. 기계처럼 일을 하는 자신에게 회의를 느끼고, 또 이를 해소할 시간마저 잃어버린 코로나 시대의 독자에게 『스토너』는 ‘인생 책‘이 자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인생의 책‘이다.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385쪽
몇몇 순간들을 제외하면 ‘스토너‘는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참을성 있게 견뎌내는 편에 가까웠다. 어떤 것에서도 제대로 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분열된 마음과 함께 살았던 건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과해야 했던 시대적인 배경도 있었다.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스러져 갔고, 불안정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정신 또한 서서히 힘을 잃었다. ‘이디스‘와의 불행한 결혼생활과 동료 교수 ‘로맥스‘의 끈질긴 괴롭힘, 그리고 수많은 파괴와 죽음을 양산해 낸 두 번의 전쟁 속에서도 ‘스토너‘가 삶을 끝내 긍정할 수 있었던 건 ‘문학‘과 ‘케서린 드리스콜‘ 덕분이었다. 그는 ‘문학‘과 ‘케서린‘이라는 돌파구를 통해 삶을 비로소 온몸으로 감각할 수 있었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무신경한 결계를 깨부수며 나아갈 수 있었다. 그 두 번의 기회가 없었다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스토너‘는 자신의 삶에 어떠한 열정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그럭저럭 보통의 삶이 죽음 앞에서 또렷해지고, 그제서야 간절해진다. ‘스토너‘는 죽어가는 찰나의 순간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 ˝넌 무엇을 기대했나?˝ 우리는 ‘스토너‘에게 ‘문학‘이자 ‘케서린‘이었던 무엇을 평생에 걸쳐 기다린다. 그것들은 이미 우리의 삶을 통과해 지나갔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결국 생의 끝에서야 재조명되고 애틋해진다. 기대수명이 칠십몇 세 정도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 삶의 절반도 살지 않았다. 하지만 ‘스토너‘가 내게 ‘기대‘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순간 나는 울컥하고야 만다. 이미 모든 ‘기대‘를 품을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처럼 어쩐지 삶에 조금은 절박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모든 것이, 심지어 그에게 이런 지식을 알려준 배움까지도 무익하고 공허하며, 궁극적으로는 배움으로도 변하지 않는 무(無)로 졸아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250쪽
‘신형철‘ 평론가의 말처럼 책의 말미에서 ˝우리는 모두 속절없는 0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닫게 된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말은 삶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던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다. 그러나 일상에서 이를 알아채는 일은 드물다. 오로지 나만 가지고 있는 듯한 삶에 대한 권태로움은 영영 끝을 모르고 이어질 것만 같다. 오늘 『스토너』를 읽고서야 이런 지겨움도 언젠가는 툭, 소리도 없이 끊어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나는 그런 삶에 무엇을 기대했나.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것저것을 쓰다가 결국에는 지우개 자국으로 더러워진 종이만을 남겼다. ‘0‘으로 졸아든 언젠가의 나를 생각하니 무엇을 적어도 부족한 느낌이다. ‘신형철‘ 평론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 ‘삶‘에 대해선 할 말이 너무 많아 제대로 시작할 수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