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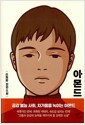
-
아몬드 (양장) - 제10회 창비 청소년문학상 수상작
손원평 지음 / 창비 / 2017년 3월
평점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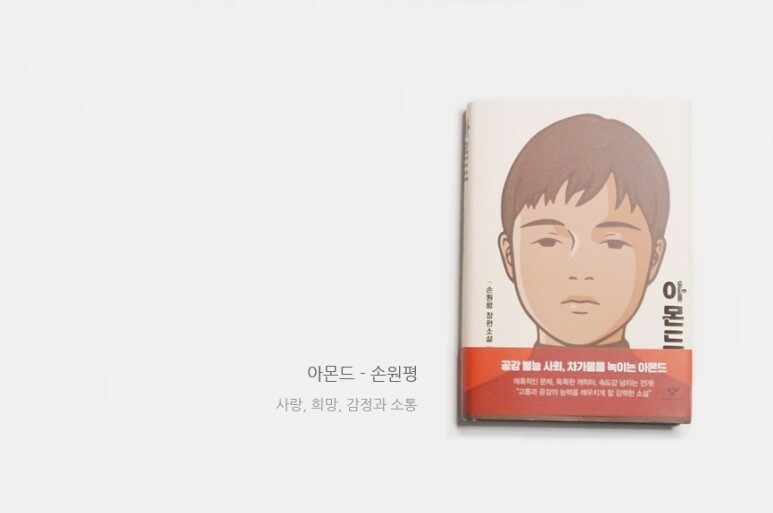
소설은 머릿속에 아몬드처럼 생긴 '아미그달라' 혹은 '편도체'의 크기가 작아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감정 표현 불능증'을 갖고 있는 소년의 이야기였다. 그에겐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무수히 많았다. 웃어야 할 때 웃지 않았고, 슬퍼해야 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어디서든 튀어 보였다. 엄마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끈질기게 가르쳤다. 주입식 교육이었다. 문제와 모범답안을 준비하고, 가끔씩 응용문제를 내밀었다. 윤재는 입이 닳도록 외우고 익혔지만, 세상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람에게 동정론이 일정도로 팍팍한 세상이었다. 선천적으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윤재만큼이나 공감에 불능한 인간들이 허다했다.
온갖 부정적인 상황으로 둘러싸인 소설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 따뜻하게 빛나고 있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 마음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소년에게 감정은 없지만, 대신 소중한 존재들이 있었다. 어쩔 땐 눈물을 글썽이면서까지 힘들게 윤재를 교육했던 엄마, 뭐든지 감싸주었던 믿음직한 할멈,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언제나 방향을 제시해주던 심 박사, 편견 없이 자신을 바라봐 준 도라, 표현하는 방법은 서툴렀지만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곤이…… 이들이 없었다면 윤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
결말을 맞이하고, 이어서 책의 뒤편에 실린 작가의 말과 인터넷에 올라온 인터뷰 등을 찾아 읽었다. 손원평 작가는 엄마가 되고 난 후, 아이를 바라보며 소통과 감정,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며 글을 썼다고 했다. "이런 아이라면 사랑할 수 있었을까"라는 상상으로 등장인물을 만들어냈다고도 했다. 작가의 고민은 희대의 살인자가 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지의 고민으로 이어진듯하다. "구할 수 없는 인간이란 없다. 구하려는 노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그는 무슨 의미로 그렇게 썼을까. 도와 달라는 손짓이었을까, 아니면 깊은 원망이었을까.(128쪽)" 결국, 인간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이었다. 작가는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읽기 쉽고 깔끔한 소설로 대신했다.
언젠가 우리 엄마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포기라는 게 어딨어, 내 아이인데." 소위 문제아라고 불리던 청소년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모를 보고 한 말이었다. 사랑, 혹은 희망, 때로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이거나, 작은 관심으로도 표현되는 따뜻한 감정, 그리고 소통. 이 책이 왜 좋았는지 비로소 알 수 있었다.
39쪽,
침묵은 과연 금이었다. 대신 ‘고마워.‘와 ‘미안해.‘는 습관처럼 입에 달고 있어야 했다. 그 두 가지 말은 곤란한 많은 상황들을 넘겨 주는 마법의 단어였다. 여기까진 쉬웠다. 상대방이 내게 천 원을 내면 거스름돈을 이삼백 원 내 주는 것과 비슷했다.
어려운 건 내가 먼저 천 원을 내는 거였다. 그러니까, 뭔가를 원한다거나 하고 싶다거나 어떤 것을 좋다고 표현하는 일들. 그런 게 힘든 이유는, 여분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돈을 내야 하는데 나는 사고 싶은 것도 없고, 얼마를 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잔잔한 호수에 억지로 파도를 치게 만드는 것처럼 버거웠다.
128쪽,
구할 수 없는 인간이란 없다. 구하려는 노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그는 무슨 의미로 그렇게 썼을까. 도와 달라는 손짓이었을까, 아니면 깊은 원망이었을까.
엄마와 할멈에게 칼을 휘두른 남자와 곤이는 P.J. 놀란 같은 타입이었을까. 아니면 P.J 놀란과 가까운 건 오히려 나였을까. 나는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내겐 곤이가 필요했다.
162쪽,
몰랐던 감정들을 이해하게 되는 게 꼭 좋기만 한 일은 아니란다. 감정이란 건 참 얄궂은 거거든. 세상이 네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라 보일 거다. 너를 둘러싼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날카로운 무기로 느껴질 수도 있고, 별거 아닌 표정이나 말이 가시처럼 아프게 다가오기도 하지. 길가의 돌멩이를 보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대신 상처받을 일도 없잖니. 사람들이 자신을 차고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하지만 자신이 하루에도 수십 번 차이고 밟히고 굴러다니고 깨진다는 걸 ‘알게 되면‘, 돌멩이의 ‘기분‘은 어떨까.
245쪽,
멀면 먼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외면하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다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면서 쉽게 잊었다.
내가 이해하는 한,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