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래된 일기
이승우 지음 / 창비 / 2008년 11월
평점 :

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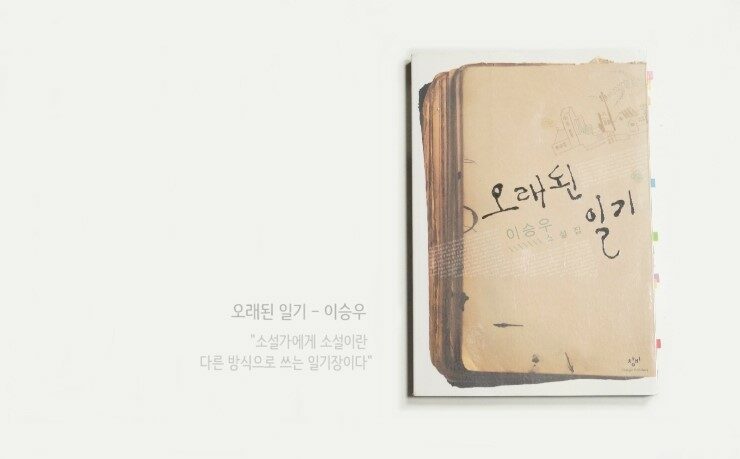
수년 전 우연히 그의 강연회를 참석하게 되었을 때, 나는 이승우 작가를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될 줄 몰랐다. 그때는 고작 그의 책 한 권만 읽은 게 다였고, 그의 신작 장편 소설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에 나는 대학생 기자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을 뿐이었다. 이를테면 어떤 목적 때문에 그를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다. 작가의 이름을 건 강연회에 모인 독자들은 광적일 정도로 '이승우' 문학에 취한 것 같았다. 그의 수없이 많은 작품을 나열하고, 작품에 나온 일부 문장을 읊는 독자들에겐 극진한 존경과 사랑이 느껴졌다. 아주 열띤 광경이었다. 그 시기에 갔던 강연회 중에서 독자들이 동질감과 작가에 대한 애정으로 똘똘 뭉친 모습이 제일 돋보였다. 지금에 와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그런 마니아층에 끼고 싶었다. 나도 그의 문학에 빠져 보고 싶었다.
그때의 내 생각은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전에 사랑하게 될 거라고 선포하는 어처구니없는 말과도 같았다. 그런데, 웃기게도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문학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한 권을 읽을 때마다 만족감이 충만하게 채워졌다. 그의 문학은 '당연히', 그리고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언제든 붙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한 편의 소설은 그 소설이 탄생하는 순간까지의 그 작가의 삶의 총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결국, 소설가에게 소설이란 '다른 방식으로 쓰는' 일기장과도 같다고 표현한 것인데 이승우의 소설들은 더 비밀스럽게 들어가는 느낌이라 말할 수 있다. 가장 밝히고 싶지 않은, 가장 숨기고 싶은 내밀한 마음들, 이를테면 마음의 짐, 부끄러움, 죄책감, 죄의식과 같은 것들을 아주 샅샅이 긁어내는 것이다. 『오래된 일기』라는 책은 이러한 작가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소설들을 담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오래전에 땅속에 깊이 파묻어두었던(33쪽)" 죄의식 같은 것들이 어떤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분출되고 마는 상황들을 그렸다. 아마도 누구에게나 익숙하지만, 쉽사리 꺼낼 수는 없었던 그런 일들을 일기장 속에 풀어놓은 듯이 말이다. 이는 <오래된 일기>와 <무슨 일이든, 아무 일도>, <실종사례>와 같은 작품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눈여겨볼 점은 작가 죄의식의 정체가 조금 특이하다는 점이다. 때로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고, 타인도 의도하지 않은 죄의식이 마음 깊은 곳에 깃든다. "끼어든 것들이 삶을 이룬다. 아니, 애초에 삶이란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18쪽)"라는 말처럼, 어느 순간 뜨거운 기운을 감지할 때,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들이 이 소설에 아주 다양하게 펼쳐진다. 그리고 <정남진행>이라는 제목의 연작소설 두 편은 작가가 중요한 소재로 내세우는 '죄의식'과 같은 것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용서하는지에 대하여 풀어내기도 했다.
좋은 문장을 음미하고자 하는 욕구와 이야기적인 재미 (놀라움에 기반을 둔)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이승우 소설의 특징은 『오래된 일기』 속에도 여전했다. 또한, 이 소설의 또 다른 재미는, 이야기 중간중간 '쓰는 행위'에 대한 작가의 깊은 고민이 드러나 있는 ('오래된 일기', '전기수 이야기', '방') 부분들을 포착하는 것이었다. 작가에게 애정이 깊은 독자로서 다락방 깊은 곳에 숨겨놓은 일기장을 꺼내보는 느낌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독서였다.
29쪽, 오래된 일기
그는 언제나 내 문장의 첫번째 독자였다. 그 독자는 대개 표정으로 말했다. 표정의 변화가 또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의중을 헤아리기 위해 온 신경을 다 기울여야 했다. 나는 미세한 표정의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마침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 어떤 문장은 지우고 어떤 문장은 비틀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한 것은, 사실은 그였다. 내 문장은 자주 그가 원하는 대로 씌어졌다. 독자는 사실상의 작가였다.
72쪽, 타인의 집
그는 종잡을 수 없는 기분에 빠져들었는데, 그 순간 자기가 걸치고 있는, ‘보석싸우나‘라는 글자가 박힌, 목둘레가 늘어나고 색깔이 누렇게 바랜 티셔츠에 눈길이 갔고, 울컥 치밀어오르는 뜨거운 기운을 참지 못하고 딸꾹질을 했다. 그의 감정상태가 상당히 정확하게 전화기 너머의 그녀에게 전달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157쪽, 실종 사례
여전히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심지어 악수를 할 때도 그랬다. 그나 나나 그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이고 배려라고 간주했던 것 같다. 그가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서두르지도 않고 걸어갈 때 나는 잠깐 내 양복 안주머니에 들어 있는 봉투를 떠올렸다. 그의 운동화가 저벅저벅 소리를 냈다. 아니, 그것은 빗물이 내는 소리였던가. 흠뻑 젖은 옷이 달라붙어 드러난 그의 몸은 앙상하고 왜소했다. 나는 쏟아지는 비가 그의 몸을 흐릿하게 지워 없앨 때까지 막연히 서서 바라보았다. 의외로 감정이 평평했다. 무대를 가리는 막처럼 검은 비가 세상을 닫았다. 비로소 그의 빚을 갚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78쪽, 방
나는 비로소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놓고 전원을 켰다. 이제 글을 쓴다! 글을 이제 쓴다! 선언문을 벽에 붙이는 기분으로 그 말을 몇번이나 했다. 그것은 나 자신을 향한 나의 주문이었다. 나는 이제 링에 올라가라고 종을 치고 있었다. 종소리는 머릿속에서 웅웅거리는데 몸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계속 링 바깥에 머물러 있었다. 역겹거나 친근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역겨우면서 친근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부터 방향제를 뿌리지 않은 까닭이다.
203쪽, 정남진행(行)
아무리 훌륭한 산 사람도 훌륭하지 않은 죽은 사람에게 떳떳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그냥 흐느껴야 하고, 나는 그냥 내버려두어야 한다. 내가 그의 넋두리 상대가 된 것은 공교로운 일이고, 그것조차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록 시시하고 늘 삐걱거리는 연애였다 하더라도 그녀와의 1년 남짓한 인연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한다고 나는 마음을 다잡아먹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