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국 ㅣ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61
가와바타 야스나리 지음, 유숙자 옮김 / 민음사 / 2002년 1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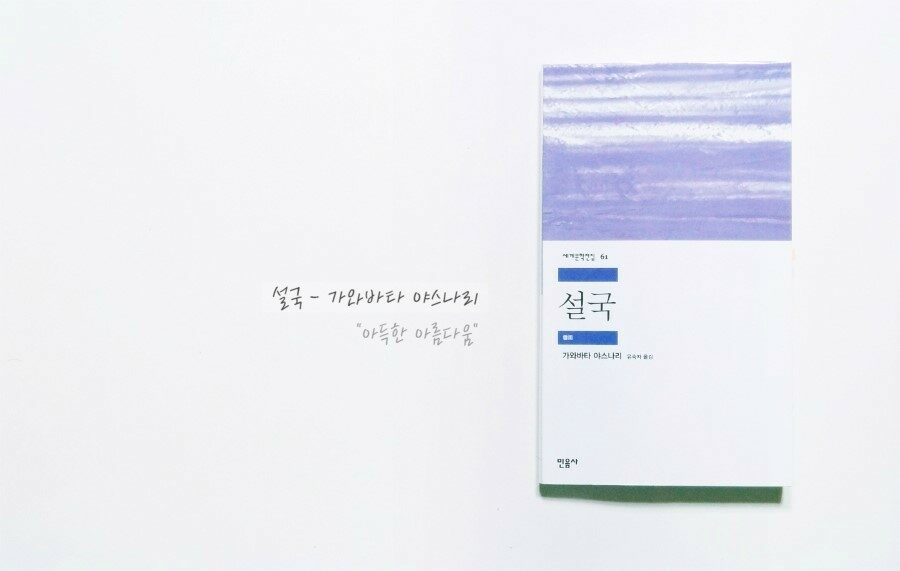
문장 하나가 한 권의 책을 읽게 만든다. 희한한 일이다. 다음 장면이 궁금해서 못 견디게 만드는 문장은 아니었다. 오히려, 잔잔한 축에 속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다른 차원으로 가는 '투명한 막'처럼 읽는 이를 쏘옥 빨아당겼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 섰다." 어두컴컴한 터널을 통과해 자그만 빛으로 향해가는 기차를 타고, 나는 이제 그 한 문장을 통하여, 하얀 설국雪國 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한여름에 설국을 읽는다니, 어찌 됐든 상상으로라도 은은한 추위를 맛볼 수 있으니 행운인지, 이 책을 겨울에 읽지 않은 것을 후회해야 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눈의 고장' 속에 머무르게 되었다.
니키타 현의 온천 마을에 방문한 '시마무라'는 두 명의 여인을 본다. 이곳으로 다시 발걸음 하게 만든, 사랑하는 여자 '고마코'와, 유리창처럼 투명하고 아름다운 처녀 '요코'. 소설은 그 여자들을 보는 '시마무라'의 시선을 철저하게 따라간다. 그 여자들에게 얽혀 있는 사연과 관계는 중요치 않다. 그저 담담하게 허무하게, 그의 마음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인상과 이미지를 그려갈 뿐이다. 그런 '시마무라'의 허무적 시선과 어조가, 다소 과하다 싶을 만큼 깊어지는 때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이다. 새하얀 설경 속에 떠오른 여자의 붉은 뺨, 한기 어린 유리창에 떠오른 여자의 투명한 얼굴은 청결하고 아름답다. "이런 모습으로 자신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13쪽)" 여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리라. 단지, 사랑에 빠진 '시마무라'의 눈 속에서 너무도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으로 존재할 뿐.
그러나 그는 강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모든 게 흩어지고 말지 (102쪽)" 라는 그의 말처럼, 그들의 사랑도, 어쩌면 인생도 쓸쓸하고 결국엔 흩어져버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의 후반부, 그는 방 다다미 위에서 죽은 벌레들을 관찰한다. 이미 죽어서 바스락거리는 나방, 쓰러질 듯 살아나려 애쓰는 벌, 그는 곤충들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곤충의 자연스러운 죽음 앞에서 존재를 생각한다. 사랑과 그 자신, 다분히 직업적인 의미밖에는 없는, 그가 쓰는 논평, '고마코'의 샤미센 소리. 현실에서 떠나온 이곳에선 아마 모든 게 흩어져버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 일지도 모른다고. 두렵고도 아찔한 모든 것이 눈의 고장 속에서 사르르 사라져 버려도 뭐라 할 수 없는.
지겹지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책의 첫 문장 이야기로 돌아가본다. 이 짧은 문장 하나는 마지막 문장까지 가는 그 과정을 통해야만 '명문장'이 된다고 생각된다. 청명한 하늘, 아득히 깊은 은하수의 이미지가 책 속에서 쏟아질 듯 흘러나오는 소설의 끝까지 읽어야만 알 수 있다. 눈물겹고 꿈같은 순간들을 담은 처음과 끝의 아릿한 맛을.
12쪽,
거울 속에는 저녁 풍경이 흘렀다. 비쳐지는 것과 비추는 거울이 마치 영화의 이중노출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게다가 인물은 투명한 허무로, 풍경은 땅거미의 어슴푸레한 흐름으로, 이 두 가지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이세상이 아닌 상징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었다. 특히 처녀의 얼굴 한가운데 야산의 등불이 켜졌을 때, 시마무라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가슴이 떨릴 정도였다.
75쪽,
「플랫폼에는 들어가지 않을래요. 안녕」 하고 고마코는 대합실 안 창가에 서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기차 안에서 바라보니까 초라한 한촌(寒村) 과일 가게의 뿌연 유리상자 속에 이상한 과일이 달랑 하나 잊혀진 채 남은 것 같았다.
기차가 움직이자마자 대합실 유리가 빛나고 고마코의 얼굴은 그 빛 속에 확 타오르는가 싶더니 금세 사라지고 말았다. 바로 눈 온 아침의 거울 속에서와 똑같은 새빨간 뺨이었다. 시마무라에게는 또 한번 현실과의 이별을 알리는 색이었다.
113쪽,
창문 철만에 오래도록 앉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이미 죽은 채 가랑잎처럼 부서지는 나방도 있었다. 벽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도 있었다. 손에 쥐고서, 어째서 이토록 아름다운가 하고 시마무라는 생각했다.
142쪽,
아아, 은하수, 하고 시마무라도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순간, 은하수 속으로 몸이 둥실 떠오르는 것 같았다. 은하수의 환한 빛이 시마무라를 끌어올릴 듯 가까웠다. 방랑중이던 바쇼가 거친 바다 위에서 본 것도 이처럼 선명하고 거대한 은하수였을까. 은하수는 밤의 대지를 알몸으로 감싸안으려는 양, 바로 지척에 내려와 있었다. 두렵도록 요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