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읽어가겠다 - 우리가 젊음이라 부르는 책들
김탁환 지음 / 다산책방 / 2014년 11월
평점 :



『읽어가겠다』 김탁환 / 다산책방
읽었었고, 읽고 있고, 역시나 읽어가겠죠

'읽어가겠다'라는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젊음이라 부르는 책들"이라는 부제가 붙어있고, 과거에 읽었던 책들을 소개하고 있으면서도, '읽어가겠다'하는 미래적 포부를 강조하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마치 과거에 책과 함께 했고, 지금도 책을 읽고 있으며, 언제까지나 좋은 책을 만나리라는 생각을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특이하고도 공감이 팍팍 가는 이 책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혹은 너무나 많이) 만나봤을 법한 책 에세이입니다. 이런 책들을 읽는 데에 장점과 단점이 혼재하고 있지요. 먼저, 장점은 제목만 들어봤거나 관심도 안 가던 책에 갑자기 확-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겠고, 단점은 책 위시리스트가 늘어나 지갑이 온통 털리는 것이지요!
특히나 작가가 읽는 책이라면, 작가의 젊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책이라면, 더욱더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책을 읽는 누구나 오래전에 읽었던 책들은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김탁환 작가에게도 이런 책들이 역시 있었겠죠. "세월과 함께 몇 개의 장면과 몇 토막의 문장만 남았지요. (...) 이토록 멋진 소설을 왜 까맣게 잊었던 걸까?"라는 말에 격하게 공감이 갑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너무나 한정적이어서, 너무나 멋진 책을 읽어도, 책을 읽고 서평을 남겨도 전체적으로보다는 부분적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토록 멋진 소설을 왜 까맣게 잊었던 걸까?"라는 말에, 오래전에 읽었던 『상실의 시대』와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을 다시 읽어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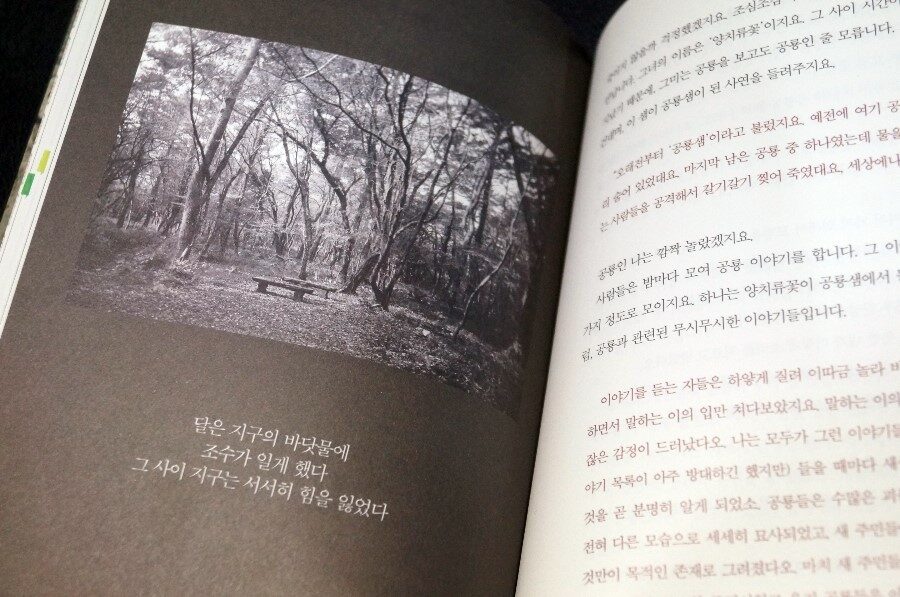
『읽어가겠다』를 읽다 보면 마치 라디오를 듣는 듯한 다정한 말투가 눈에 띄는데, 역시나 이 책은 김탁환 작가가 《책하고 놀자》라는 라디오 코너에서 소개되었던 작품들을 골라 엮어놓은 책이었습니다. 150권이 넘는 책들 중에서 작가의 사심으로 뽑은 책들이기에, 어떤 책들이 걸렸을까 참으로 궁금해졌는데요. 역시나 세계문학 고전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해 마지않는 헤르만 헤세의 책 『크눌프』가 처음으로 등장해 소리 없는 환호를 질렀고, 너무나 유명한『자기 앞의 생』을 다른 식으로 읽어낼 수 있음에 놀랐고, 간단하게 설명한『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라는 소설에 완전히 압도되어 위시리스트에 넣어두었고, 아직 읽지 않았지만 제목 그 자체에 매력을 느껴 책장에 고이 꽂아둔 『아름다운 애너벨 리 ...』가 나와서 조만간 꼭 읽어보리라는 작은 다짐을 했답니다.
이미 넘쳐나는 책 위시리스트에 또 한 번 넘치게 담아버렸지만, 작가가 읽은 책들에서 받은 감동이 전해지고 그 감동이 새로운 책에 대한 큰 기대로 바뀌니, 이런 책 에세이는 보고 또 봐도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책 설명, 느낌으로 구성되는 공통적인 형식이지만, 항상 좋은 책들을 채워주고 그보다 높은 가치를 선물해주니 계속해서 책 에세이를 읽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Copyright ⓒ 2014. by 리니의 컬쳐톡 All Rights Reserved.
서포터즈 도서를 읽고 솔직하게 쓴 서평입니다.
덧글과 공감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생텍쥐페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흥미롭습니다. 먼저 그는 계속 비행 이야기만 합니다. 『어린 왕자』든 『사람들의 땅』이든 『야간비행』이든 비행하는 이야기만 줄기차게 반복하는 것이죠. 언젠가 사석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불문학 전공자인 성균관대 정지용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더군요.
대부분의 작가들은 차이를 계속 만들고자 하지만 비슷한 작품 세계를 반복하는데, 생텍쥐페리는 반복을 계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작가다. 맞는 것 같은가요? 이런 경향 때문에 생텍쥐페리의 작품들에서는 늘 비행기가 나오고 사막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이 나오고 별이 나오고 조종사가 나옵니다. (51p, 남방우편기)
아니 에르노는 학교에서 할 법한 것들을 어머니와 공모하여 즐겼으며 아버지는 이 즐김에서 제외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아니 에르노는 자신과 너무 다른 아버지, 자신과 닮으려고 노력하는 어머니를 보며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니 에르노의 삶과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한 여자』에는 두 가지 시공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살아온 삶의 시공간, 또 하나는 죽은 어머니를 추억하며 작가가 보내는 시공간이겠지요. 작가가 일부러 알리지 않는 이상, 독자들은 그 작가가 출간 전에 어떤 작품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104p, 한 여자)
수용소에선 가스실로 가는 죄수의 마지막 저녁엔 죽을 두 그릇 줍니다. 배 불리 먹고 죽으러 가란 뜻이겠죠. 그런데 배급하는 죄수가 한 그릇만 줬고, 치글러는 이것 때문에 심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끝내 두 그릇을 받아내지요. 그렇게 치글러를 비롯한 내일 죽을 죄수들이 마지막 죽을 먹는데 쿤이라는 늙은이는 자신의 서류가 오른쪽으로 던져진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내일 죽을 죄수 옆에서 어떻게 자신이 살아난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신에게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과연 인간으로서 할 짓일까요. 프리모 레비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신이라면 쿤의 기도를 땅에 내동댕이쳤을 것이다." (168p, 이것이 인간인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소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칼 같은 소설입니다. 갈등을 계속 증폭시켜 어느 순간 폭발하는 소설이지요. 쿤데라의 소설은 김밥 같은 소설입니다. 끊임없이 인물과 사건을 둘둘 말지요. 말다보면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멸』도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지요. 시작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불멸』은 A로도 해석될 수 있고 B로도 해석될 수 있고 C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설가들은 종종 방에 누워 빈둥거리면서 이런 구상을 하지만 정말 쓰는 건 어렵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마는 것 같지만, 소설가는 적어도 이렇게 말려들어가는 이야기의 효과와 의미를 알아야 하니까요. (216p, 불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