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행의 기술
김정남 지음 / 작가정신 / 2013년 12월
평점 :



삶을 이어가는데 필요했던 것은 결국... <여행의 기술 - 김정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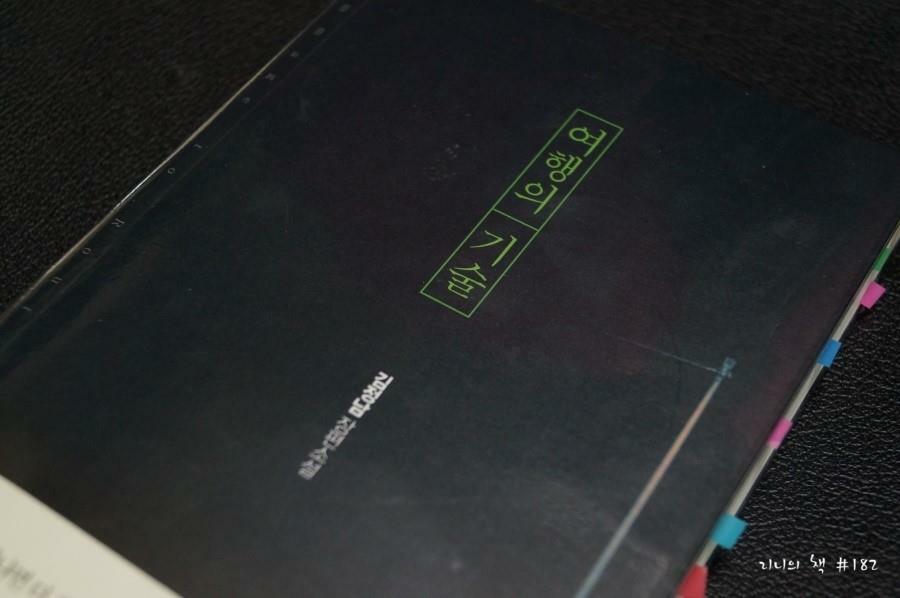

"어둠과 어둠이 만나면 더 짙은 어둠이 된다는 사실을 그땐 왜 몰랐을까."
아이는 자폐증을 앓고 있다. 아내는 몇 년 전 집을 나갔다. 주인공인 '승호'는 별 볼 일 없는 대학의 교수였지만 그 자리마저 잃은 채, 낯선 풍경을 보며 아이와 함께 정처 없는 여행을 한다. 외롭고 어두운, 죽음 같은 이미지의 여행.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자살여행'.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채 웃고, 우울해하며, 아빠 '승호'는 지독했던 과거에 대하여 생각한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칼을 맞아 죽었고 어머니는 불에 타죽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누나였고, 누나의 사랑은 감사했고 애잔했다. 대학시절, 짝사랑했던 '송희'는 친한 친구 '석이'와 결혼해버렸다. 하나뿐인 재주는 '글'이었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시간강사가 되었다. 그 후 '승호'는 보잘것없는 대학의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자리에 원서를 내고,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교수실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생활했다. 언젠가 우연히 만난 아내와는 서로 연민의 감정으로 사랑했고, 가난과 아이의 장애는 그녀를 시들게 했다. '승호'는 몇 년 뒤 갑자기 걸려온, 말 없는 아내의 전화에 대고 쌍욕을 하고 끊어버렸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전화가 되어버렸다. 이해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아내는 떠나버렸다.
참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었다. 그는 사회의 '잉여인간'이었고 초라했다. 우울하게 떠돌던 '승호'의 마지막 선택은 씁쓸하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자살여행'은 운 좋게 주어진 무언가를 통해 다시 삶으로 달려나간다. 지긋지긋했던 삶을 이어가는데 필요했던 것은 결국, 그 지긋지긋함을 없애줄, 속물적인 도피처였다는 것.
사람의 나약함은 불행과 절망, 벼랑 끝에 몰린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드러나는 듯하다. 같은 상황에서도 무언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가. 사회 속에서 자신이 작아졌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자신을 놓아버리느냐, 아니면 우울함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에서 나약함 혹은 강함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런 위기가 온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지... 확실하게 후자를 선택할 수 있을까?

식당을 나서자 쌀쌀한 봄바람이 옷깃을 파고든다. 아이를 차에 태우고 담배를 한 대 피워 문다. 어디로 갈까, 어디에 가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본다. 정오의 태양은 부신 빛을 쏟아붓는다. 갈 길을 잃어버린 벌레처럼 마음이 어수선하다. 차안에 겸이가 우두커니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 저 애처로운 짐승을 어쩐단 말인가. 이번 여행의 첫 번째 기항지가 여기인 것은 이곳이 비루한 내 생의 본향이기 때문이겠지만, 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못내 저주스럽다. (11p)
우리는 늘 셋이었고, 또 셋이서 행복했다. 송희를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의 작은 세계를 만들며 서로의 정서를 호흡했다. 송희는 그동안 감춰두었던 끼를 모두 드러내며 우리를 취하게 했고, 석이는 자칫 느슨하고 지루해질 수 있는 정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나는 그 두 가지 정서의 너울 속에서 자연스럽게 흔들렸다. 바로 그때 나의 어머니는 포목점의 천들과 함께 다비식을 올렸다. 성불하지도 못할 거면서 왜 뜨겁게 생을 마감했는지, 나는 생의 기습과 허망함에 탄식을 할 여유도 없었다. 그러한 침울함 속에서 나는 강릉을 떠났다. (76p)
안인을 지나 정동진을 거쳐 옥계에 이르는 길은 서럽도록 적요하다. 이제 막 정오에서 기운 태양은 하얗고 고운 빛가루들을 온 천지에 뿌려대고 있었다. 더없이 시퍼런 바다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고 고여 있다. 바람도 한 점 없는 이 쨍한 봄 햇발 속으로 한 뭉치의 지옥이 달린다. 더 이상 가진 것도 없이 스스로를 버릴 일 하나만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나의 분신, 겸이. 너는 나와 한 몸이니 같이 가야 한다. 이 아비나 너의 생은 애초부터 틀렸어.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야. (81p)
그 후로 작품집을 두 권 출간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이 삼 년 학위논문에 매달리다가 결국 튀어 올라가야 하는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새로운 스타 작가는 계속 만들어지고, 어렵사리 말석에 자리를 잡았다 하더라도 쉬이 밀려났으며, 절치부심 책을 낸다고 해도 평론가들의 주목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도로(徒勞)에 불과한 것이었다. 보따리를 들고 이 대학 저 대학을 뛰어다니며 주당 스무 시간 이상의 강의를 소화해내면서, 그사이 책이라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기를 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가정에서 나의 글쓰기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에 불과했고, 그로 인해 나의 글쓰기는 원치 않는 죄를 덕지덕지 뒤집어쓸 수밖에 없었다. (91p)
아이가 또박또박 말한다. 어디서 들어도 한 번에 누군지 알 수 있는 독특하고 리드미컬한 음성. 그것이 네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사실의 하나이겠지.
"겸이는 사는 게 좋아?" 내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묻는다.
"좋아요." 아이는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면서 말한다.
"죽는 거는?"
"싫어요."
"왜?"
"무서워요."
"죽는 게 누가 무섭데? 그냥 눈감고 있으면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야."
"아니에요. 죽을 때 피나요. 아파요." 아이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한다.
피를 흘리지 않고 편안히 죽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나는 아무 말도 못한다. 저 아이와 함께 가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자꾸 똑같은 질문이 마음속에서 와동을 일으킨다. 너만 이렇게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네 어미나 나나 이렇게까지 불행하지는 않았을 거야,라는 이기적인 생각까지 뒤섞어본다. (196p)
알랭 드 보통의 책이랑 헷갈리시면 안되요

이 소설의 분위기는, 어둑어둑 하네요 ㅠㅠ 흐앙..
height=90 src="http://api.v.daum.net/widget1?nid=51751267" frameBorder=no width="100%" allowTransparency scrolling=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