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십자가
시게마츠 기요시 지음, 이선희 옮김 / 예담 / 2013년 2월
평점 :

절판

가슴에 남은 말,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 - 시게마츠 기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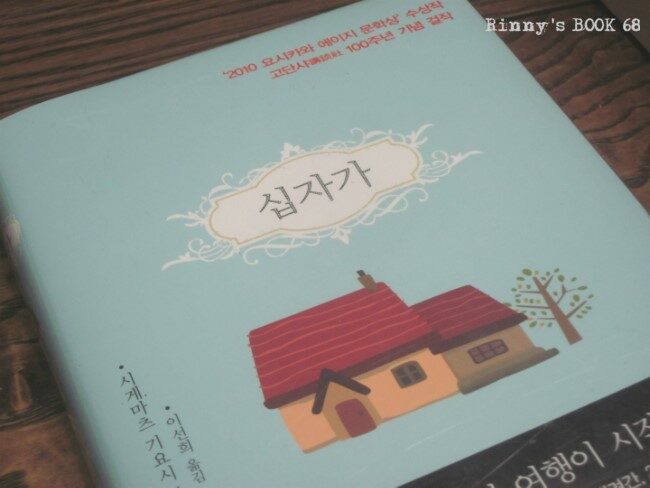

학교를 배경으로 왕따문제를 그려낸 책들은 참 많다. 마치 사회의 골치아픈 문제들이 점점 부풀어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흔히들 왕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가해자는 왜 왕따라는 문제를 만들어냈으며 피해자는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대충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곤 하는 게 보통 일이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거기서 지나칠 수 있는 방관자에게 더욱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꺼낸다. 방관자, 아무 짓도 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숨어버릴 수 있는 존재. 그렇기에 더욱더 찝찝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
책의 초반은 '후지슌'이라는 아이의 자살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유서에 적힌 네 명은 가해자 둘과 '유', '후지슌'이 사랑했던 소녀 '사유'이다. '후지슌'과 같은 반이었지만 다른 동급생들 처럼 왕따에 관여하지 않고 무시하며 생활해왔던 주인공 '유'는 왜 자신의 이름이 그곳에 쓰였는지 답을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를 지게 된다.
잊혀지지 않는 기억을 품은 채 20년을 지나보내고 딱 그때와 같은 나이의 아들을 갖게 된 주인공이 절친의 의미와 부모의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토록 잊으려고 애썼지만 잊지못한 그 십자가가 단지 고통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번 생각해보았다. 그가 십자가를 메고 온 것일까, 십자가에 그가 지탱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 아마도 중간에 완전히 내려놓으려 애썼다면 그 십자가의 무게는 더욱더 무거워졌을 지도 모른다. 그가 길을 걸어 언덕을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함께하고 있는 십자가의 모습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유'가 바라본 십자가를 지고 올라선 언덕, 그리고 후지슌이 꿈꾸던 여행의 종착점인 '숲의 묘지'. 아마도 그들은 그곳에서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응어리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독자들, 혹시나 같은 경험을 보고·듣고·행한 독자들 또한 아픈 기억을 삼키고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실제로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때? 너도 알고 있지?"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 학급 회의나 도덕 시간에 일방적으로 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알고 있지?"라고 물었다면 우리는 모두 "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으리라. 그 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었겠는가. 신호등의 색깔은 파랑이 전진이고 빨강이 멈춤이다. 모두 알고 있는데도 신호를 무시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30p)
- "나이프의 말에서 가장 아플 때는 찔린 순간이야." 그러나 십자가의 말은 다르다고 했다. "십자가의 말은 평생 등에 져야 하는 말이지. 그 말을 등에 진 채 계속 걸어가야 해. 아무리 무거워도 내려놓을 수 없고 발길을 멈출 수도 없어. 걷고 있는 한, 즉 살아 있는 한 계속 그 말을 등에 지고 있어야 하는 거야." 어느 쪽이 더 낫냐고 묻지는 않았다. 물었다고 해도 대답할 수 없었으리라.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 대신 그녀는 이렇게 물었다. "어느 쪽이야? 넌 나이프로 찔렸어? 아니면 십자가를 등에 졌어?" (75p)
- 그 애의 죽음도, 우리가 그 애에게 한 일도 마음의 한쪽 구석에는 계속 남아 있었다. 다만 그곳에 뚜껑이 생겼다. 처음에는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억지로 닫았지만, 어느새 뚜껑이 딱 맞아서 그냥 내버려두어도 열리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정말로 열리지 않는지 살며시 뚜껑을 들어올리는 게 인간의 본성이었다. (138p)
- 어느 날, TV에서 범죄 드라마를 보고 깨달았다. 그 드라마에 우리를 닮은 2인조가 나온 것이다. 공범자. 그렇다, 우리는 공범자였는지도 모른다. 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는 2인조처럼 우리는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그런데 우리를 쫓아오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150p)
- 책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도쿄에 와서 또 새로운 페이지를 펼친 것이었다. 하지만 책을 읽을 때 몇 페이지를 읽는 사이에 가끔 주인공을 잃어버렸다. 앞으로 넘길 페이지에 주인공이 제대로 나올지 불안해지기도 했다. 애당초 우리가 보고 있던 책은 정말로 같은 책이었을까? (283p)
- 사람의 기억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의 사건이나 한 사람에 얽힌 추억이 강물에 떠내려가듯 조금씩 멀어지고 잊힌다면 이야기는 간단하다. 충분히 멀어졌다고 여겼던 추억이 갑자기 등골이 오싹할 만큼 생생하게 다가오고, 손에 들고 있던 것이 파도에 씻기듯 한꺼번에 먼 곳으로 떠나기도 한다. 바다는 잔잔할 때도 있고 거칠어질 때도 있다. 밀물일 때도 있고 썰물일 때도 있다. 그것을 반복하면서 추억은 조금씩 바다로 떠내려가서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다. 그 때 우리는 겨우 하나의 추억을 잊어버릴 수 있지 않았을까? (284p)

잊혀지지 않는 마지막 페이지.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힐링의 책, 굳굳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