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칼의 노래
김훈 지음 / 생각의나무 / 2007년 12월
평점 :

구판절판

멋들어진 문장들이 부르는 <칼의 노래 - 김훈>


내 책장 옆 언니의 책장 속에서 계속 눈에 아른아른 했던 <칼의 노래>의 모습. 그리고 이번에 통영 여행이야기를 다시 쓰면서 거북선 모형의 사진을 보고, 정보 검색 중에 만나게 되었던 '통제영'이라는 단어. 이 책은 이렇게 눈에 익다가 미루면서 우연히 나에게 들어오게 되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알법한 한국 작가들 중에서 내가 아직 한 작품도 읽어보지 못한 작가분들이 많다. 김훈 작가는 그 중 하나였다. 옴니버스 에세이에서 조그만 토막글을 읽어본 것 이외에는 작품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김훈의 문장을 제대로 알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야 약간은 느껴본 것 같다.
<칼의 노래>는 비장함 그 자체일 것만 같았다. 충무공 이순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라는 구절은 뭐 지금이야 패러디로 많이들 이용되지만 비장함의 대명사로 남는 말이 아닌가. 그런데 <칼의 노래>는 이 비장함과 더불어 이순신 장군이 느꼈던 수많은 감정들을 내비치고 있다. 이 감정들을, <칼의 노래>는 전쟁상황에서 영웅의 행위로써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입을 빌린 그의 목소리로 보여주면서 줄기차게 가슴을 때린다. 그것도 엄청난 힘으로. 책 전체를 아우르는 분위기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보다는 일정하게 바람타고 흔들리는 불꽃같다. 하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먼 옛날의 그 사람이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감정이 그대로 전해져온다. 시종일관 그가 외치는 자연적인 죽음, 그리고 그가 어깨에 짊어진 백성과 조선과 왕의 무게가 나에게도 너무나 크게 느껴질 정도로. 조용히 폭발하는 그의 내면의 고민과 생각들이 내 속에도 깊이 남았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과 더불어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 책 속의 하나하나의 문장들이다. 조용한듯, 휘몰아치는 듯, 내리치는 듯한 문장들을 만날 때마다 책을 빠른 속도로 읽곤 하는 내가 책 넘김을 멈출 정도로 매료되었다. 끝부분, 그의 눈으로 보이는 고요한 싸움 뒤에서의 관음포의 노을이 잊혀지지 않는다.
'한국문학의 희귀한 스타일리스트'라고 불리는 김훈 작가. 사실 스타일리스트라는 단어는 왠지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바꾸어 말하고 싶다. '멋'이라는 말로.
그의 펜 끝에서 제대로 멋들어지는 단어들, 그의 솜씨가 무척이나 멋있다. 한국문학의 새로운 '멋'을 창조한 김훈의 다음 글이 벌써부터 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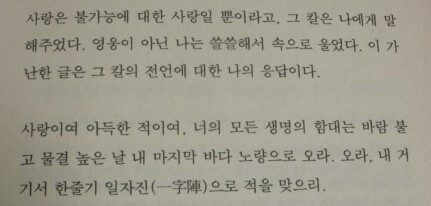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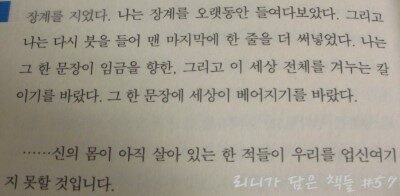
목이야 어디로 갔건 간에 죽은 자는 죽어서 그 자신의 전쟁을 끝낸 것처럼 보였다. 이 끝없는 전쟁은 결국은 무의미한 장난이며, 이 세계도 마침내 무의미한 곳인가. 내 몸의 깊은 곳에서, 아마도 내가 알 수 없는 뼛속의 심연에서, 징징징, 칼이 울어대는 울음이 들리는 듯했다. 나는 등판으로 식은땀을 흘렸다. 캄캄한 바다는 인광으로 뒤채었다. - 26p
울어지지 않는 울음 같기도 하고 슬픔 같기도 한 불덩어리가 내 몸 깊은 곳에서 치받고 올라오는 것을 나는 느꼈다. 방책, 아아 방책. 그때 나는 차라리 의금부 형틀에서 죽었기를 바랐다. 방책 없는 세상에서, 목숨이 살아남아 또다시 방책을 찾는다. - 39p
내가 적을 죽이면 적은 백성을 죽였고 적이 나를 죽인다면 백성들은 더욱 죽어나갈 것이었는데, 그 백성들의 쌀을 뺏고 빼앗아 적과 내가 나누어 먹고 있었다. 나의 적은 백성의 적이었고, 나는 적의 적이었는데, 백성들의 곡식을 나와 나의 적이 먹고 있었다. - 117p
죽음은 저마다의 죽음처럼 보였다. 적어도, 널빤지에 매달려서 덤벼들다가 내 부하들의 창검과 화살을 받는 순간부터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들의 살아 있는 몸의 고통과 무서움은 각자의 몫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각자의 몫들은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무서움이었다 하더라도, 서로 소통될 수 없는 저마다의 몪이었을 것이다. 저마다의 끝은 적막했고, 적막한 끝들이 끝나서 쓰레기로 바다를 덮었다. 그 소통되지 않는 고통과 무서움의 운명 위에서, 혹시라도 칼을 버리고 적과 화해할 수도 있을 테지만 죽음은 끝내 소통되지 않는 각자의 몫이었고 나는 여전히 적의 적이었으며 이 쓰레기의 바다 위에서 나는 칼을 차고 있어야 했다. 죽이되, 죽음을 벨 수 있는 칼이 나에게는 없었다. 나의 연안은 이승의 바다였다. - 135p
칼로 적을 겨눌 때, 칼은 칼날을 비켜선 모든 공간을 동시에 겨눈다. 칼은 겨누지 않는 곳을 겨누고, 겨누는 곳을 겨누지 않는다. 칼로 찰나를 겨눌 때 칼은 칼날에 닿지 않은, 닥쳐올 모든 찰나들을 겨눈다. 적 또한 그러하다. 공세 안에 수세가 살아 있지 않으면 죽는다. 그 반대도 또한 죽는다. 수와 공은 찰나마다 명멸한다. 적의 한 점을 겨누고 달려드는 공세는 허를 드러내서 적의 공세를 부른다. 가르며 나아가는 공세가 보이지 않는 수세의 무지개를 동시에 거느리지 못하면 공세는 곧 죽음이다. 적과 함께 춤추며 흐르되 흘러들어감이 없고, 흐르되 흐름의 밖에서 흐름의 안쪽을 찔러 마침내 거꾸로 흐르는 것이 칼이다. 칼은 죽음을 내어주면서 죽음을 받아낸다. 생사의 쓰레기는 땅 위로 널리고, 칼에는 존망의 찌꺼기가 묻지 않는다. - 202p

읽고 싶었던 김훈 작가의 세설이 절판되었다.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라는 제목. 얼마전까지만 해도 팔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내가 잘못봤나...)
이제는 회원중고에 거의 두배 가까이 가격으로 팔린다는. 그래도 갖고싶다.... ㅠㅠㅠㅠㅠㅠㅠ 살까.... 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