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등 - 개정판
박범신 지음 / 자음과모음(이룸) / 2011년 2월
평점 :

품절

그들은 각자 하나의 외등을 갖고 있었다 <외등 - 박범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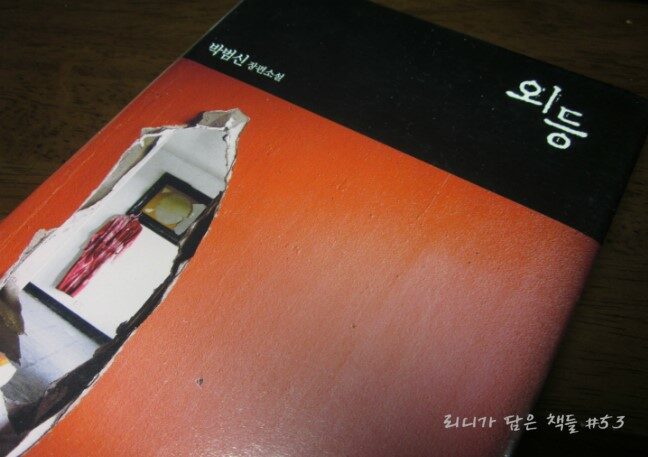
일전에 읽었던 박범신님의 소설과는 다르게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여성 화자가 이야기하는 소설 <외등>은 그 제목처럼 왠지 모르게 가녀리고 외롭고 슬퍼보였다. '한 가지에 손잡이가 길쭉한 회중전등이 거꾸로 묶여 있는 게 특이했다. 건전지가 다 닳아버린 듯, 필라멘트만 약하게 불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책 속의 외등. 눈 속에서 깜빡거리고 있을 그 모습이 더욱 시려서 아련하다. 사실 이 책은 내가 잘 사지 않는 사랑에 관한 소설이다. 그러나 왜 샀냐한다면 물론 박범신 작가가 좋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무언가 '다른'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선뜻 구매했던 것 같다. 역시나 사회 비판적인 성격이 강한 그의 책들이 많기에 <외등>의 사랑 이야기도 시대의 아픔과 맥을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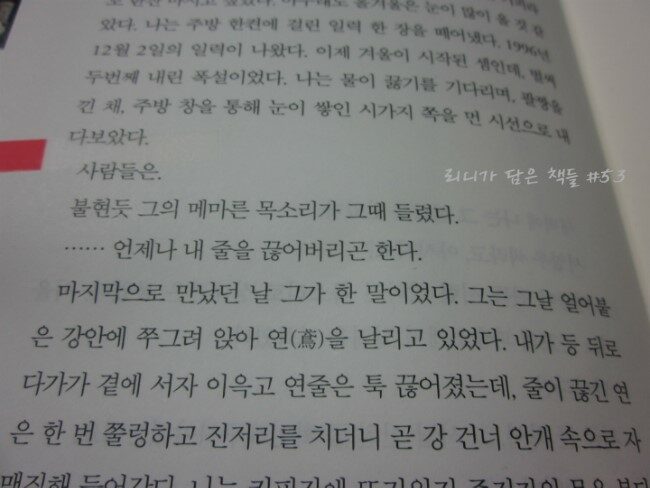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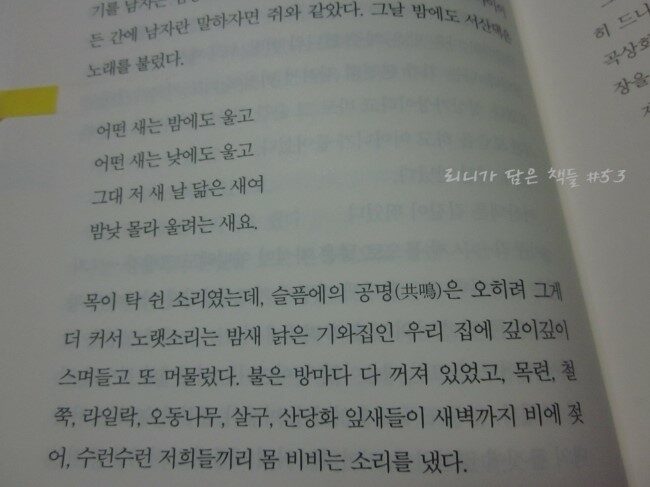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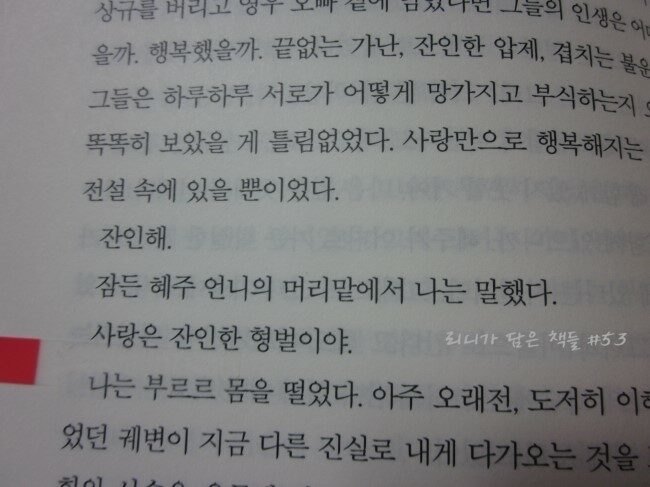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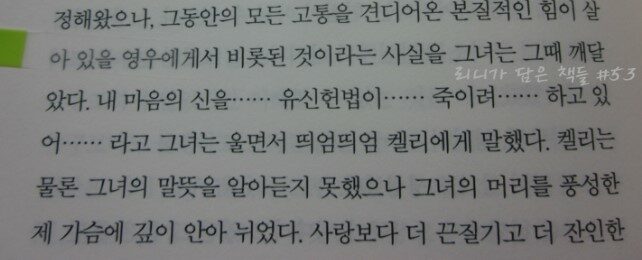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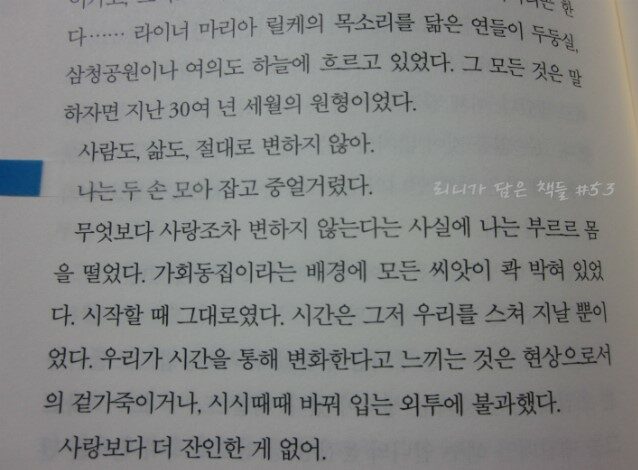
외진 산속, 손전등으로 만든 절상의 외등 아래 가부좌 틀고 앉은 그 사람, 서영우. 나는 분노를 보았다. 내 분노가 아니라 그의 분노를 보았다. 그에겐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목숨밖에 없었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외등이 그가 앉은 산속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세상으로, 도미노처럼 줄지어 켜지기를 바랐을 것이다. - 106p
그녀는 마치 자신이 전신에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 같았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영우씨,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영우 씨에게 오물이 묻을 거예요. 참으로 슬프고 잔인한 배리였다. - 273p
그 이후, 그는 실이 되었다. 탈색된, 잡아당기면 삭아서 툭, 투툭, 끊어져버리고 마는, 그렇지만 그 두 사람에겐 가죽 끈보다도 질기고 철사줄보다도 견고한, 그녀에게 그는 실이 되었다. - 277p
그것은 참으로 이상하고 이상한 사랑이 아닐 수 없었다. 그의 곁에 있어. 그의 곁에 있지 않으면 우리들 사랑도 끝나는 거야. - 396p
그게 서 군에게서 받은 첫인상이야.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과격하더라구. 긴가민가했어. 내가 본 첫인상으로 본 서 군이 진짜인가, 폭력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불같이 주장하는 서 군이 진짜인가. 결국 서 군을 변호하고 돌아올 때 나는 내가 서 군의 본질을 바로 보았다고 느꼈어. 좋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너무 아름답고 착하게 살 사람이었는데, 그러고 보면 시대라는 것, 참 독한거야. - 404p
목련 나무는 오랜 세월을 잊고 환하게, 순백색으로 피어났다. 그것은 쓸쓸한 외등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가미카제처럼 외치고 싶은 분노의 외등이 아니라, 사랑의 외등이었다. 나는 꿈 속에서, 목련 나무에 걸린 등불들이, 세상 끝까지, 산과 강을 넘어, 도미노로, 환하게, 만개한 목련꽃처럼, 제 가슴의 외등을 일제히 켜드는 것, 오래오래 보고 있었다. -441p
빨갱이 낙인과 함께 세상을 살아갔던 서영우, 진정한 사랑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온 민혜주, 비뚤어져버린 외로운 사랑에 아파하지만 돈에 굴복하는 노상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서영우의 동생 재희. 그들의 지독한 사랑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각자의 외등이 서로를 똑바로 비춰주지 못해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쓸쓸하고 미련한 사랑이야기보다는 70년대의 아픔이 더 눈에 들어왔다. 학생운동, 재벌,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 이 아픔이 뼛속까지 서려있는 책의 인물들을 생각하며 내가 읽은 박범신의 두번째 사랑 이야기는 재미있게 읽긴 했지만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서 약한 느낌이어서 아쉬웠다. 그러나 중간중간 연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들은 마치 시를 읽는 듯 아름다웠다. 시종일관 은은한 불빛을 쫓아다니는 듯 몽롱했다. 그리고 왠지 침울했다. 그들의 외등이 꿈 속에서나마 순수한 사랑의 외등으로만 켜질 수 있기를 -
p.s 이 작품 tv문학관에서 다뤄진 적이 있다고. 영상으로 만드니까 완전히 신파멜로다.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