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으면서 괜히 서글퍼 졌던 대목이다. 새끼를 낳으면서 엄마인 나, 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어느새 자신의 이름보다도 ‘엄마’라는 이름에 더 익숙해져 버린 엄마가 떠올랐다.
엄마에게도 소녀인 시절이 있었고 빛이 나는 20대가 있었을 테지만, 그녀는 나의 엄마가 된 이후부터 그녀에게 여자로서의 인생보다는 엄마로서 가정을 보살피고 아이의 양육에 힘써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을 것이다. 자신만을 생각하던 자신 이외의 엄마로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출산과 함께 엄마라는 자신도 함께 재탄생 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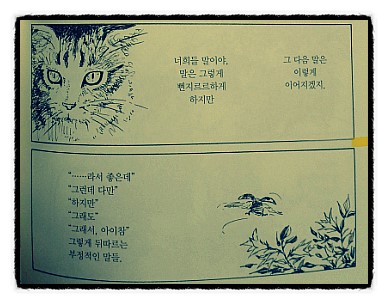
고양이의 일과로 한 권이 점철되었다기 보다는 고양이의 입과 눈을 빌어서 우리의 모습을 깊숙이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다. 언제나 말로만 그를 듯이 포장하고 있는 우리는 마냥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을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포장하려고만 아등바등하고 있다.

동물 애호가라며 등장하는 한 여자는 자신의 고양이가 길고양이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쾌하게 느끼며 길고양이를 내쫓으려 하고 있다. 물론 그녀는 길고양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겠지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이 그림이 씁쓸하게만 느껴진다. 동물 애호가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그녀에게 애정의 대상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신의 고양이인 것이지, 길에서 생활하고 있는 길 고양이는 아닌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일들은 여전히 주변에도 만연하고 있다. 인권이라는 이름을 들여다 보자. 우리는 우리의 인권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목 높여 주창하고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바로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와 결부된 나의 인권이니 말이다. 조금 눈을 돌려서 내가 아닌 타인, 옉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과연 우리 스스로가 챙기고 있는 만큼의 인권을 그들에게도 권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만화 속의 앙칼진 여인만이 스쳐지나간다. 저 여자의 모습은 우리의 못난 자화상이 아닐까.
금새 읽어 낸 한 권의 책을 덮으며 뭔가 몽롱한 느낌이 든다. 고양이 집사는 아니기에 그림 속 고양이들의 표정 하나하나에는 모두 공감할 수는 없으나, 그 그림과 함께 버무려진 이야기들을 보면 어느새 고양이들의 몸짓과 표정에 녹아들게 된다. 정말 그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맴돌게 되는 잔잔한 느낌의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