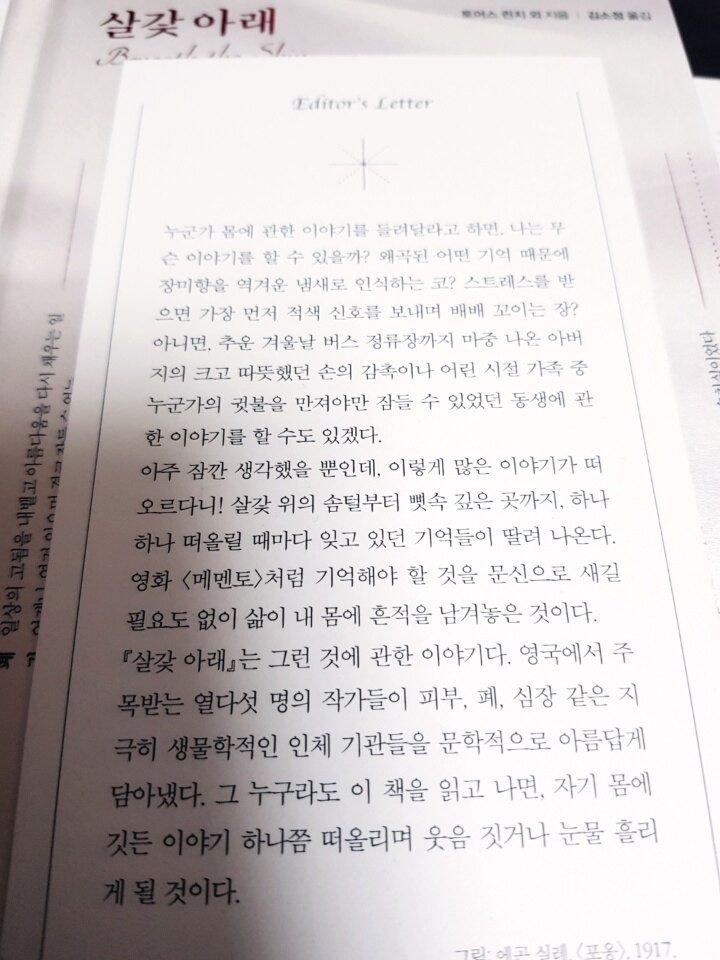-

-
살갗 아래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에 관한 에세이
토머스 린치 외 지음, 김소정 옮김 / 아날로그(글담) / 2020년 2월
평점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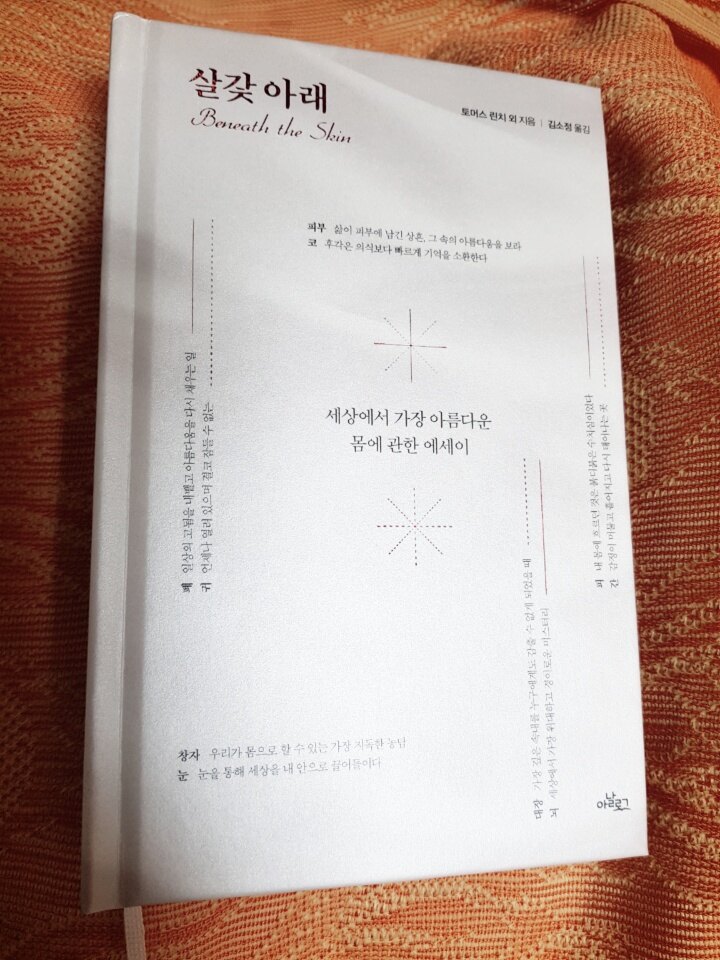
‘이 책은 작가 열다섯 명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몸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고찰하고 써 내려간 열 다섯 편의 글을 모아 엮은 것이다.’(p.20)
‘열다섯 명의 작가들은 자기 자신을 이루는 부분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처한 모든 곤경과 상황을 조금은 더 잘 알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내장과 폐 그리고 담낭이나 피부 같은 유력한 용의자들의 목록을 만들어 살펴보았다.’(p.20~21)
이 책은 ‘몸’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리 몸을 이루는 각각의 기관들은 15명의 작가들을 통해, 어떤 이야기는 추상적이고, 어떤 이야기는 의학적이며, 어떤 이야기는 개인의 경험과 연결지어서, 어떤 이야기는 사회적인 의미로서, 또 어떤 이야기는 우주적인 의미로 확장되어 전달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소재나 방식이 두 개 이상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기관에 대한 생각을 보다 효과적이고 다채롭게 전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 작가들은 인간과 인간성, 인간을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나오는 복잡하고 다양한 잡음들, 존재의 본질과 그 본질을 규명하는 데 있어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간략하지만 비교적 정교하게 다루고 있다. 읽기에 부담이 없지만 그렇다고 내용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말이다. 생각을 단절시키지 않고 연결하고 공명하여 확대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좋은 책이다. 예를 들어 ‘피부’에 대해 다룰 때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피부의 변화를 통해 인간의 늙어감이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움의 발현임을 생각하게 한다. 또 ‘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때는 시문학과 연결시켜 인간의 호흡이 생물학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차원에서의 호흡이라는 신비한 작용과 의미도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또 ‘맹장’을 다룰 때는 가장 부질없어 보이는 것들도 인생의 어느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린 아이일 때는 몸에 대해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저 주어져 있기에 마구 사용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관리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낮에, 태양을 이겨보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직시하던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력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쯤, 안경을 껴야만 제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쯤에야, 맨눈인 상태가 그렇게 자유롭고 편안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에 후회가 밀려들었다. 이후에도 그런 식으로 내 몸의 부분부분들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아가는 실수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이 책을 읽어보니 아직 내 몸의 많은 부분들이 그 소중함을 확인받지 못한 채, 존재감은 없어도 확실히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해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가 어느 부분이 탈이 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또 후회하고 아파하리라 - 고, 그러지 말라고 신께서 이 책을 내게 붙여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인간의 몸은 하나의 우주와 같다고 하여 ‘소우주’라는 별칭이 있는데, 우주까지 갈 것도 없이 아직 미지의 동산인 내 몸을 귀히 여기고 잘 탐색하여, 죽는 날까지 덜 아프고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한 것이다. 요즘 들어 몸이 다시 무거워지면서 감정이 가라앉는 걸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연결된 사람들, 일들, 세상과의 불화까지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몸은 세상과 나라는 자아 사이의 경계와 같은 것이다. 어떤 독자에게는 이 경계선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도록 잘 보살필 수 있는 지혜 혹은 방법을 이 책 ‘살갗 아래’에서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