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b가 쉰다. 아이들은 강아지처럼 b를 졸졸 쫓아다닌다. 며칠동안 먼 등교길을 대비해 든든하게 아침을 먹느라 새벽 강행군을 한 덕에 정신이 몽롱한 나는 아이들이 b를 졸졸 따라다니는걸 흐뭇하게 바라봤다. 모처럼 쉬는 b를 위해 장구할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혼자였다면 너끈히 걸어도 됐을 길을 아이들 피곤할까봐 택시까지 타는 대인배다운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내가 으쌰으쌰 저녁을 준비하지 않아도 됐고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크게 싸우는 일 없었다. 우리끼리 드림팀이라며 팀에선 팀웍이 중요하니 자기 전에 내일 가져갈 것을 가방에 넣는 센스를 발휘하도록 팀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어제 애써서 채를 썬 감자도 맛있게 볶아졌다. 이제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는데 옥찌가 농담처럼 누가 제일 좋고 얘기를 했다. 지희가 한번씩 그럴 때가 있다. 이모는 화를 잘내니까 나는 누구누구가 더 좋아. 마치 '니가 옆에서 나를 챙겨주는거야 말릴 수는 없지만 안 그래도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많아'란 느낌의 말. 그 말의 다른 의미는 '이모가 화를 좀 덜 냈으면 좋겠다'는 거다. 헌데 나는 나 좋을대로만 옥찌를 봐버린다.
-지희가 그런말 안 해도 이모가 지희한테 인기 없는거 잘 알아. 너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놓고 나는 삐졌다. 바쁜 b를 대신해 한가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제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헌데 나는 은연중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란 생각을 했나보다. 정말 삐진 나는 지희가 말을 걸어도 묵묵부답, 동굴로 들어가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하다 우린 다시 전처럼 잘 지내게 되었다. 내가 뭐라 뭐라 하는데 옥찌가 이모가 좋아, 지금 우리 옆엔 이모가 있잖아.란 말을 해줘서는 아닌 것 같고.
저녁에 카레를 한다고 감자,-한 박스 사놓은게 싹이 나고 난리다- 양파, 새송이 버섯을 대충 썰었다. 카레 냄새가 솔솔 풍기자 지민인 나를 꼬옥 안아줬다. 이렇게 맛있는거 해줘서 고맙다며. 조그만 팔이 허벅지 근처를 꼬옥 안는다. 뭉클하다. 뭉클할 새도 없이 누나랑 싸워서 큰소리가 나긴 했지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희 알림장을 봤다. 무슨 준비물이 그렇게 많은지. 3학년인데도 혼자 준비물을 챙기기가 어렵다. 1학년 때의 지희는 어땠을까. 자기가 못사는데도 돈만 줘서 짜증났다고 한다. 그럼 지금은 짜증나지 않을까. 내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해줬다. 지금은 이모가 챙기긴 하는데 뭐는 안 되고 군것질도 못하고 짜증나지. 지희가 빙긋 웃는다.
봄비가 내리던 날, 지희는 물방울들이 톡톡 산을 적셔줘서 산이 트림하는 것 같은 그림을 그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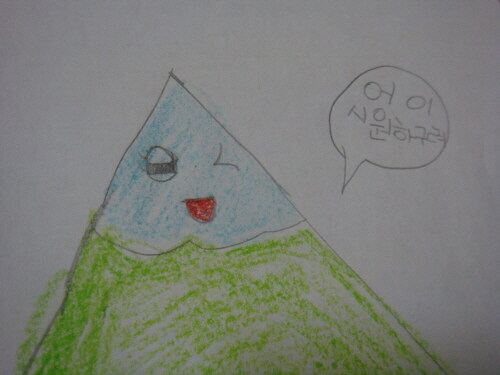
아이들은 사이좋게 우산을 쓰고 등교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