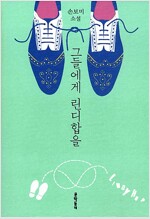날렵한 문장을 타고 다른 세상으로 날아 오르는 이야기를 쓰는 작가, 손보미에게 알라딘 독자가 물었습니다. 손보미 작가가 보내온 답변을 소개합니다.
이벤트 보기
http://www.aladin.co.kr/events/wevent.aspx?EventId=162650
작가님이 힘들고 지쳤을 때 특별히 위로가 되는 책이 있었는지요? 그렇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올리버 색스의 『깨어남』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 그냥 아무 장이나 펼쳐서 읽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도 하고 저도 모르게 경탄하거나 미소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루이자 길더의 『얽힘의 시대』에 실린 「붕괴」라는 장을 읽고 갑자기 눈물을 쏟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감정이라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삶의 불가해성을 일깨어주는 책들이 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저와 동년배의 작가라서 늘 관심 갖고 있는 작가님, 신작이 나와서 반가워요. 손보미 작가님은 작품의 제목을 어떻게 붙여주시나요? 궁금해요.
제목을 짓는 것은 사실 저도 무척 어려워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제 데뷔작 「담요」의 원래 제목은 ‘담요의 죽음’이었고, 「폭우」는 원래 ‘중력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이 세상에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제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작품에서 떠오르는 가장 구체적이고 기억에 남는 단어들로 단순하게 제목을 짓는 걸 좋아합니다. 때때로 좀 촌스럽게 느껴지거나 유치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게 좋습니다.
만약에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도 작가의 길을 걸으실 건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작가를 하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만큼의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아마, 제가 작가가 아닌 다른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소설을 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쓰시는 소설들이 독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저의 이야기를 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욕심인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누군가 제 소설을 읽고 단 한 장면, 혹은 단 하나의 문장에 잠시, 아주 잠시라도 멈춰 서준다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첫 문장‘은 무엇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나, 작가, 작품은 시시때때로 달라집니다. 세상에 너무 좋은 문장과 소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어떤 것의 경향이 있을 순 있을 겁니다. ‘첫 문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엔 너무 좋은 첫 문장이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경향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문장은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첫 문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멕시코 만류가 흐르는 바다에서 조그만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노인은 지난 84일 동안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과학책이나 외국 영화 또는 외국 드라마도 많이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감을 받은 책 이야기는 작가들에게 흔히 듣지만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는 듣기 힘들어요. 손보미 작가에게 아이디어를 준 영화나 드라마는 어떤 건가요?
무척 많습니다만, 첫번째로 꼽는다면 jj 에이브럼스 감독의 <로스트>입니다. 어떤 특정한 영감을 받은 걸 넘어서서 과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었으며, 서사 속에서 수수께끼가 작동하는 방식들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다른 하나만 더 꼽는다면 매튜 와이너의 <매드맨>입니다. 문학보다 훨씬 더 문학적인 장면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작품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갖 감정과 인생을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담고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소설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작가님, 문득 계절에 대해 여쭙고 싶어졌어요. 작가님의 소설을 읽다 보면, 작가님은 어떤 계절을 좋아할지 궁금해지더라구요. 추측이 잘 되지 않았어요. 햇빛이 비치는 수영장의 물이 떠오르는 그런 여름이 떠올랐다가도 또 어느 때는 겨울이 떠올라요. 그게 궁금해요! 작가님의 소설을, 계절에 비유한다면, 어떤 계절에 비유할 수 있을지.
아, 이 질문이 뭔가 저의 마음을 푹 찔렀어요. 저는, 아마도 겨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추운 건 정말 싫어하는데, 피부에 와닿는 차가운 공기와 코끝이 어는 느낌, 그리고 입김을 좋아합니다. 어디선가에서 잠들어 있던 저를 끄집어내주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거든요.
손보미 작가님이 쓴 글들 중에서 계속 되뇌이는 문장이 있으신지요? 혹은 가장 아끼고 보듬게 되는 문장이나 표현, 주인공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작가님의 글 중 탐이 났던 문장도 알고 싶어요.
계속 되뇌는 문장은 거의 없는데, 제가 쓴 「임시교사」의 마지막 문장을 약간 좋아합니다. “잠들기 위해 눈을 감는 건, 생각보다는 언제나 쉬운 일이었다.”
편혜영 작가님의 「저녁의 구애」를 처음 읽었을 때, 마지막 부분에 마라토너가 뛰어오는 부분을 읽고 너무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 그 장면을 아무 이유도 없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단편소설 「폭우」를 인상 깊게 읽은 독자입니다. 작가에게 기억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제게 기억은 그림자 같은 존재이며, 그 속살을 헤집어 보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 작가님에게는 또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시고 멋진 소설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프리모 레비는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놀라운 도구인 동시에 속이기 쉬운 도구이다.” 저는 대개 많은 것을 잊어버리는 편입니다. 혹은 어떤 것을 제멋대로 잘못 기억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그런 잘못된 기억이 저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건, 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를 상기하게 되는 시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독자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 멋진 소설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