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자가 일어선다. 그림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가여운 사람들은 알고 있다. 전자상가에서 소박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은교와 무재. 도저히 삶을 견딜 수 없어질 때 사람들의 그림자가 일어선다. 일어서는 그림자를 붙잡는 것에 대한 초현실적 상상에서 출발한 이 소설, 따뜻한 죄책감이 흐른다. 소설이 떠오르게 만드는 어떤 기억이 아프다.
소년 무재의 부모는 개연적으로, 빚을 집니다.
개연이요?
필연이라고 해도 좋고요.
빚을 지는 것이 어째서 필연이 되나요?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나요.
그런 것 없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글쎄요, 하고 무재 씨가 나무뿌리를 잡고 비탈을 내려가느라 잠시 말을 쉬었다가 다시 말했다.
그런 것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자칭하고 다니는 사람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조금 난폭하게 말하자면, 누구의 배도 빌리지 않고 어느 날 숲에서 솟아나 공산품이라고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알몸으로 사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자신은 아무래도 빚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뻔뻔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17~18p)
무재의 아버지. 개연적으로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그는 가족을 부양하다 논리적 인과관계에 따라 개연적으로 빚을 지고, 개연적으로 사망한다. 전자상가의 사람들이 개연적으로 각자의 아픔을 겪고 개연적으로 일어선 그림자를 지니게 된다. 그들의 고통이 개인 문제가 아닌, 개연적인 어떤 구조 때문이라는 걸 그들은 안다. 그림자를 눌러두기엔 그의 존재가 지닌 가치가 지나치게 가볍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존재를 너무 쉬이 가볍게 말하기 때문이다.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전자상가, 상가에서 아버지는 장사를 했다. 사람들은 쉽게도 상가가 있던 곳을 슬럼이라고 말한다. 그곳에 대한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도.
아버지가 여기서 난로를 팔았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나 누나들하고 와 보면 멀리서부터 그가 가게 앞에 의자를 내어 두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중략) 손에 기름이 밴다고 순대 밑동에 신문지를 감아서 내어 주던 모습이나, 집으로 돌아갈 때 동전 몇 개를 쥐여주던 모습이 어제 본 것처럼 선명한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장사를 어떻게 했을까 싶은 만큼 말도 서툴고 여러 모로 서툰 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함께 순대를 먹으며 앉아 있다가도 사람이 지나가면 슬쩍 일어나서 무엇을 찾느냐고, 뭐가 필요하냐고 말을 걸곤 했어요. (중략) 나는 이 부근을 그런 심정하고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 슬럼이라느니, 라는 말을 들으니 뭔가 억울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가난하다면 모를까, 슬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치 않은 듯해서 생각을 하다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무재씨는 말했다.
언제고 밀어 버려야 할 구역인데, 누군가의 생계나 생활계, 라고 말하면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슬럼,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버리는 것이 아닐까. (113-11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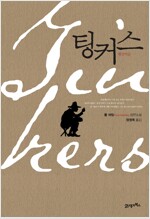 아버지에 대한 무재씨의 기억이, 그 지극히 절제된 서술이 몹시도 슬펐다. 의연할수록 슬픔은 더욱 와닿기 마련이다. 죽어가기 여드레 전, 절제된 서술로 기억하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담긴 소설 <팅커스>에도 그런 의연한 슬픔이 드러나 있다. 죽어가는 남편을 보면서도 애써 웃어보는 아내의 시선이 기억에 남아 기록해본다.
아버지에 대한 무재씨의 기억이, 그 지극히 절제된 서술이 몹시도 슬펐다. 의연할수록 슬픔은 더욱 와닿기 마련이다. 죽어가기 여드레 전, 절제된 서술로 기억하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담긴 소설 <팅커스>에도 그런 의연한 슬픔이 드러나 있다. 죽어가는 남편을 보면서도 애써 웃어보는 아내의 시선이 기억에 남아 기록해본다.
사타구니의 암으로 인한 첫 번째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두 다리가 해변의 죽은 바다표범처럼 부어오르고 나무토막처럼 단단해진 것도 어쩌면 운동 부족 때문인지 몰랐다. (중략) 그의 아내는 밤에 침대에서 남편의 파자마 속 다리를 만질 때면 떡갈나무나 단풍나무가 떠올라, 지하실 그의 작업장으로 내려가 사포와 착색제를 가져다 마치 가구처럼 반질반질하게 다듬고 붓으로 색을 칠하는 상상을 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다른 생각을 해야만 했다. 한번은 내 남편이 탁자라니, 하는 생각이 들어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막으려다 큰 소리로 씨근거리기도 했다. 그런 뒤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아 울고 말았다. (14p)
아버지는 많이 말랐다. 반세기 넘게 사용한 몸은 조금씩 마모되기 시작한다. 이삼 주에 한 번 아버지의 발톱을 잘라 드린다. 아버지의 발톱은 꼭 아버지처럼 말랐다. 고목나무처럼 마른 아버지의 발톱을 보며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을 느낀다. 언젠가 이 발톱이 영영 말라버릴 날이 올 것임을 생각하면 선득해지곤 한다. 백의 그림자와 팅커스를 읽으면서 고목나무 껍질처럼 마른 아버지의 발톱을 떠올렸다. 그 순간엔 눈물이 나서 쑥스럽게도 지하철 역 앞에서 혼자 훌쩍대고 말았다.
누군가 발견하거나, 발견하지 않거나.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있다. 안간힘을 써서 그림자를 누르며, 그림자를 따라가고 싶은 욕망을 다스리며. 그보다 큰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추억하며. 오가는 길이 번거로울까 스무 개의 알전구에 다시 한 개의 알전구를 추가해주는 오무사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몇만원 짜리 중고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는 소박한 연인의 마음으로.
새해엔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무재와 은교, 그들이 떠난 먼 길, 반드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길 바란다. 은교씨와 무재씨가 그 새벽녘 꼭 누군가를 만났길, 뜨거운 국물도 마시며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라도 주억거려봤길 바란다. 무재씨와 은교씨의 소박한 말투를 타 분야 MD님과 흉내내며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숫기없고 간이 덜 밴 말투를 따라하다 보면 조금쯤 기름기가 빠지는 느낌이다.
올해 가장 후회되는 일 중 하나를 꼽자면 이 책을 만족스럽게 프로모션하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반면 이 책의 초판 1쇄를 지니고 있다는 건 먼 훗날 몹시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현재 판매중인 도서도 초판 1쇄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만난 가장 희고 맑은 슬픔, 황정은의 白의 그림자에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