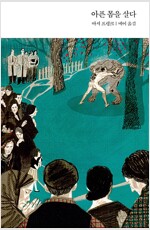<쇼코의 미소>, <내게 무해한 사람>을 통해 마음의 여린 결을 섬세하게 묘사한 작가 최은영의 첫 장편소설 <밝은 밤>이 여름 밤 독자를 찾습니다. 출간에 맞추어 최은영 작가가 독자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공유합니다. | 질문 : 알라딘 도서팀 김효선
좋아하는 친구에게 오랜만에 받은 편지 같은 소설입니다. 2020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에 '작년 한 해는 소설을 제대로 쓸 수 없었다'라고 적어두신 작가노트를 보고 놀라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인생의 좋은 때와 어려운 때를 겪듯이 저 또한 지난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고 어려운 날도 있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은 어려운 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작가노트를 쓸 때와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의 일 년 동안 글을 못 썼지만 그 이후로 『밝은 밤』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도 돌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힘들고 벗어나고만 싶었지만 그 시간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연은 이혼 후, 자신을 아는 이가 거의 없는 희령에서 천문대 연구원으로 새 삶을 시작하려 하는 인물입니다. 최은영 작가의 두 권의 소설집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대견하고 잘 참던 소녀, 청년들이 어른이 되어 나타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이는 많이 참고 자기 욕망을 억누르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마음으로 울고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느라 겉으로는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지요. 자기 마음을 애써 피하며 살아오느라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울면서도 자기가 어떤 감정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인내의 한계에 다다라 더는 자기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을 그려보았습니다.
지금 지연은 '마음의 보호대 같은 것이 부러진'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연이 겪는 심장이 뛰는 증상이라든지 아픈 마음, '기억되고 싶지 않다'는 삶의 태도 같은 것들이 이 시대의 우리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증상이 아닐까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지연의 마음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감정을 느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 마음을 보호하는 일에도 힘이 필요한데, 마음을 보호하는 힘조차도 낼 수가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날이 있지요. 그런 날이 하루일 수도 있고, 이틀일 수도 있고, 몇 주, 몇 달, 몇 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이런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감추려고 하면 충분히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매일 웃으면서 보는 사람이 사실은 지연이처럼 혼자 집으로 돌아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지연이 할머니의 밥 위에 발라낸 박대의 살을 올려놓는 장면이 좋았습니다. 지연과 할머니, 삼천과 새비, 지연과 지우가 서로를 먹이고 아끼며 나누는 그 마음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밥은 먹었어?’ 그런 안부 인사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먹는 걸 알면 마음이 좋지 않죠. 같이 밥을 나눠 먹으면서 드는 정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음식을 마련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느 정도의 간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리해야 더 건강에 이로울지 등등을 생각하며 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음식에 담겨서 실제로 먹는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소설 속에서 새비 아저씨를 '밝은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작가가 생각하는 '밝은 분'은 어떤 사람일지가 궁금합니다.
‘밝은 사람’은 자기 내부를 태워서 빛을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어두움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존재고, 어두움에 빠져서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히기도 하죠.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만나본 ‘환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배우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이라면 가지기 쉬운 자기중심성,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고 싶은 마음, 타인을 상처 입혀도 좋으니 자기 욕구만 추구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분명히 바라보고 하나하나 태워가는 사람,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새비 아저씨도 제게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별을 관찰하는 지연과 할머니의 마음처럼, 때론 원리 혹은 섭리 같은 것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가 읽기 좋은 책을 권해주실 수 있을까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상실 수업』, 아서 프랭크의 『아픈 몸을 살다』, 리베카 솔닛의 『멀고도 가까운』, 캐럴라인 냅의 『명랑한 은둔자』가 떠오르네요. 엄유정 작가의 『나의 드로잉 아이슬란드』도 저에게는 많은 위로를 준 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