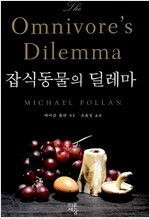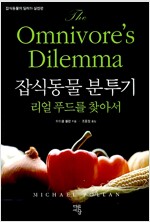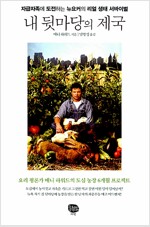
샌디에고의 한부부는 치솟는 물가 얘기를 나누다가 한달동안 하루 1달러로 식비로 해결하는 무모한 도전을 결심하고, 한 프리랜서 기자는 브룩클린 자택 뒷마당에서 6개월간 농사를 지어서 한달의 식생활을 해나가는 프로젝트로 기사를 써보지 않겠냐는 뉴욕매거진의 제의를 받아들인다.
이들은 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했을까?
미국의 식생활은 "풍요속의 빈곤" 그 자체이다. 한국의 대형마트보다 더 큰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의 일반 수퍼마켓은 온갖 제품들로 꽉 차있지만, 대부분 가공식품이고 채소와 과일등의 신선한 식품은 얼마 되지 않는다. 거기다 빈곤한 지역의 수퍼마켓은 신선한 과일이나 고기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대형수퍼 체인이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오히려 빈곤층이 부자들보다 기본 식료품에 대해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파머즈 마켓이나 유기농 수퍼마켓을 이용하면 신선한 식품을 쉽게 살 수도 있지만, 둘다 구매력있는 부촌 지역에만 위치하고 유기농 수퍼마켓의 식재료값은 당연히 비싸다.
내 인생에 최고로 맛없었던 오렌지는 LA 도심의 수퍼마켓에서 사온 오렌지였고, 그 후 안좋아 보이는 동네의 대형 수퍼마켓에서는 과일을 사지 않게 되었다. (일본인 학생은 그 수퍼마켓에서 산 소고기를 먹고 배가 아픈 이후로 다시는 그곳에서 고기를 사지않는다고 했다),
식생활의 변화는 부부 모두의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
두 책을 읽다보면 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너그러운지, "하루 1달러로 먹고 살기"의 무모한 도전은 남편 크리스토퍼의 아이디어였지만 결국 부인 케리가 자잘한 식재료 쇼핑과 메뉴짜기, 손이 많이 가는 대부분의 요리를 맡게 되고, "내 뒷마당의 제국"의 부인 리자는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꼬여가는 프로젝트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남편의 불만과 짜증, 도시주택 뒷마당에 농사와 목축을 하면서 생기는 각종 문제점을을 다 받아준다.
책속의 두남편 크리스토프와 매니 둘다 원대한 포부는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서는 보통의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하루하루의 고민-한끼니를 어떻게 영양학적으로 균형있으면서 맛있고, 비싸지않은 가격으로 준비해야 할까에서 시작되는 것에 대한 배려가 살짝 부족한것 같다.
"하루 1달러로 먹고 살기"에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부부의 일상이 보이면서 재밌게 읽어나갔지만, "내 뒷마당의 제국"에서는 저자가 배수가 잘안되는 자신의 뒷마당의 문제에 이상하게 집착하면서 실제로 가축을 기르고 채소를 재배하면서 느끼는 상호작용보다는 꼬여가는 사태에 대해 항상 불만과 짜증이 가득한 모습이라서 즐겁게 책을 넘길 수가 없었다.
마이클 폴란의 잡식동물의 딜레마를 읽으면서, 이런 좋은 책이 나오는데도 왜 미국인의 식생활에는 변화가 없나 궁금했는데, 미국 푸드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 모든 것의 시작인 식재료 쇼핑에서부터 미국인의 식생활은 잘못된 출발을 하고 있으니 그 변화가 쉬울리가 없다. 잡식동물의 딜레마가 좀 어렵고 긴 편이긴 하지만 청소년버전인 잡식동물 분투기도 출간됐으니 이제는 쉽게 접해 볼 수 있다. (처음엔 원서 생겼다고 좋아했다가, 영어로 읽느라 고생을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