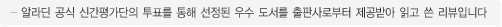[음식 그 두려움의 역사]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음식 그 두려움의 역사]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음식 그 두려움의 역사
하비 리벤스테인 지음, 김지향 옮김 / 지식트리(조선북스) / 2012년 8월
평점 :

절판

음식 루머를 해부할 기회를 한권의 책으로 얻었다. 소비자가 시장에서 어떤 음식을 구매할 지 그 과정에서 갖는 공포나 미스터리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담겼다. 소비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식품 공포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누가 주도했을까?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카페인에 중독된다는 음식물의 위협 심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파고들어 있는 걸까.
의학과 과학, 역사, 심리한 등 다양한 영역을 줄타기하며 음식의 이해관계를 차근차근 정리했다. 사실 음식에 대한 콘텐츠는 참으로 다양하다. 몸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조리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부터 어떤 음식점이 착한지 나쁜지 등 우리의 눈과 귀는 먹는 것에 언제나 열려 있다. 하지만, 보여주기 위해 보여주는 콘텐츠들은 우리에게 진실을 전부 보여주지 못하기도 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 알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자본주의 공장제 시스템에서 탄생한 것이기도 하다. 내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 때로는 음식괴담에 떨기도 하고, 그 부작용으로 블랙 컨슈머가 생기기도 하는 등 의외로 많은 음식문제들이 우리 삶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음식 공포는 인터넷을 만나 더 쉽고 빠르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음식이나 식품 산업을 알게 되면 이 먹거리에 대한 공포는 거대 자본만 위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다.
"선의의 공중 보건 당국은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과대 포장해 자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상기시키려 애썼다. 또 가정학자들은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교육함으로써 교육 시스템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과학자와 의사들은 또 어떠한가? 지방, 설탕, 소금 및 수많은 종류의 식품에 내재된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를 하겠다며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지원받았다.중산층을 타깃으로 하는 ‘품격 있는’ 신문과 잡지들이 첨병을 자처했고, 나중에는 라디오와 TV뉴스, 토크쇼도 가세했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제 이런 기계적인 관심말고, 진짜 내가 먹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식탁에 왔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와 가짜 정보를 구별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양한 음식 콘텐츠 앞에 무지하다면, 우리는 계속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최고의 과학, 의학, 정부 전문가들의 든든한 후원이 있었지만, 진실하지 않은 음식들.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권위에 의존한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좌지우지할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
도시민의 삶을 사는 이상 주어진 대로 먹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의 음식을 진정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일까. 우리가 먹는 것 앞에 똑똑해져야 하는 이유는 책 곳곳에 적혀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커피다. 아침에 회사에 갈 때 잘 내린 원두커피 한 잔을 사서 마시고, 점심 식사 후에 인스턴트 커피를 타 마시고, 그런 후에도 생각이 날 때면 간간이 타 먹는다. 이렇게 자주 먹는 커피에 대해서도 그런데 도무지 아는 게 없다. 그냥 있으니 먹을 뿐이다. 수많은 섭취물 중 음료 한잔도 이럴진대 우리는 우리의 몸을 구성할 영양소들에 아주 깜깜하게 살고 있을 터다. 집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옷을 잘 차려입고, 해야 할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먹는 것'에는 무지하지 않은가. 물론 모두가 다 음식에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진짜 살아가는 것의 문제다.
얼마 전 기사에서 맛있는 식당은 모두 '소금'을 잔뜩 넣는 것이 맛의 비결이라는 내용을 읽었다. 그리고 한 기사에서는 시중에 파는 치킨은 모두 소금이 평균 섭취량을 넘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도 알았다. 만약 우리가 음식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곧장 하루하루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것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인구의 90%가 농촌에 거주했던 과거에는 우리 식탁의 먹거리에 관여하는 외부인은 제분소와 소금, 당밀 등 요리에 필요한 몇 가지 필수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전부였다고 한다.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도시화, 운송 혁명은 미국의 이런 모습을 통째로 바꿔 놓았단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서구화된 지구에서 우리는 먹는 것까지도 모두 같은 모습으로 통일되었고,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역시 모두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에 항상 불안해 하며 은수저를 음식에 넣어보는 일을 가까운 미래에 하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어쩌면, 먹지 않고 다양한 알약을 섭취하는 것으로 대체할 날이 올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 것 같다. 식탁 앞에 모여 앉아 다정하게 수다를 떨며 보내는 시간을 잘 차린 음식이 만들어 주지 않던가. 그런 시간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 그 두려움의 역사>를 읽어보는 건 어떨까. 음식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영양제로 먹는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 등도 자세하게 나온다. 계란이나 새우를 많이 먹으면 축적되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비밀도 잘 나와 있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나 읽을 만한 이야기들이지만, 진짜 내 몸을 생각한다면 한번쯤 알아두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하다.
단순히 마르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동물이 불쌍해서 채식을 하는 음식에 대한 자신만의 원칙을 넘어서 보는 게 어떨까. 먹는 것이 곧 우리다. 그리고 어떻게 먹는 지가 그 사회를 결정한다고 본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고, 어떤 음식의 역사를 후대에 물려줄 지 이제는 생각해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