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가 좋아하는 것들, 강릉 ㅣ 내가 좋아하는 것들 14
이정임 지음 / 스토리닷 / 2024년 6월
평점 : 


강릉 사람이 쓴, 강릉의 모든 것이다. 그냥 강릉에 여행가서 느꼈던 감성을 써내려간 책들과 달리 찐 강릉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강릉에서 태어나 강릉에서 살고있는 저자의 일상과 관련있는 키워드들이 단편처럼 모여있는 에세이인데, 1박 2일 잠시 놀러갔다가 떠나는 관광지에서 또 다른 매력을 품고 있는 곳이 강릉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책의 첫 시작은 '지누아리'로 시작한다. 강릉이 고향이면서도 지누아리의 존재는 이 책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 저자의 소울푸드는 지누아리로 만든 반찬이라고 했는데, 나의 소울푸드는 '감자옹심이'라고 할 수있다. 메밀막국수와 메밀전병도 우위를 가릴 수 없는 나의 첫사랑이지만 감자옹심이는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음식이다. 정말 제대로 된 감자옹심이는 강원도에서만 맛볼 수 있다. 가끔 엄마가 그리운 날 따끈한, 담백한 맛의 쫀득한 감자옹심이가 생각난다. 뜨끈하면서도 걸쭉한 국물을 들이켜면 속 안쪽까지 깊이 위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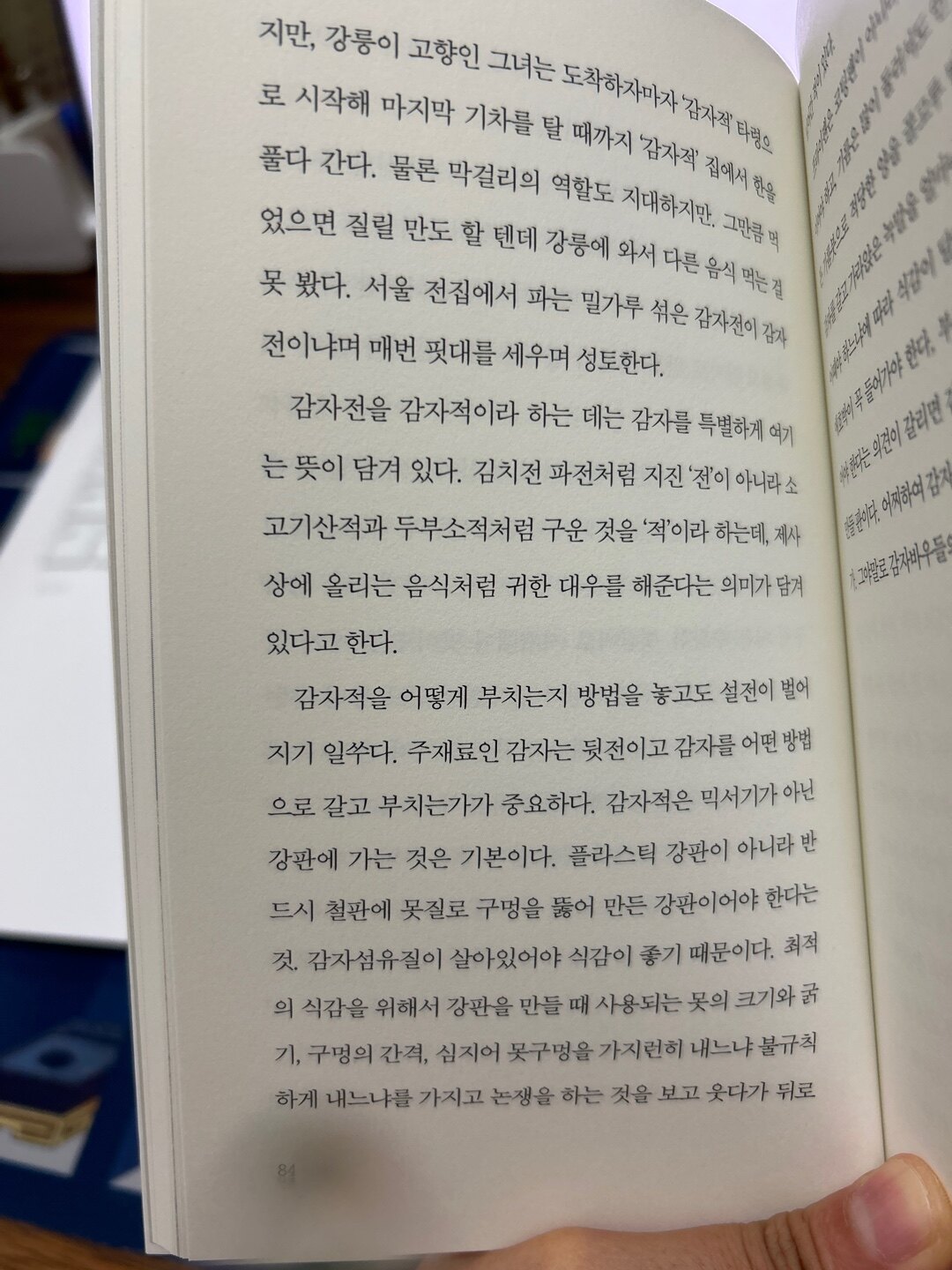
나의 소울푸드가 감자옹심이인 만큼 감자적에 대한, 감자 음식에 대한 자부심은 내 핏속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되었다. 예전에 구내식당에서 감자옹심이라는 이름을 단 정체불명의 음식이 나온적이 있다. 대충 썰어낸 감자에 떡을 동그랗게 만들어 감자와 함께 끓인 국이었는데, 나는 경악을 금치못하며 한참동안 제대로 된 감자 옹심이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직장동료에게 성토한 적이 있다. 누군가 감자를 채썰어 부치는 것이 감자전이라고 할때도 마음 속 깊숙히 '그건 아닌데, 감자를 철판 강판에 갈아야 진짜 감자적이지'라고 생각한 난, 저자가 책에도 썼듯이 감자전에 목숨을 거는 감자바우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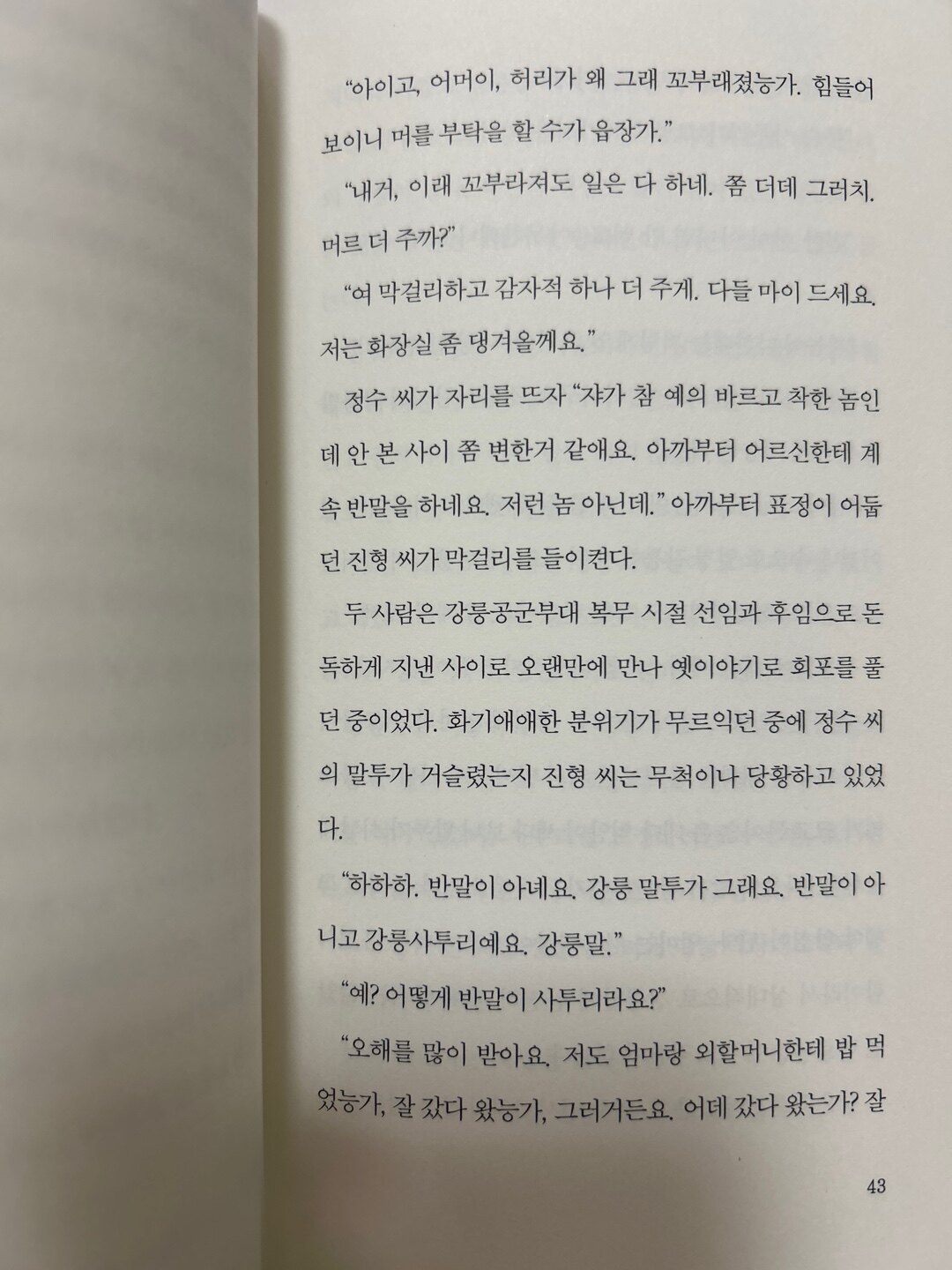
반말처럼 느껴지는 강릉사투리는 나에게도 엄마아빠 세대에서나 들을 수 있는 신기한 언어였다. 시장통에서 어르신들끼리 나누는 담소가 신기하고 재밌어 어릴 땐 시장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우리 엄마도 처음 강릉에 시집와서 사람들이 다 싸우는 줄 알고 무서워 한동안 집밖에 나가지 못했다고 했다. 사투리가 억세고 강해서 이게 시비를 거는 건지, 싸우는 것인지 외지인들은 모르기 때문. 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강릉에서 시골 텃새가 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던 듯하다. 소제목처럼 다 오해예요, 오해.
강릉 사람들에게 있어 신영극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릴 땐 신영극장 앞에서 만나자고 하면 만사 오케이였다. 그야말로 만남의 광장) 집 생각은 안나도 바다는 보고싶다는 말이 무엇인지, 눈 오는 밤 플레이리스트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는 강릉사람들과 강릉의 핵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마다 고향이라는 곳은 다 특별하게 다가오겠지만, 동향 사람이 쓰고 바라본 고향 이야기에 타향에서 밥벌이를 하며 인류애가 상실해가던 차에 간만에 옛생각에 잠길 수 있던 책이다.
*스토리닷에서 제공받아 읽고 솔직하게 쓴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