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크로스 사이언스 - 프랑켄슈타인에서 AI까지, 과학과 대중문화의 매혹적 만남 ㅣ 서가명강 시리즈 2
홍성욱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월
평점 :



2019-020 <크로스 사이언스(홍성욱 지음/21세기북스)> [인문] [서가명강]

프랑켄슈타인에서 AI까지, 과학과 대중문화의 매혹적 만남
서울대학교에 재직중인 저자의 전공은 과학기술학이다. 과학기술학은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과학기술을 역사적, 철학적,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 전반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이다.
저자가 강의한 ‘과학기술과 대중문화’를 근거로 책이 엮여졌다. 저자는 과학기술과 대중문화를 연결시켜 생각하면서 과학과 인문학 두 문화 사이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기를 바라며 [서가명강]으로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다룬 과학과 문화의 교차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인간답고 민주적인 과학기술의 모습을 상상하고 이를 구현하는 우리 모두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꿈꿔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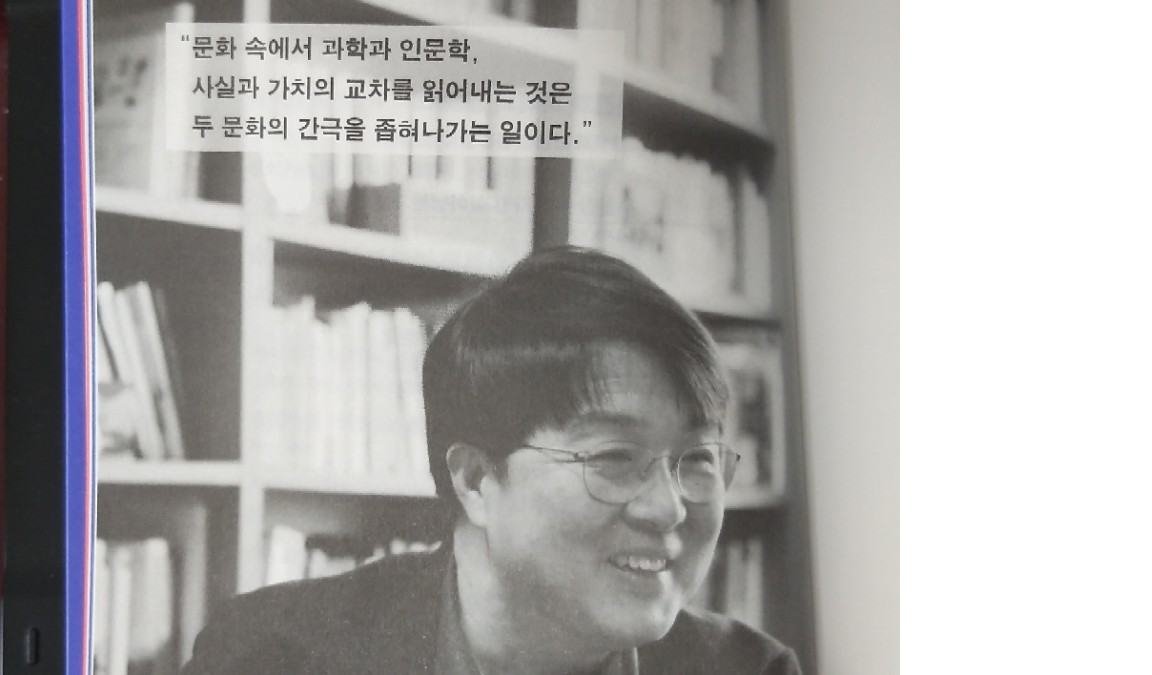
대중문화의 예로 들고 있는 다양한 소설과 영화 이야기를 들으며 과학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그러나 이 책이 ‘과학은 어렵지 않아요“와 같은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여전히 천생 문과생인 나에게는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설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꼭지들이 제법 많다. 그래도 꼭꼭 씹어먹으면서 느낄 수 있는 잡곡밥의 고소함처럼 다양한 학문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책이었다.
1부 / 대중문화와 과학의 크로스 – 미친 과학자, 슈퍼우먼 과학자, 오만한 과학자
괴물이 아닌 과학자, 프랑켄슈타인 : 프랑케슈타인 박사는 기존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금기에 도전함으로써 괴로움을 당했는데, 이는 프로메테우스 이미지와 매우 흡사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지식을 발견한 대가로 고통을 당하는 프로메테우스와 프랑켄슈타인의 이미지는 이후 과학자의 전형적인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다. /p25
과학과 사회를 연구하는 나로서는 소설 속 여러 모티프라든지 주인공의 직업 등으로 생각해볼 때 당시 산업혁명 이후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그 방향이나 속도를 통제하지 못했던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인간 스스로의 책임감을 질문하는 것에 이 작품의 무게가 실려있다는 해석을 선호한다. /p35
사이비과학의 오래된 역사 : 지금도 과학의 이름으로 우등과 열등을 나누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누가 우리를 멸시하면 발끈하지만, 우리가 유전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면 으쓱댄다. 백인이 흑인의 아이큐가 낮기 때문에 흑인이 가난하다고 하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하지만, 한민족의 아이큐가 다른 인종에 비해서 높다는 ’과학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뿌듯해한다. 한글이 가장 ’과학적인‘ 언어라는 얘기를 들을 때에도 ’그럼, 그렇지‘ 한다.
사이비과학은 이런 마음을 비집고 자라난다. 누군가 과학의 이름으로 내가, 한민족이, 한국 사람이 과학적으로 못났다고 한다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과학이 나를, 한민족을, 한국 사람을 잘났다고 하면 이런 얘기는 우리의 허영심을 살살 간지럽힌다. /p117
2부 / 세상과 과학의 크로스 – 미래는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결국 디스토피아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극복한다든지 혹은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고, 지금껏 어떤 길을 밟아서 여기에 왔는지, 즉 우리의 과거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누군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속한 세상이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겐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와 내가 속한 사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그중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실천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오웰과 헉슬리의 디스토피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풍성한 언어를 지키고, 언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p188
3부 / 인간과 과학의 크로스 – 로봇과 인간은 공존할 수 있을까
유전자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듯, 우리 사회의 미래 역시 유전자 결정론이 지배하는 미래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p218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담론 속에서 가까운 미래에 AI의 발전이 인간을 공장과 사무실에서 쫓아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사실 청년 실업이 많아지는 이유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보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는 말들이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1932년에 제작된 로봇 알파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알파는 자신을 만든 해리 메이에게 총을 겨누고 발사했다고 보도되었다. 실제는 이와 너무나 달랐다. 알파가 발사하는 총에 화약을 넣다가 메이가 실수해서 화약이 터졌고, 그래서 메이는 손에 약간의 부상을 입은 것뿐이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과장되고 왜곡되어 알파가 총을 인간에게 겨눠 발사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이다. 실로 터무니없는 과장 보도였다.
왜 그랬을까? 당시에는 기계가 인간의 직장을 없앨 것이라는 불안감이 사회에 팽배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작은 사고를 자극적인 사건으로 과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해 가진 두려움은 얼만큼 근거가 있는 것인가. /p277
4부 / 인문학과 과학의 크로스 – 과학의 시대, 생각의 경계가 무너진다
근대적 삶의 이면, 식민지 민중의 애환 : 시계, 전차, 전등, 자동차 등은 도시의 새로운 근대적 삶을 상징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삶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었다. 전등이 켜지고 전차가 들어서는 것이 외형적인 발전이긴 했지만, 어떤 작가들에게는 이것이 조선의 진보나 조선 사람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침탈이었던 것이다.
전기의 도입 초기에 문학작품들은 전차, 전등, 활동사진같은 전기 문물을 새롭고 신기하고 계몽적인 것으로 그렸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들은 식민지적 일상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적으로 바뀌어갔다. 예컨대 초기에 전등은 다 밝은 것으로 그려졌지만, 1920~30년대가 되면 희미한 전등, 쓸쓸한 느낌을 주는 전등, 신경증을 유발하는 전등이 등장하게 되며, 일부 작품에서는 전등이 일제 통치의 결과물이거나 빈부격차를 상징하는 전형이 되었다. /p304
과학과 인문·예술의 관계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한 한 가지 출발점은 상상력일 것이다. 우리는 흔히 과학의 핵심을 발견에 둔다. 하지만 과학도 무엇인가를 만드는 활동이기 때문에 과학에서도 상상력이 매우 중요하다. “과학과 인문학이 상호보완적이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맨 처음 했던 철학자 잠바티스타 비코는 “과학은 이성에만 근거하고 인문학은 상상력에 근거한다”고 했지만, 과학에서도 상상력이 중요하다. 과학도 결국 인간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p326
칼 세이건은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구에서 버텨야 하고, 이를 위해서 서로와 환경을 아껴야 한다는 점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우리 인간들은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우리 은하의 한 귀퉁이에 있는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인 지구에서 지금 이렇게 아웅다웅 살고 있는 것이다.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인 희미한 푸른 점을 아끼고 보존해야한다는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p344
*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