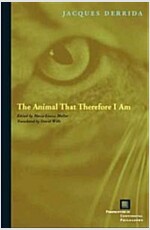
L'animal que donc je suis de Jacques Derrida et Marie-Louise Mallet (19 janvier 2006)
나라는 동물
자크 데리다 지음
마리루이즈 말레 편집
남수인 옮김
역자: 스리즈 - 라 - 살 국제문화관(여기서는 간단히 스리지로 명명)에서 1997년에 열린 10일 간의 심포지엄에서 데리다가 발언한 강연록이다. 서문에서 편집자가 설명하고 있지만 데리다는 강연을 글로 완전히 작성하여 읽는다. 이 책의 I, II, III은 그렇게 작성된 강연록이고 마지막 IV만 간단한 메모에 의거한 즉석 강연이다. 우리는 번역에서 강연이지만 일반 철학에세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출판물이기 때문에 글로 취급하여 경어사용을 배제했다.
*** 우리 사전의 정의:
우리말 사전에 의하면 동물은 식물을 제외한 모든 생물, “길짐승, 날짐승, 물고기, 벌레, 사람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프랑스어로 animal[또는 bête]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을 이른다. 요컨대 animal을 동물이라고 옮기는 것은 엄밀히 말해 맞지 않을 것이나, 우리말에 이 동물이라는 단어보다 더 적절한 단어는 없는 듯하다. 데리다는 animal 대신에 bête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 말은 프랑스어에서 animal과 동의어이다. 그러나 우리말에서 동물과 짐승은 완전 동의어가 아니다. 짐승은 날짐승과 길짐승, 네 발을 가진 몸에 털 난 동물, 바다 속에 사는 동물 가운데서는 포유류만 포함하므로, 즉 물고기, 벌레 등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우리말로 짐승과 동물은 동의어가 아니다.
아쉬운 데로, 그리고 우리말에서도, 우리는 일상적으로는 동물에 인간을 제외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animal은 동물로, bête는 짐승으로, 동물의 동의어처럼 사용하여, 옮기기로 한다.
데리다가 독어(원어) 단어에 이어 프랑스어 단어로 다시 받아 주는 경우, 독어는 그대로 옮기고 프랑스어만 우리말로 번역했다.
편집자 서문
자크 데리다는 “동물”에 관해 쓴 자신의 텍스트들을 언젠가 합쳐서 큰 책 한 권으로 만들리라는 의사를 자주 표명했다. 그 계획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지만, 더 바쁜 일들에 밀려서 그는 뒤로 밀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1997년 그는 스리지-라-살 심포지엄의 제목을 “자서전적 동물”이라고 붙인 한 편, 강연을 위해 매우 긴 원고를 작성했는데, 이것은 10여 시간이라는 그 지속시간으로 볼 때, 강연원고라기보다는 세미나원고라 할만했다. 강연록 가운데 서문만 전체 강연에 붙인 제목인 <결국 나라는 동물>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의 보고서록에 수록되어 출간 되었는데, 이 제목 밑의 “계속”이라는 표기는 나머지 부분도 출간될 의도임을 예고했다. 그리고 2003년 그에게 바쳐진 Cahier de L'Herne를 위한 미간 텍스트들 가운데 그는 이 강연의 끝 무렵에 위치하고 있던 한 편의 텍스트를 <만일 동물이 대답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고자 선택한 바 있다.
그 자신이 강연 도중에 상기시키는 바이지만, “동물”의 문제는 그의 텍스트들 다수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저작 작업에 집요하게 들어있는 이 동물 문제는 최소한 두 가지 원천에서 비롯된다. 첫 번째는 분명 철학에 의해 가장 무시된 또는 잊히어진 동물의 삶의 양상들에 대해 “동정”을 느끼는 어떤 적성, 강하고 각별한 감수성이다. 그로부터 제레미 반담이 동물들에 대해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Can they suffer?”라고 제기하는 문제에 그가 부여하는 크나큰 중요성이 오는 것이다. “문제는, 동물들이 이치를 따질 수 있는가?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이다 - 라고 벤담은 말한다.” 이것은 겉보기에 단순하지만 자크 데리다에게는 매우 심오한 문제이다. 데리다는 그의 텍스트들에서 여러 번 이 문제에 되돌아온다. 그는 동물의 고통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 게다가 - 이것이 두 번째 원천이 되는데, 벤담에 의해 제기된 이 문제는 그에게 매우 큰 철학적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보이고, 철학의 역사에서 가장 항구적이고 더없이 완고한 사유 전통을 우회적 경로의 비정면적인 대립에 의해 뒤집어 볼 호기로 보인다. 이 사유 전통은 인간을 zôon logon ekhon 또는 animal rationale로, 즉 “동물”로, 그러나 이성을 가진 동물로 정의할 때조차, 인간을 사실상 모든 나머지 동물류와 대립시켜서 인간 속의 모든 동물성을 지워버리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반대로 동물은 인간의 “고유성”인 것으로 간주된 것, 요컨대 “... 말, 이성, 죽음의 경험, 애도, 문화, 제도, 기술, 의복, 거짓말, 가식으로 가장하기, 흔적지우기, 기증, 웃음, 눈물, 존경 등”을 전혀 갖지 못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 살고 있는 가장 강력한 철학적 전통은 ‘이 모든 것’이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라고 봤다”고 자크 데리다는 강조한다. 철학적 “로고스중심주의”는 통제의 입장과 불가분한 것으로 이것은 먼저 “동물에 관한 명제, ‘로고스’를 갖지 못한, ‘로고스’를 ‘가질-능력’을 갖지 못한 동물에 관한 명제이다. 요컨대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하이데거까지, 데카르트에게서 칸트와 레비나스와 라캉까지 유지되는 명제 또는 입장 혹은 선전제이다” 라고 또한 그는 쓰고 있다. 동물에게 가해진 폭력은 게다가 이 허위-개념인 “동물(l'animal)”과 함께, 단수로 사용된 이 단어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는 말한다. 마치 지렁이에서 침팬지까지의 모든 동물들(tous les animaux)이 동질적 전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 전체에 근원적으로 “인간”이 대립하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폭력에 대한 대응이기라도 하듯 그는 이 다른 단어 “l'animot(아니모)[+동물animal(아니말)+단어mot(모)-역자]”를 고안한다. 이 아니모는 단수에서 발음상으로 복수 “animaux(아니모)”를 들려주고 그래서 ‘아니말’[총칭적 동물-역자]이 지우고 있는 동물들의 무궁한 다양성을 상기시키며, 또한 필기된 “아니모”는 “l'animal”이란 단어가 정확히 하나의 “단어(mot)”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제 텍스트 내에서 이 “아니모”가 사용된 다양한 경우는 경고신호들, 경각심고취 같은 것으로서, 이 “아니말”이란 단어의 부득이한 단수로의 사용이 우리를 너무도 일상적이고 너무도 주목받지 못한 독단론적 수면 속에 잠기는 것을 막고자 한다.
끝으로, 이렇게 동물들을 박대한 철학적 전통에 대한 이러한 해체의 쟁점은 동물들에게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해체는 전망의 단순한 전복을 이뤄내자는 것이 아니니, 예를 들어 “동물” 일반에다 이 철학적 전통이 동물에게서 항상 박탈해온 것을 복원시키고자 하거나 또는 전통적 대립에다 그보다 덜 허위적이지도 않은 무차별화의 혼동을 대입하고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 해체는 끊기 있게 차이점들을 수합해 보임으로써, 긴 세월 사람들이 “인간”과 “동물”의 전통적인 대립을 설립시키게 한다고 믿어왔던 그 “고유성”이라는 것의 추정된 경계선들에 내포된 취약성을, 다공성(多孔性)을 부상시키고자 한다. 이러는 와중에 해체는 동물 “일반”이 가진 “동물성”에의 확실성을 뒤흔들어 버리지만, 또 한편으로 인간의 “인간성”에 대한 확실성도 역시 뒤흔들어 놓는다. 자크 데리다가 애써 강조하듯이 “요체는 동물에게 이런 저런 능력을 주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것만이 아니고[......] 또한 인간이라 불리는 것이 인간이 동물에게 거부하는 점을 엄밀히 인간에게, 그러니까 결국 자신에게 부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순수하고 엄정하고 분할 불가능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나 하는가 검토해보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왜 “동물”에 대한 문제가 그의 사유 속에서 그토록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왜 그가 이에 대해 책을 펼 계획에 집착했는지 더욱 잘 이해를 한다. 만일 그에게 이 계획을 실현할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이 책이 어떤 것이 됐을 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게 됐으니 안타깝다!... 그러나 우리는 스리지의 대강연 원고 가운데 이미 출판된 바 있는 두 부분과 함께 아직 출판되지 않은 부분을 이 책 속에 합본함으로써 그의 바람에 부응하고자 했다.
아직 출판되지 않은 부분들은 두 가지 종류이다. 하나는 강연의 이미 출판된 두 절편 사이에 위치한 부분으로, 여기서 데리다는 플라톤에서 레비나스까지 “동물”에 관한 동일한 사유도식들에 되돌아와 “흔적을 따라가”듯 쫓아간다. 이 텍스트는 자크 데리다의 다른 모든 강연들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의 세미나들에서의 발표들이 그렇듯,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텍스트는 사소한 오타의 교정과 각주에 인용된 저작들에 대한 몇 가지 참조사항의 추가 (또는 참조사항에 대한 명확화) 이외에는 전혀 손질 없이 본래 상태로 편집됐다.
다른 하나는 이 책의 끝에 강연의 마지막 부분이 들어 있는 점인데, 여기서 하이데거 작품에 나타난 동물의 문제가 취급되고 있다. 이 텍스트의 위상은 다른 것들과 조금 달라서 출판에 몇 가지 특이한 문제점들을 제기한다. 강연은 1997년 7월 15일에 시작하여 이튿날까지 이어졌고 토론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 이상 지속됐다..... 그리고 10일 간의 심포지엄은 예정돼 있었던 다른 강연들로 계속됐는데, 여전히 참석자들은 데리다를 더 듣고 싶어했다. 그의 강연 도중에 여러 번 언급된 하이데거에게서의 동물의 문제가 아직 논해지지 못한 채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결국 심포지엄의 마지막 날, 7월 20일 늦은 오후 자크 데리다는 이 기대를 받아들여 사전 준비 없이 즉흥 강연에 들어간다. 이 즉흥 강연은 사전에 작성된 원고 없이, 하이데거 작품들에서 참조한 페이지들에 대한 몇 가지 메모만을 중심으로 행해져서 이 강연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녹취물이 전부이다. 그러나 비록 즉흥적인 것이기는 해도 이 강연은 그의 주제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노선 가운데 하나를 구성하는 접근법으로서 출판물 속에 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우리는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녹취물을 최대한 충실히 문자화하여 여기에 수록한다. 즉흥 연설에서 피할 수 없이 행해지는 몇 가지 잘 못된 부분들만이 수정되었다. 우리는 입말을 나타내는 성질, 자주 쾌활함을 표시하는 친밀한 말투를 삭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단어들이나 마찬가지로 자주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어투의 많은 다양성들이 지문에서 피치 못하게 상실되는 것이 안타까웠다. 발음된 모든 단어들을 정확히 글로 옮기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주의를 충분히 기울이면 충분하다), 리듬이나 침묵들, 구두기호의 역할을 하는 억양의 강세를 옮겨야 할 때면 어떤 해석(interprétation)이 가미되기 마련인데, 자크 데리다가 이 구두기호들에 얼마나 깊은 주의를 기울이는 지는 잘 알려진 바다. 그러니 그 자신이 이 녹취물의 출판에 관여했다면 그는 분명히 이 초록, 그의 말을 빌리면 이 단순한 “실루엣”을 새로 썼으리라. 그러나 그가 상기 시키고 있듯이 하이데거에게서의 동물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그가 여러 텍스트들, 특히 <인간의 종국>, <Geschlecht종족>, <하이데거의 손>, <<정신론>>, <하이데거의 귀>, 그리고 <<논리적 궁지들Apories>>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이들을 읽거나 또는 다시 읽어야 할 것이다.
“만일 나에게 시간이 있었더라면, 우리에게 함께 시간이 있었더라면 [...]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다...”. “만일 나에게 시간이 있었더라면, 나는 보여줄 시도를 했을 텐데[...] 지금은 더 멀리 나갈 시간이 없을 것 같다...” “만일 그 부분까지 갈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그 점에 대해 오래 이야기 했어야 할 것이다[...] 난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다...” “만일 나에게 시간이 있었다면, 나는 이 텍스트 속에 든 현기증과 원환의 순간들에 대해 지적하고 강조했을 텐데. 이 점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감탄부호를 나는 그 엄청난 담론을 통해 따라가 봤을 텐데. 나에게 시간과 힘이 있게 되면 그리 할 생각이고, 그러길 바란다 [...] 이 텍스트에 경의를 표하고 싶으니까...” 녹취를 옮긴 이 글을 읽는 독자는 가지지 못한 시간에 대한 이 시간의 모티프가 계속 되돌아오는 것에 충격을 안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모티프는 오늘날 우리에게 조종(弔鐘)과 같은 토날리테를 띤다. 이 불안의 상황적인 이유(심포지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터라, 비록 청중이 더 많이 듣고 싶어 하지만 혹시 청중의 집중력을 지치게 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넘어, 데리다의 친구들과 독자들은 목소리에 밴 매우 자주 들어본 불안과 번민, “떨림”을 감지한다. “만일 내게 시간과 힘이 있다면”: 거대한 작품이지만 이에 만족하기커녕, 그의 사유는 불확실한 앞-날à-venir을 향해, 그 무엇보다 우선 텍스트에, 테마에, 문제에, 모티프에, 주제화하게 내버려두지 않는 것에, 사건의 도래에 정당한 대우를 하기 위해 내닫는다... 더없이 엄밀하고 철저한 “해체”는 언제나 정확함보다는 이 정당함에의 배려에 의해 활력을 얻어왔다.
1997년 그에게는 아직 조금 시간이 있었지만 그의 작품에 이미 오래 전부터, 1997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 매우 자주, 다음의 짧은 문장은 되돌아오고 있었다: [돌아보면] “인생은 너무나 짧았을 것이다.” 이 전미래는 이제 그 “절대 용법”을 발견하고 있다...
마리-루이즈 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