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붓다 테라피 - 웰빙을 위한 행동심리학
토마스 비엔 지음, 송명희 옮김 / 지와사랑 / 2012년 5월
평점 :



불교가 말하는 정신건강의 방법 <붓다테라피>를 읽고
불교가 정신건강에 대해 좋은 방법이 되는 이유는 강렬한 인본주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경험적 태도를 가지는 수양방법과 독단적이지 않은 태도때문이다. 이책은 이러한 좋은 내용들을 심리치료에 활용하고자 한다.
불교가 말하는 행복한 상태는 무엇인가?
수행을 하는 싯다르타에게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요라고 묻는 질문에 그는 "깨어있는 자"라는 대답을 한 때문에 이말의 힌두어인 붓다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는 행복이란 어떤 조건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좋은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한다. 이 수련을 마음챙김이라 부른다.
이런 수련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언어의 덫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수행을 하는 수단을 목표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언어에 사로잡히면 이런 우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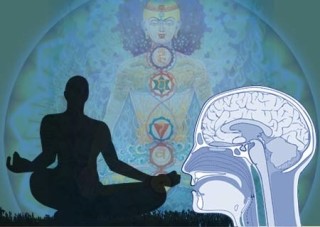
불교의 생명이해는 독특하다. 불교에서는 생명의 방식이 비영구성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자아도 통일된 개념이 아니며 만물과 연관되어 동적으로 파악되는 생명과정이라 말한다. 그러나 인간이 자아를 추구하려하기 때문에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자아를 추구하는 욕심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상대방에도 폭력을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오온을 잘 행하라 말한다. 존재와 소유, 관계의 덧체 빠지지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해탈에 이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해탈에 이르기에 명심해야 할 것은 습관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습관을 목마른 자가 독 있는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A으로서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을 말한다.
상당수의 심리적 문제는 생각을 피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불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잡초에 물을 주지말라는 말은 좋은 생각을 더 집중함으로서 마음챙김의 힘을 얻으라는 것이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마음 챙김과 자애로움을 실천하는 명상을 실천할 것을 권장한다.
고통에 대처하는 방식을 불교는 둑카(고성제)로 이해한다. 불완전함을 명백히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다음은 고통의 원인을 찾으라는 것이다. 둑타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으라는 것이다(집성제). 그 다음을 고통을 끄태내는 것이다(멸성제). 그 다음은 팔정도(정견,정사유,정어,정업,정명,정정진,정념,정정)를 이루는 것이다(도성제).
행복을 위한 명상을 하라.
수행은 수행이 아닌 것처럼 하라. 명상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에서 명상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행의 패러독스는 지속적이고 완전한 주의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은 불교의 인간이해의 상대성이 현대인들의 심리치료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기독교의 인간 이해는 자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현대문명이 기독교의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러한 이해의 중심에 있는기독교의 인간이해는 자존심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책에서도 지적하지만 원시불교에는 자존심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인간을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자존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자신의 집착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이책은 행복과 만족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데 있다는 불교의 통찰력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볼 것은 기독교의 관점이 결국 합리주의적인 태도를 만듦으로서 근대문명을 만들었지만 그러한 문명이 만들어낸 인간의 고통의 문제도 시작된 것이다. 고통의 문제를 다시 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자아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이 가능하다. 자아가 자아를 치유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방법이기때문이다. 자아를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우리는 심리치료의 좋은 관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