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름에는 어찌하다 보니 추리소설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 7월 마지막주가 휴가였기에 추리소설을 한 권 사서 완독할까 했었는데, 배우에게 이끌려서 구입한 <두 도시 이야기>가 예상 이상으로 재미있는 바람에 '추리'는 까맣게 잊었더랬다. 휴가지에서도 가족들이 모두 낮잠을 잘 때 난 이 책을 읽었으니까. 평소 나는 기억력이 안 좋은 편인데 <두 도시 이야기> 리뷰를 쓸 때 옆에 책이 없었는데도 거의 모든 내용이 또렷하게 기억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역시 책은 기억에 남으려면 재미있고 봐야 하나보다. 특히 소설은 더더욱 그렇다.

* 한글판+영문판 구성을 산 것은 순전히 실수였다. 한글판 2권이 묶여 있는 구성인 줄 알았던 것이다. 2권에 만 원도 안 되다니, 엄청 싸다! 싶어서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주문버튼을 눌렀나보다. 영어고자인 내게 영문판은 별 소용이 없거늘. 그래도 책이 예뻐서 소장가치는 있다.
<두 도시 이야기> 덕분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다시 맛보게 되어서 머릿속 한켠으로 밀려났던 추리소설에 대한 갈증이 되살아났다. 추리소설을 떠올리자 가장 먼저 생각난 작가는 엘러리 퀸. 철없는 어린 시절에는 아가사 크리스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미국 작가를 은근히 얕보는 심리도 있었다. 그런 심리가 <이집트 십자가의 비밀>로 와장창 깨지고 연이어 <Y의 비극>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나는 이 머리 좋은 두 사촌형제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Y의 비극>은 아가사 크리스티의 <비뚤어진 집>을 접하기 전에 읽은 작품이어서 범인을 1도 짐작하지 못했기 때문에(요새 이 "1도 ~하다"라는 표현을 좋아한다. 이유는 웃겨서ㅋ) 사건의 실체와 결말이 더욱 충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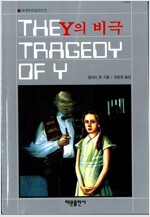
* 정확히 언젠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둘 다 학생 때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다. 해문출판사 문고판 시리즈였는데 현재 두 권 모두 소장하고 있다. 해문출판사가 추리문학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추리소설을 출간하는 것은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번역을 좀 새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표지가 바뀌고 가격이 올라도 어색하고 이상한 우리말 문장은 그대로니 원.
이후 엘러리 퀸의 작품들을 다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검은숲에서 엘러리 퀸 컬렉션을 출간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책의 만듦새도 마음에 들고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들까지 모두 출간할 예정이라는 출판사의 의지를 응원하고자 국내 최초 출간작 중 하나인 <샴 쌍둥이 미스터리>를 구입해 읽었다.

* 초판 한정 별색띠를 삽입한다고 해서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들의 구매욕에 불을 지른 검은숲의 엘러리 퀸 시리즈. 출간 초기에 산 것은 분명한데 이 별색띠를 두른 책인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하긴 없으면 뭐 어때. 몇 년이 걸리더라도 다 사서 읽으면 되지. <샴 쌍둥이 미스터리>는 엘러리 퀸의 작품치고는 별로라는 평도 있지만 나는 꽤 재미있었다. 제목처럼 소설에 샴 쌍둥이 형제가 등장하는데 피해자가 이들을 연구하던 의학박사였던 걸로 기억한다. 사실 난 사건보다도 탐정을 포함한 등장인물들이 처한 '산불'이라는 상황이 더 흥미진진했다. 산불이 나면 그 재와 연기가 모두 꼭대기로 집중된다는 사실을 이 책을 읽고 처음 알았다. 어찌어찌 사건은 해결했고 범인은 스스로 처리(?)되었으나 산불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길이 없어서 모두 쓰러져 죽기 일보 직전, 괴력을 발휘해 집 밖으로 탈출한 퀸 경감의 마지막 한 마디가 인상적이다. "비가 내리고 있어!"
고전 추리소설이 대부분 그렇듯 엘러리 퀸의 작품에도 탐정이 등장한다. 그는 저자의 필명과 같은 엘러리 퀸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으로 아버지인 퀸 경감과 함께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혼자 해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파트너가 있는 탐정들은 거의 다 그렇다.) 고전 추리소설의 이러한 클리셰 때문에 미스터리 독자들 중에는 작품의 중반부에 이르면 누가 범인인지 짐작이 가고, 또 그 짐작이 맞아서 김이 빠졌다는 이가 꽤 있는데 나는 한 번도 범인을 맞힌 적이 없어서 김이 빠진 적도 없다. 왜냐하면 첫째, 나는 고전 추리소설의 뻔한 구성을 좋아하고, 둘째, 추리소설의 백미는 누가 뭐라 해도 마지막의 반전이므로 이것을 최대한 즐기기 위해서 굳이 범인을 맞히려고 애쓰지 않는다. 되도록 모르는 상태에서 범인의 정체를 알아야 그만큼 강하게 뒤통수를 맞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정말 강력한 한 방을 날려준 <애크로이드 살인사건>의 작가 아가사 크리스티와 <Y의 비극>의 작가 엘러리 퀸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한다.




'국명 시리즈' 못지 않게, 아니 어쩌면 '국명 시리즈'보다 더 유명한 '비극 시리즈'는 전권을 모두 소장하고 있다. 그런데 다 읽지는 못했다. <X의 비극>, <Y의 비극>, <Z의 비극>은 손에 땀을 쥐면서 읽고 감탄했는데 <드루리 레인 최후의 사건>을 반쯤 읽다 말았던 적이 두 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처음은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크리스티 여사의 작품들 중에도 취향이 안 맞거나 지루해서 읽다 만 작품이 몇 권 있고, 까치에서 나온 아르센 뤼팽 시리즈도 2권 <뤼팽 대 홈스의 대결>을 읽다가 너무 재미없어서 덮어 버렸었다. (시리즈를 반드시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 그냥 전부터 궁금했던 <813의 비밀>부터 읽을까 한다.) 경험상 중간에 덮은 책을 다시 펴기는 쉽지 않지만 믿고 보는 엘러리 퀸이니까, 처음엔 별로였던 작품이 나중에 다시 읽어보니 재미있었던 적도 분명 있으니까 언젠가는 비극 시리즈도 완독하겠지.
국명 시리즈보다 비극 시리즈를 먼저 산 이유는 비극 시리즈가 더 짧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탐정의 영향이 더 크다. 드루리 레인은 신중하고 사려 깊은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는 편인데 엘러리 퀸은 탐정으로서의 능력은 높이 사지만 인물이 별로다. 잘난 척하는 건 그렇다 쳐도(사실 이것도 별론데) 사건을 마치 재미있는 퍼즐 풀기처럼 여기는 태도는 정말 아니다. 똑같이 잘난 척을 해도 에르큘 포와로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중시하고, 가끔 헤이스팅스를 무시하는 게 얄밉기는 해도 그의 말에서 힌트를 얻어 사건을 해결하고 나면 꼭 감사를 표시하며 추켜세워주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엘러리 퀸은 그냥 나 잘났소 하며 사건 현장을 들쑤시고 다니기 바쁘다. 영국 드라마 <셜록>의 셜록 홈즈는 연민이나 동정 따위는 차가운 이성을 방해하고 이성이 방해를 받으면 추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코난 도일 원작의 셜록은 드라마 속의 셜록보다는 인간적이다.), 작가 엘러리 퀸도 같은 생각으로 탐정의 성격을 이리 설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빈말이라도 겸손한 척한다던가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는 장면이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탐정 엘러리 퀸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다. 포와로는 어울리지 않게 겸손을 떨다가 상대가 자기를 추켜세워주면 어깨를 으쓱하며 콧수염을 쓰다듬곤 해서 참 귀여운데 말이다.
하지만 탐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엘러리 퀸 시리즈 탐독을 그만 둘 생각은 없다. 누가 뭐래도 퀸의 작품은 재미있고, 논리정연한 추리에서 얻는 만족감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책 소개를 읽어보니 그 머리 좋은 탐정 퀸도 보기좋게 범인에게 속아서 높은 코가 납작해진 적이 있는 모양이다. 그 일을 계기로 조금은 덜 거만해지고 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아니면 어쩔 수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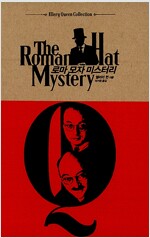


새로 살 엘러리 퀸의 작품은 이 셋 중 하나가 될 듯하다. <로마 모자 미스터리>는 퀸의 처녀작이고, <네덜란드 구두 미스터리>와 <미국 총 미스터리>는 국명 시리즈 중에서 사건의 내용이 가장 구미를 당기는 작품이라 골랐다. 국명 시리즈 중 이미 <샴 쌍둥이 미스터리>를 읽었기 때문에 출간된 연도 순서로 읽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네덜란드 구두 미스터리>나 <미국 총 미스터리> 중 택일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두 권을 다 지르던지, 다른 책을 다음으로 미루고 세 권 다 살 수도 있다. 지금은 2만 명의 관객이 들어찬 로데오 경기장에서 선수가 살해당한 <미국 총 미스터리>가 좀 더 흥미롭긴 한데...... 뭐가 더 재미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