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풀꽃나무하고 놀던 나날 - 나를 키워 준 시골 풀꽃나무 이야기
숲하루(김정화) 지음 / 스토리닷 / 2022년 12월
평점 :



+
어렸을 적 군인이었던 아빠를 따라 이사를 참 많이도 다녔다. 대부분 도심지보다는 시골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그때 그 시골에서의 생활이 있었기에 지금도 풀, 꽃, 나무를 좋아하는 나로 성장한 것 같다. 숲하루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저자 역시 경북 의성 사곡면 상전리라는 시골에서 꽃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풀꽃나무하고 놀던 나날>은 그곳에서 알게 된 126가지 풀꽃나무에 대한 저자의 빛나는 유년 시절을 담고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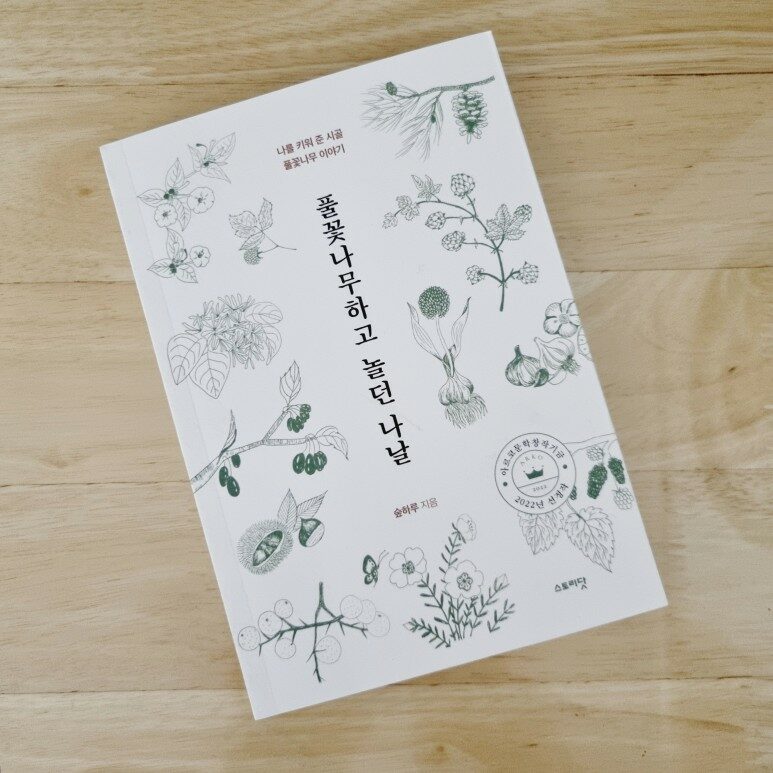
지금도 가끔 산을 오를 때면 유년 시절 보았던 많은 풀꽃나무들을 마주한다고 한다. 다만 유년 시절에는 몰랐던 성인이 된 지금 또 다르게 보이는 풀꽃나무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운 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곤 한단다. 책은 가나다순으로 ㄱ부터 ㅎ까지 저자가 만난 풀꽃나무들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풀꽃나무들은 얼마나 될까? 목록을 훑어 보았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 앞에선 생소했지만 어떤 나무일까? 호기심이 동하기도 했고 익숙한 이름 앞에선 옛 유년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기도 했다.
경기도 이천군, 지금은 이천시가 되었지만 아버지가 군 생활을 했던 경기도 이천군 단월면은 어린 내가 탐험을 하기에 좋은 시골 마을이었다. 당시 단월 초등학교로 (라떼는 단월 국민학교) 전학을 갔었는데 친구들이 집까지 데려다주는 산길이 무언가 모험을 떠다는 것처럼 설레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내 어깨에는 작은 가시가 돋친 나무 열매 같은 것이 군데군데 달려있었는데 알고 보니 도꼬마리였다. 나를 따라 우리 집까지 여행을 온 것일까? 저자의 책 속에도 등장하는 도꼬마리를 보고 내심 반갑기도 했다.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내가 어렸을 적에는 먹을거리가 지금처럼 풍족하진 않았다. 그래서 가끔 친구들과 산에 오를 때는 산딸기도 따서 먹곤 했었다. 특히 까마중을 나는 좋아했는데 가끔 발밑을 쳐다보면 4~5개씩 보랏빛 작은 알알들이 맺힌 까마중을 만날 수 있었다. 툭~ 따서 입안에 넣으면 인공적으로 만든 사탕과는 다른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지곤 했다.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계단 화단에서 만날 수 있는데.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녀석이라 사뭇 반갑기도 했다. 지금의 내 아들은 모를 나만의 어린 시절 추억 그리고 그 달콤함.
채송화 꽃잎은 꼭 바닷속 톳같은 모습인데, 그 통통한 모습이 귀여워 손톱으로 톡톡 터뜨려 본 적도 있고, 돌나물은 지금도 나물 반찬으로 가끔 내놓는데 무심히 땅 위로 툭 던지면 알아서 뿌리를 내리는 녀석이라 참 신기해했던 적도 있다. 맛없는 도라지는 꽃이 그렇게 예쁜 줄 처음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알게 되었다. 그때의 경이로움이란! 뱀딸기는 이름과는 달리 예쁘고 귀엽고 빨갛고 봉긋한 것이 어찌나 시선을 사로잡는지. 정말 뱀이 먹을까? 궁금해하기도 했었다. 이팝나무와 조팝나무는 이름이 조금 독특해서 친구들에게 욕 비슷하게 장난으로 놀리기도 했었다.
저자의 책 속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풀꽃나무 1위, 2위는 하늘타리와 자귀나무다. 서산 할머니 댁에서 처음 보았던 자귀나무는 내가 알고 있는 꽃잎의 형태와는 너무도 달라 단박에 매료되어 버린 기억이 있다. 당시 나무의 이름을 몰라 송이 꽃나무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던 기억도 난다. 잎사귀는 만지면 잎이 오므라드는 미모사와 닮기도 했다.

다행히 자귀나무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공원 내에서도 자주 볼 수 있어 좋지만, 하늘타리라는 꽃나무는 어렸을 적 외에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개인적으로 참 아쉬움을 느낀다. 당시 내가 다니고 있던 단월국민학교 뒷산에 수업을 땡땡이치고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꽃을 만났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꽃잎의 형태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실타래처럼 풀어 헤쳐진 모습이 한이 서린 여인의 모습 같기도 하고, 이루지 못한 소망을 이루고 싶은 수많은 손짓 같은 느낌도 들었던 하늘타리.
왕골 잎을 줄기에 묶어 요술봉을 만들기도 했고, 팬지꽃, 진달래, 개나리를 따다가 나뭇가지에 치마처럼 입혀 인형놀이를 하기도 했고,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까맣고 딱딱한 열매를 따서 실로 꿰어 팔찌로 만들어 차고 다녔던 기억도 난다. 심지어 중학생 때 주번은 담임 선생님 책상 위의 화병에 꽃을 사다가 꽃병에 꽂아 둬야 했었는데 당시 친구들은 교문 앞에서 팔던 꽃다발을 사서 꽂았으나 나는 산으로 들로 뛰어나가 풀꽃나무를 꺾어 꽂아 둔 적이 있다. 당시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 일이 꽤 크게 회자되기도 했었다. 좋은 의미로든, 안 좋은 의미로든 ㅎㅎ
아, 서평을 쓰다 보니 자연과 함께 교감했던 지난날들이 새록새록 자꾸만 기억이 나서 마음이 아리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그렇다. 그때 살았던 곳들이 너무 그리워 언젠가 한 번 동생과 함께 방문을 해 본 적이 있다. 그런데 내 기억 속의 장소는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도시의 모습으로 탈바꿈 된 것을 보고 마음으로 많이 울었다. 이제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기억은 영원히 내 안에만 존재하는구나. 학교 수업이 끝나고 소똥 냄새가 났던 갈림길 사이 절벽에 고개를 숙이고 피어있던 보랏빛 할미꽃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저자도 그때의 기억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렇게 책으로 펴낸 것이 아닐까. 덕분에 나의 유년 시절 추억까지 소환하게 되어 행복하다. 그때의 찬란했던 자연과 숱하게 교감했던 시절의 기억들을 간직하며 살아가자. 잊지 않도록.
.
.
.
출판사로부터 도서만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