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책 따위 안 읽어도 좋지만 - 세계적 북 디렉터의 책과 서가 이야기
하바 요시타카 지음, 홍성민 옮김 / 더난출판사 / 2016년 10월
평점 :

절판


책이 있는 공간.
'사람들이 서점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책을 가지고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일을 한다.'
책을 다 읽고 나는 다시 맨 앞장으로 돌아온다. 작은
책방을 운영해오며 '사람들이 서점에 오지 않는다.'는 말은 나 역시 수없이 내뱉었다. 그러나 그다음 문장까지 내뱉을 생각은 단 한번도 해본적
없었다.
놀랍다. 이토록
근사한 인과.
-요조(가수,
책방무사 주인)
부산, 대구, 경주, 포항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책방들 사진을 본다. 책은 인터넷
서점에서도 살 수 있다. 하지만 작은 책방만의 독특한 뭔가가 있다. 사람과 공간과 책이 만들어내는 그 공간만의
분위기.
이 책 저자는
하자 요시타카다.
대학 졸업
후 캐나다 유학, 세계여행을 거쳐 아오야마 북센터 롯폰기점에서 근무했다.
현재 사람들에게 미지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 서점과 다른 업종을 연결하거나 병원, 백화점, 카페, 기업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장 만드는 일을 하는 회사, BACH(바흐)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런
직업도 있었구나..!
카페에는
책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백화점, 병원, 회사 내에서 한 쪽 공간에만 들어서면 책을 만날 수 있다니. 그 책들은 우연히 만나 함께
있게된 책들이 아니다. 북 디렉터의 선별을 받아서 여러가지 의미에서 놓여져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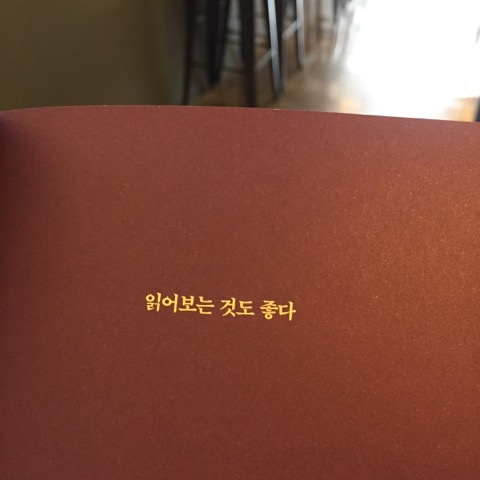
"읽어보는 것도
좋다."
권장도서, 필독도서 라고 읽기 시작하면 부담스럽다.
제목부터 그런다. 안읽어도 좋다. 내 선택이다. 책을 읽는다는 건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 책은 읽든지 안읽든지 니 마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내용은 어떤걸 담고 있나
궁금해졌다. 칼럼처럼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가 이어진다. 제목 하나, 책 하나, 이야기하나.
어떤 이야기들은 지극히 일본스러웠다. 어떤 이야기들은 삶을
이야기한다. 처음보다 끝날무렵이 더 재미있었다.
134쪽
우리는 길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시켜서는
풍경은 확실히 시야에 들어오지만 이런 가까운 장소조차 기억이 애매하다.
야끼소바 빵이 맛있는 가게. 가끔 찾아가는 선술집. 낫토볶음밥이
명물인 중화요리점.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장소는 정확히 기억한다. 그러나 매일 봐도 자신과의 연결고리가 없는 장소는 순식간에 날아가버린다. 아마 풍경
이외의 곳이나 정보, 사람도 그럴 것이다.
마침 떠오른 책이 <비밀기지 만들기>이다. 일본 기지학회의 오가타 타카히로라는
건축가가 썼다. 비밀기지 연구를 십 년 넘게 하고 있는 이 특이한 학회는 노스탤지억가 아닌 현대에 필요한 공간으로서 비밀기지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기지 만들기에만 '관계없다' 생각한 것과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
책에 비밀기지 장소 찾기 요령이
전수되어 있는데 일부만 소개하자. 일상의 도처에 있는 '빈틈'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비밀기지 만들기의 관건이다.
벽장이나 소파 뒤, 고가
아래, 절의 툇마루 밑 등 늘 보는 풍경에 숨어 있는 '데스 스페이스'에 살짝 미끄러져 들어가기. 이것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어떤 장소든
당신의 비밀기지가 된다. 눈앞에 있는 풍경과 자신을 연결할 수 있는 상상력-'여기에는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추측하는 고양이 수염
같은 감각-이 일상 풍경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그러고 나면 완성된 비밀기지에서 느긋하게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면 된다. 그곳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종종 비밀기지 이야기를 한다.
"엄마, 나 00랑 비밀기지 찾아보고 있어." 아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신이 어떻게 하면 즐거운지 안다.
비밀독서단에서도
소개된 책이었다. EBS책읽어주는 라디오에서도 들었다. 그러니 더 궁금하다. 결국 집과 회사가 아닌 제 3의 편안한 공간을 찾는 것이
포인트였다. 아이는 모두에게 공개적인 학교라는 공간에서 친구와 친밀한 사적인 공간을 찾고 싶었던거겠지.
204쪽
<죽는게 뭐라고>라고 제목대로
죽는 것은 무섭지 않지만 아픈 것은 싫다는 그녀의 마지막 날들을 엮은 에세이. 다른 작품보다 자유롭게, 힘을 빼고 독을 내뱉는다. 그리고 그
독은 독자의 몸에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사노의 책은 중독된다.
책의 맨 끝에 수록된 소설가 세키가와 나쓰오의 기고문 <여행지의
사람-사노 교토의 추억>에서는 전쟁 후 대륙에서 철수해도 과거를 가진 사노의 고독감에 대해 말한다. 거기서 그녀가 선명한 자유를 누리는
이유는, 일본에서의 생활이 여행지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발랄한 최고의 만년을 산 그녀에게는 이
세상 자체가 여행이었어요 거라고.
250쪽
두 권 넘는 책을 함께 읽는 명곡이 일상인 내 신조는 '무리 없이 읽자'이다. 오늘
저녁식사 때 고기를 먹을지, 차가운 두부와 채소만 먹을지 고민하다가 몸이 지금 가장 읽고 싶은 것을 읽는다. 그래서 눈앞이든 만화뿐 아니라 항상
몇 권 정도 선택할 책이 있어야 한다.
255쪽
지금까지 독서라 하면 집에서 혼자 조용히 읽는 것이었다. 뭐,
당연하다. 그러나 독서 페스티벌에서 제안하고 싶었던 것은 밖에서 여럿이 큰 소리를 내는 독서. 책의 작가들이 무대에서도 책을 읽고 이를 관객이
듣는다. 몸으로 느끼는 낭독 이벤트가 독서 페스티벌이다.
258쪽
묵독을 하면 눈앞에 나타난 문장을 독자가 백 퍼센트 이해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일어나길 수 있다. 대략적인 줄거리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소리 내서 읽는 경우는 다르다. 누가 어떤 기분으로 한 말인지
낭독하기 상상할 수 없으면 자신의 소리로 읽을 수 없다. '낭독은 상상으로 시작해 상상으로 끝난다.'는 것은 기나이 선생님의 말인데, 하나는
타고난 상상력을 발휘해 다양한 이야기의 내면으로 들어간다.
270쪽
한편으오 책 따위 아무 관심이 없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작가는 괴이한 존재다. 일본에서는 외국에서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작가의 고충도 모른 채 거침없이 말한다. "어떻게 먹고
살아요?""픽션을 읽으면 회사 실적이 놀라요?"나는 이 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쿄 국제문예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인 일요일 저녁. 구내 방송에 참가한 두 시인 하다가 나오코와 허무라 히로시가 아세안 신주쿠점 지하 이 층 매장에서 게릴라 라이브
낭독을 했다. 과연 어떤 이벤트이지 주최자인 나도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당일은 이백 명의 천둥이 모여들어 대성황. 낭독을 듣기 위해
찾아온 팬도 있었지만 우연히 지나다가 걸음을 멈춘 사람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두 시인의 낭독에 청중은 숨을 죽인다. <회전문은
차례고>라는 히가시와 호무라의 공저로 시작된 라이브는 '연애를 묻고 답하는 노래'에서 모두를 끌어들인다.
종이 위의 글자를 좇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목소리 톤과 호흡을 몸으로 직접 받아들이기 위해 나는 귀를 기울인다.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만나는 봄의 향기가
풍경과는 듯한 생생함. 말이 되기 전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그 책을 썼구나'하고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