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처음 프랑수아즈 사강이라는 기묘한 작가를 알게 된 건 김영하 작가의 소설 제목 덕분이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책 제목을 스치듯 보고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을 했는데 이 말을 이름도 낯선 외국의 작가가 했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이 생겼다. 그 이후 나는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을 빌려 읽었고, 마지막 문장과 더불어 책을 관통하는 슬픔에 대한 자세를 보고 그를 경외하게 됐다. 더군다나 <슬픔이여 안녕>을 고작 열여덟에 썼다는 사실을 알고 격렬한 질투심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모차르트를 보며 사르트르가 느꼈을 감정을. 그러나 이제는 안다. 사르트르 또한 왕궁의 악사로서 존경받을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 <마음의 푸른 상흔>을 읽으면서는 순수한 경탄을 품을 수 있었다.
사강은 <슬픔이여 안녕>을 통해 엄청난 성공을 거머쥐고 자연스레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그러던 그가 6개월간 단 한 글자도 적지 못하다가 불현 듯 자신의 작품 속에 등장했던 남매를 다시 데려와 풀어나간 이야기가 바로 이 책이다. 주인공 남매의 매력은 물론이거니와 책의 구성이 매우 독특하다. 사강은 세바스티앵과 엘로오노르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틈틈이 자신의 개인적인 에세이를 끼워 넣었다. 작품을 쓰는 중간중간 자신이 느낀 감정과 생각을 가감없이 풀어 놓는다. 주제도 다양하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드물어서 그의 의식의 흐름을 멍하니 따라가는 기분도 들었다. 프랑수아즈 사강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 시공을 뛰어 넘어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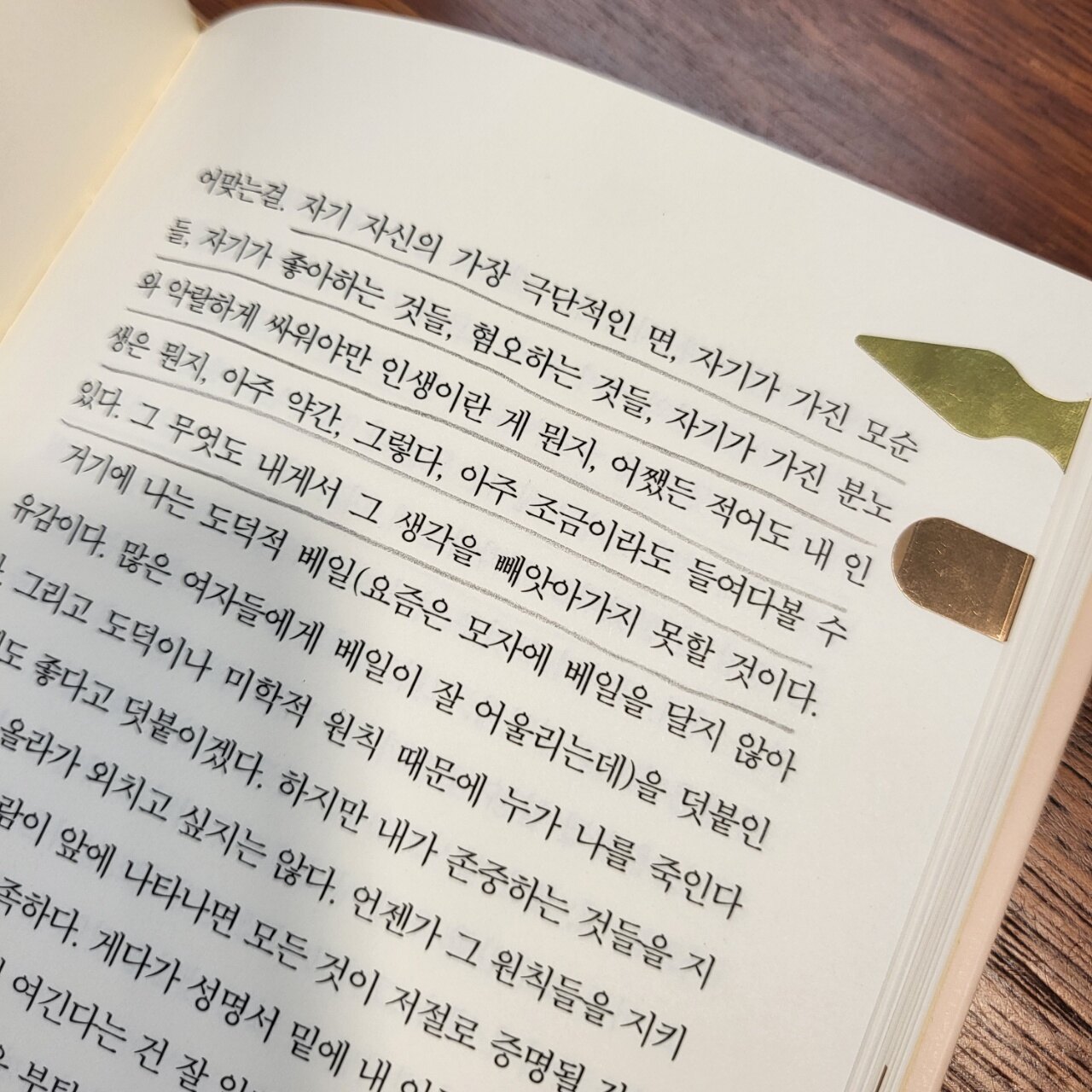
사강은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알고 나 자신인 채 사는 것의 충만함과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다리를 외로 꼬고 맞은편 자리에 앉아 글을 끄적이다가 창문 밖을 건너다 보며 상념에 빠지는 언니를 만난 기분이다. (물론 이런 언니는 내 주변에 없다.) 최근 자기 전에 인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읽을 준비가 된 날이면 한 꼭지씩 읽고 있는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느낌도 든다. 시대를 앞서간 여류 작가들이라는 면에서도 분명 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혼자 오롯이 생활을 꾸리기 위해 또 인생의 다른 전환점을 맞이한 시점에서 읽으니 더더욱 와닿는 문장이 많았다.
솔직히, 단순히 외국 작품이라는 이유를 떠나 사강의 작품에서 친근감을 느껴본 일은 없었다. 무엇보다도 주인공들이 현실감이 지극히 떨어지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 책의 세바스티앵과 엘레오노르 또한 현실에서 찾아보기는 힘든 인물이다. 그들은 이렇다할 직업을 가지지도 않았고, 쉬이 세속적일 수 없는 매력을 지녀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페로몬 같은 느낌을 준다. 자신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희생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에게 남매는 이렇다할 관심을 갖지도 않는다. 곁을 내어주기는 하나, 이 세상에는 둘만을 위한 섬이 따로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 섬은 둘을 제외한 그 누구도 가 닿을 수 없다. 그래서 로베르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 이후에도 남매는 변함 없이 살아간다. 약간의 슬픔을 덧칠한 채로.
<슬픔이여 안녕>으로 사강을 처음 알았던 이십 대 초반에는 주인공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 같다. 그러나 사강의 덤덤한 독백과 소설이 뒤얽힌 이 책을 읽고 나니 세웠던 가시가 누그러진 느낌이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무릇 다양한 저마다의 상황들을 이해하는 품이 넓어진다는 뜻이 아닐까. 무엇보다도 내가 나 자신으로 사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타인에게 무뎌지는 것 같다. 나 또한 한 명의 창작자로서 단단한 내면을 유지하며 타인에게 건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 또한 해 본다.
본 포스팅은 리뷰어스 클럽을 통해 출판사로부터 도서만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