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오래 글을 쓴다고 뽀작대서 그런지 책 읽는 이미지가 생겨서(?) 주변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상식을 탄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어릴 때부터 소설을 좋아해서 장르 안 가리고 읽은 덕에 (그 와중에도 공백기가 있어서.. 꾸준히 읽은 것도 아님) 아주 조금씩 대충 무슨 말이구나 하고 눈치챌 정도의 귀동냥 정보만 조금 있다. 옛날엔 친구들이 잡학다식하다고 한 적도 있다. 이사하고 난 뒤 티빙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두고 밥을 먹는 게 습관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알쓸신잡'도 있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전공한 분야에 대해 막힘없이 술술 이야기하고 그 와중에 더 응용한 이야기를 나누는 잡학박사님들을 보며 정말 오랜만에 학구열을 느꼈다.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긴 했는데 내가 뭔가를 줄줄이 설명할 수 있나? 생각해보니 딱히 없는 것 같아 머쓱할 지경이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교양 서적을 읽고 지식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솔직히 읽는 족족 뇌를 스쳐가기만 하는 정보들을 보니 한 번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읽은 책은 생각보다 작가의 유쾌한 문체로 인해 그리 어렵게 다가오지 않았다. 특히 책의 첫마디를 보면, 언어의 역사를 설명한다는 책이 '우리는 종종 언어로 바보짓을 한다'고 하다니. 어떻게 흥미를 끄는지 아주 잘 아는 작가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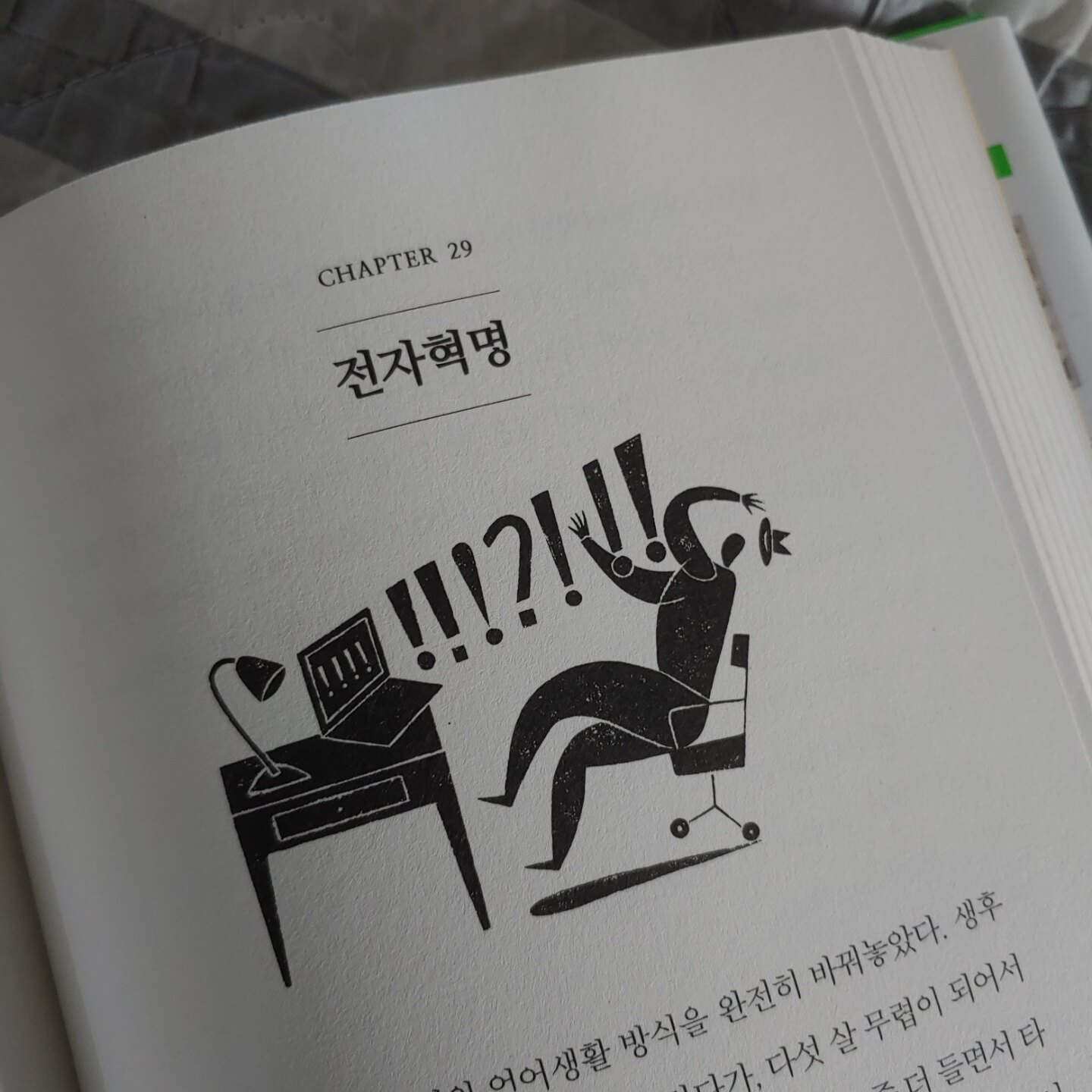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전자 혁명 부분이었다.
일단 삽화가 정말 혁명적이다. 의자에서 뒤로 나자빠지게 생긴 일러스트를 보니 웃겨서 아주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이 챕터를 읽다 보니 문득 내가 전자 혁명에 잘 적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세대는 완벽하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사이에 놓여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양 쪽을 겪어 본 세대인 것이다. 수업시간에 친구의 손과 손을 거쳐 오가던 쪽지를 떠올려 보자. 대부분의 내용은 '이번 시간 끝나고 매점 콜?' 정도였다고는 해도, 대화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 (특히 선생님한테 걸려서 벌 받을 확률 높음) 문장 구조가 웬만큼 지켜지는 상태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반면 요즘 같은 경우, 선생님 눈을 피해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낼 경우 즉각적인 대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몇 개의 청크(언어 학습자가 한꺼번에 하나의 단위처럼 배울 수 있는 단어들의 덩어리)를 활용한다. 우린 점점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대면한 것에 가장 가까운 대화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화 콘택트에서도 '언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의식 체계에, 문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서사한 바가 있는데 이 책을 읽고도 그런 생각을 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 속에는 많은 약속과 체계가 녹아들어 있는 셈이다. 그러니 한 번쯤 언어를 공부해본다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