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랑을 배회하는 양떼와 그 포식자들
임성순 지음 / 은행나무 / 2019년 4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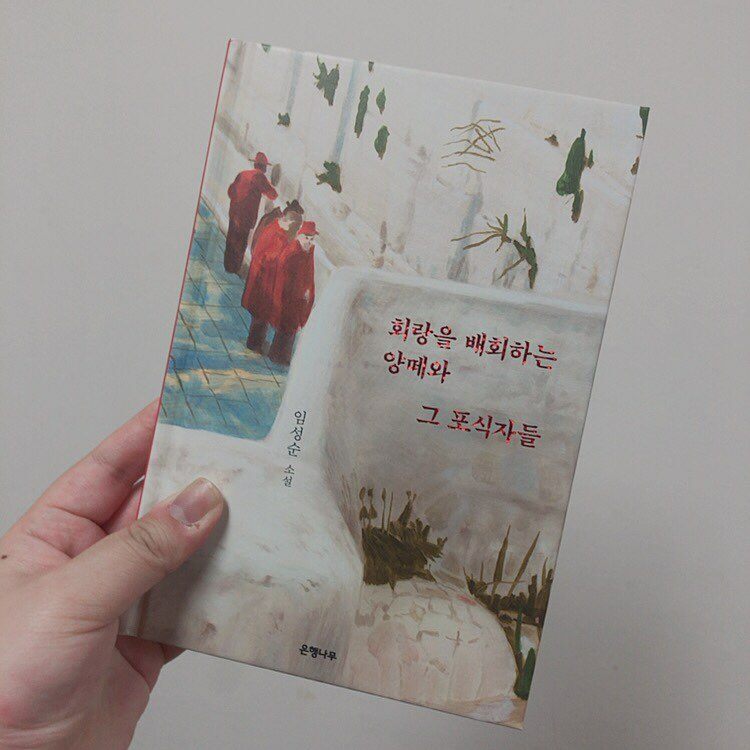
차가운 손이 떠난 자리를 움켜쥐자 내 손이 느껴졌다. 따뜻한 손이었다. 그 따뜻함이 너무 미안해 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나왔다.
/
망각했으므로 세월이 가도 무엇 하나 구하지 못했구나.
임성순 작가님의 <컨설턴트>를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컨설턴트>와는 조금 다른 느낌에 당황스럽기는 했다. 특히 첫 번째 단편 <몰>이 인상깊었다. 예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의 잔해를 처리하는 일꾼의 이야기에서 문득 마지막 문장이 가시처럼 까끌거렸다. 망각했으므로 세월이 가도 무엇 하나 구하지 못했구나. 강렬했다. <몰>이라는 작품만 두 번을 읽었는데, 두 번째 읽을 때에는 따뜻함이 미안해 눈물을 쏟는 주인공과 함께 내 눈도 글썽거렸다. 2014년 4월 16일이 기억이 났다. 지극히 평범한 하루였지만 어떤 뉴스를 보고 영영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던. 당시 나는 대학생이었고 중간고사 기간이라 학교에서 내내 공부를 하다가 (거의 반쯤 졸면서) 집으로 가는 통학버스 안에서 처음으로 뉴스를 들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동생 뻘의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일상을 영위한 것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집에 오는 내내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날 밤은 공부고 뭐고 밤새 네이버 메인에서 새로고침을 했다. 생존자 수를 확인하고, 새로 올라오는 뉴스를 확인하느라고. 손목이 답답해서 팔찌고 시계고 잘 하지 않는 편인데 그 날 이후로 노란 팔찌를 사서 내내 끼고 다닌다. 잊지 않기 위한 방법인데, 이따금 스스로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그 팔찌를 어루만진다. 나는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그 정도면 조금은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나누어 들게 되었으니 더 열심히 살아보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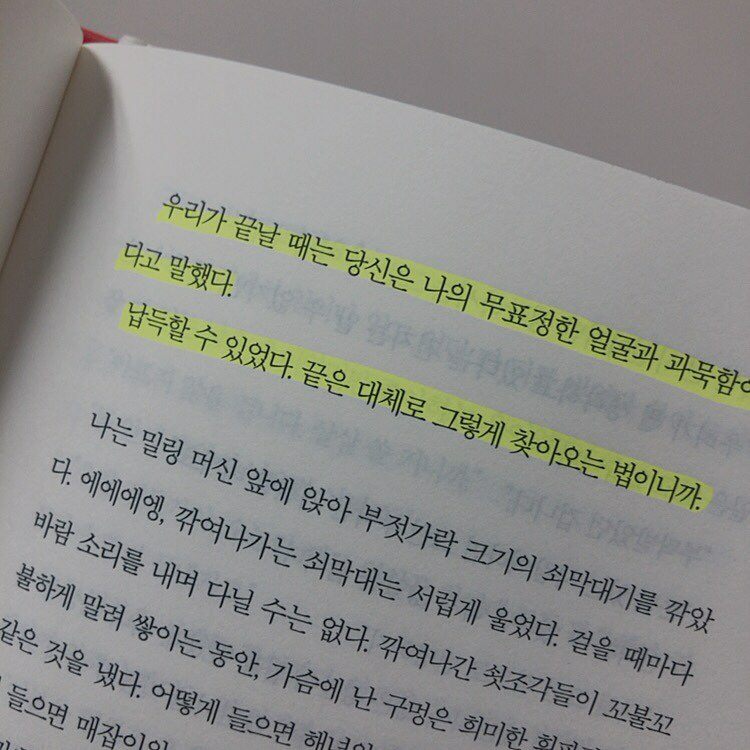
나중에 그녀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내가 구구절절 떠들지 않아 좋다고 했다.
우리가 끝날 때는 당신은 나의 무표정한 얼굴과 과묵함이 싫다고 말했다.
납득할 수 있었다. 끝은 대체로 그렇게 찾아오는 법이니까.
/
마음 끝이 심지처럼 타들어가던 날들이 떠올랐다.
그 심지의 빛이 너무 강해 잠들 수 없었다.
작가님의 해설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자신을 투영해서 쓴 글이 이 <불용>이라고. <불용>을 읽을 때 가장 공감가는 부분이 많았던 건 역시나 작가의 진심이 투영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외로움과, 그럼에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우리가 기억 속 저편에 묻어 두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 유명한 로맨스 영화 <500일의 썸머>에서도 비슷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소한 것들로 사랑에 빠지는 한편 그것들 때문에 사랑이 식어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그 사소한 것들이 결국 우리를 눈물짓게 하기도 한다.
이따금 힘겨운지 지루한지 알 수 없는 하루를 보낸 뒤 침대에 누우면 감이 잘 잡히지 않는 통증으로 인해 불면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마음 끝이 심지처럼 타들어가던 날들이 떠올랐다'라는 말을 들으니, 낯이 설은 문장인데도 반가웠다. 요즈음 특히나 돌아가며 나의 심지에 누가 불을 붙인 마냥 버겁고 뜨거운 통증을 느끼는 일이 잦아서.
단편집을 예전에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김애란 작가님의 <비행운>을 읽은 뒤로 좋아하는 필체의 작가들이 낸 단편집을 읽는 것이 좋다. 내가 좋아하는 문체로 다채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 왠지 어릴 때 갖고 싶었던 과자 종합선물세트 같기도 하고. 특히 이번 책은 장르가 종잡을 수 없이 다양해서 매 이야기마다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책 전체를 관통하는 말투는 어딘가 쓸쓸하고 시니컬한 구석이 있어서 이따금 마주치게 되는, 눈에 확 들어오는 문장들이 반갑고도 좋았다.
본 포스팅은 카페 리뷰어스 클럽을 통해 출판사로부터 도서만을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