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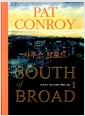
-
사우스 브로드 1
팻 콘로이 지음, 안진환 외 옮김 / 생각의나무 / 2009년 10월
평점 :

품절

우리가 사는 인생은 참으로 오묘하다.
모두 다 똑같이 평범할 것 같으면서도 각자의 인생을 조근 조근 들여다보면 또 이리 기막히고 가혹할 수가 없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지’라고 간단하게 치부해버리기에는 짊어지고 가야하는 삶의 무게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아, 이젠 포기하겠어. 희망 따위는 없어’라고 뇌까리기에는 고귀하게 주어진 인생이기에 미안함이 앞선다. 그렇게 사는 동안 행복이냐 불행이냐의 이분법적인 외줄타기를 하면서도 시간은 무심하게 잘도 흘러간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이 묘한 균형을 이루다가도 한 번씩 제멋대로 휘몰아치는 삶의 폭풍 속에서 가슴 쓸어내리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삶이 이리도 허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끝없이 독하고도 또 한없이 약한것이 인생인가보다.
팻 콘로이가 쓴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기 그지없다는 것’ 이었다. 그는 두 권의 소설을 통해 미국 남부 찰스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데 한 소년이 삶을 배워나가는 여정을 따라가는 만큼 소설의 스케일은 매우 컸다. 그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사회적, 인종적 갈등, 사랑과 우정 등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지나침이 없었다. 그래서 소설을 다 읽고 나면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하나의 소설이라고만 간단하게 분류하기에는 애잔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토록 재미나게 들려준 작가에게 무례를 범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소설을 읽으면서 난 주인공인 레오폴드 블룸 킹과 사랑에 빠졌다. 글의 초반에는 마약소지자로 보호관찰을 받는 못생긴 소년이었던 그가 책을 덮고 나니 이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넉넉한 웃음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미중년의 칼럼니스트로 탈바꿈하여 내 가슴을 온통 휘젓고 가버렸다. 형의 죽음으로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타인의 상처를 공유하고 치유해 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멋진 남자였다. 그래서였을까? 그의 주위에는 완벽한 삶의 주인공들은 없었다. 가정적으로 불우하던지, 여전히 인종차별을 겪고 있는 흑인친구 아니면 고아남매 등... 평범하게 볼 수만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만나게 된 그들은 레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도 멋진 친구가 되어 긴 세월동안 끈끈한 우정을 나누게 되니 삶이란 참 아이러니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이 책을 너무도 인상적이고 재미나게 읽었음에도 리뷰를 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였을까? 아니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였을까?
이도 저도 아니면, 읽는 다는 것 그 자체로도 크나큰 만족을 느꼈기에 그걸 말로 풀어쓴다는 게 엄두가 안 났을지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2권의 소설을 다 읽고도 왜 이리 책이 손에서 안 놓아지는지,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되지 않음이 어찌나 서운한지 작가는 짐작이나 할까?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게 해준 이 책을 만난 건 2009년이 가기 전 만난 커다란 행운이 틀림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