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1년 돌아가신 엄마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당신 엄마는 살아있다'라며 알 수 없는 말을 해댄다. 그 엄마의 무게는 5천만 톤이 넘고 키는 10만 7천 킬로미터 이상이라고 한다. 생전엔 고작 152센티가 조금 넘었을 그녀가 말이다. 분명 저기, 할머니의 무덤 근처 어디쯤엔가 묻혔을 텐데 말이다.
그러나 오래전 돌아가신 엄마는 이제 이름도 잊히고 인간이라는 존재도 박탈 당한 채 셀 수 없이 조각나고 셀 수 없이 복제되어 세포로서 세상 여기저기에 있다. 우주에도 갔단다, 엄마가.
엄마의 이름은 헨리에타 랙스다. 과학은 그녀를 헬라라고 부른다.
이 책은 존재를 망각당한 한 인간에 대한 기록이자 그녀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이다.
(왜 표지 사진을 안 찍었을까... 상단의 표지 이미지는 여성의 옆 얼굴 모양으로 만들어진 겉표지를 펼치면 나오는 부분이다.)
흑인, 저소득층, 문맹에 가까운 교육 수준. 이것이 랙스 가족으로부터 헨리에타를 헬라로 조각 내버린 까닭이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 당연시되고 흑인이 (흑인 전용)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기던 시절이었다. 그래도 너무 가혹한 현실 아닌가. 시대가 그러했고 의학적으로 목적이 아무리 건설적이었다고 한들,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공장에서 대량생산되어 이리저리 팔려나간다는 사실이 말이다. 헬라 세포로 거대한 부를 쌓은 일부 백인들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듯, 랙스 가족들은 의료보험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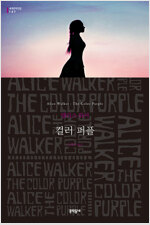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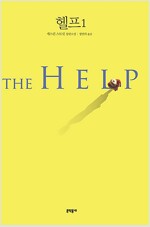

백인에게 차별받는 흑인, 그리고 그런 흑인에게도 차별받는 흑인 여성.
갑자기 떠오른 이 책들 -<컬러 퍼플>과 <헬프>다. 사실 두 작품 다 영화로 먼저 접해서 영화 속 장면으로 기억되는 부분이 많다. 같은 흑인끼리라도 흑인 성인 남성에게 핍박과 성적 학대를 받는 흑은 여성의 삶은 영화임을 감안하더라도 목도하기 괴로웠다.
안타깝게도 랙스가의 사람들, 헨리에타의 자녀들도 이러한 폭력 앞에선 자유롭지 못했다.

<헛간, 불태우다>
'그렇다더라'라는 소문만으로 어떤 흑인은 살해당한다. 진위도 모르고 진실도 아닌 뜬소문 하나만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흑인의 목숨이다. 게다가 흑인을 옹호하는 백인은 니거 러버(nigger lover)라는 멸칭으로 조롱당한다. 이런 분위기는 2022년인 현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카니예 웨스트와 이혼 전 킴 카다시안은 니거 러버로 조롱당하기 일쑤였다.


인종, 계급, 문화적 차이로 발생한 의학적 충돌을 다룬 앤 패디먼의 [리아의 나라]. 감사하게도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다(오른쪽 표지).
헨리에타의 삶을 탐색한 레베카 스클루트를 보고 자연스럽게 떠오른 책이다. 두 작가의 태도 모두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존경스럽고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자질이다. 범부인 독자는 그저 대단하다는 말 밖엔 보낼 찬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