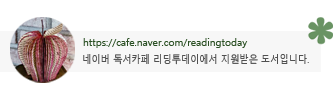-

-
철학자의 사랑법 - 김동규 철학 산문
김동규 지음 / 사월의책 / 2022년 4월
평점 : 


철학자의 시선에서 사랑을 탐사하는 철학 산문이다. 평범한 일상에서 사랑이 갖는 참된 의미, 사랑을 근본으로 한 한恨과 멜랑콜리, 현 시국을 사랑의 관점에서 짚어감을 프롤로그를 통해 밝힌다.

사람이 엄마의 자궁을 집으로 삼고 세상에 나와 반응하는 존재는 사랑에 기초한다. 눈맞춤, 울음, 옹알이, 몸짓 등 그 모든 작용은 사랑하는 이와의 교감이다. 이렇게 인간은 태초의 언어(사랑)을 시작한다. 저자는 플라톤의 <향연>을 빌어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더 먼저 더 오래'된 가치라고 얘기한다.
여기에서 나르시시즘과 에고이즘을 구분하는데, 나르시시즘이란 한갓 이기주의를 뜻하는 에고이즘과는 구분되는 자기애다. 타자를 자기처럼 사랑하는 이타적인 모습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나르시시즘은 협소한 에고이즘과 구분된다. 자기사랑이 곧 타자사랑이라는 말은 못난 내 모습까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유의미하려면, 내 못난 모습, 사회로부터 업신여겨지는 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자타의 강점이 아닌 약점마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요체이고, 도달하기 힘든 사랑의 성숙함이라고 말씀하는데, 자존감이 곧 사랑의 다른 말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에서조차 득실을 따지는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알아내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이가 풀어내야할 운명일지도 모른다. 간혹 삶의 의미를 묻는 것도 그 때문일 터다. 인간은 감사하는 과정에서 무한한 우주와 생명 탄생의 전 과정을 회고하며, 그 망망대해에 한 점으로 떠 있는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성찰하는 존재라고 말하는 그의 말에 생각이 길어진다.
ㅡ
철학자는 한恨과 멜랑콜리는 엇비슷해 보이지만, 사뭇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 恨이란 이름도 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공포와 당혹감을 기저에 깔고 있는 정서이고, 멜랑콜리는 타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낭패감에 가깝다. 恨이 슬픔을 추억으로 가공해 내는 슬기로운 체념이라면, 멜랑 콜리는 상실 대상을 단념하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존재의 근거를 박탈당하는 슬픔과 고통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지독한 빈곤, 지독한 차별, 지독한 폭력, 지독한 혐오가 그렇다. 반면 타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낭패감은 좀 다르지싶다. 과도한 '자기애'의 벽에서 벗어난다면 방법이 보이지 않을까.
저자는 恨의 담론에 대해 서술하면서 '삭임'이라는 단어와 판소리의 시김새, 발효식품에 대해 얘기한다. 읽다보니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대체로 조리 시간에 많은 시간을 요한다. 김치는 말할 것도 없고 된장, 떡, 식혜, 그리고 고기를 주재료로 하는 음식조차 빠른 시간 내에 조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수제천' 전곡을 들었다. 현존하는 우리 음악 중 가장 아름다운 곡이라는 평을 받는 수제천의 끊어질듯 하면서도 절묘하게 이어지는 음색이 기억난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빠름 빠름 빠름' 이 최우선하고, 스스로에게 '냄비근성'이라는 자기비하를 하게 된 것일까...... .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슬픔은 恨과 멜랑콜리의 사이에 있다고 얘기하며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죽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마음이 몸을 죽이는 것'이라는 문장에서 요즘 챙겨보고 있는 한 편의 드라마가 생각났다. 자유와 해방을 동경하지만, 정작 어디로부터 해방되어 어디로 향해야하는지를 모르는 우리. 모두들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산다는 게 왜 이렇게 족쇄를 매단 것만 같은지.
필요(특히 경제적 필요성)를 증명하지 못하면, 필요의 노예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 슬픈 현실에서, 철학자는 이 척박한 환경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이야말로 인간 생존법이라고 말한다. 이 책을 덮고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을 읽었는데, 문득 이 내용이 떠올랐다. 삼천과 새비, 두 여성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을 우선하는 세태에서 신뢰와 선량함은 고루한 가치가 되어 뒤로 내쳐진지 오래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이다. 하여 '착함'은 연민의 사랑이라는 철학자의 말이 참 많이 와닿는다. 인류 탄생 이후 가장 근본적이며 오래된 불멸의 가치는 사랑, 그것이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