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큐멘터리 미술 - 르네상스에서 21세기 아시아까지 미술의 탄생과 역사
KBS [다큐멘터리 미술] 제작팀.이성휘 지음 / 예담 / 2011년 4월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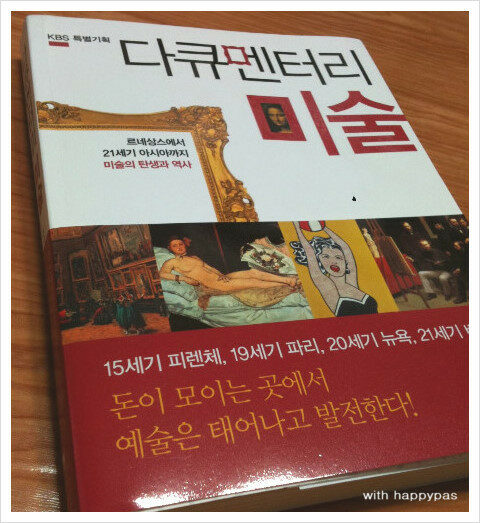
나는 예술이라고 하는 장르와 거리가 멀고도 너무나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항상 예술 분야에 능력있는 예술가 뿐만 아니라 주위에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보아도 부러움 이상의 가슴 떨림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술이라고하면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분야는 '미술' 입니다. 이번에 만난 책은 KBS에서 특별기획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미술>에서의 아쉬움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방송에 담지 못한 부분까지 담아 책으로 출간을 한 것 입니다. 국내 최초로 '미술사' 다큐멘터리를 기획하며 나와같은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미술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결코 쉽지 않을거야라고 했던 처음 걱정보다는 한편으로 재미있고 또 한편으로는 생소한 이름과 용어들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크게 다섯 개의 파트로 피렌체, 파리, 뉴욕, 영국, 아시아의 지역을 구분하여 주요 이슈와 빼놓을 수 없는 미술사에 대해 여러방향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정신을 이어받은 르네상스 시기의 미술 시장부터 아시아 현대미술까기 재미나고 유익한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꼼꼼히 다룬 것 같은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책을 만나기 전에 먼저 TV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미술>을 만났다면 복습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쉽고 받아들이는게 빠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큐멘터리와 책에서 이야기 하고자 했던 이슈는 세가지로 첫째, '미술의 진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둘째, '미술은 돈이다.' 세째, '맨 얼굴의 미술, 그 진정한 의미'를 느껴보도록 구성했다는데 이 점을 생각하며 책을 읽고, 그림을 보니 무언가 내 안에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 이였던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그림으로 초상화의 실제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 찾아 나가는 모습은 실제 그들을 따라 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부터는 초상화가 왕, 귀족, 성직자들의 전유물에서 상인 계급도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같은 저명한 예술가에게 초상화를 의뢰할 수 있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가 가지고 있는 신비스러움과 인물에 비해 흐릿한 풍경의 대기원근법을 통한 원근감 그리고 X-레이투시에서의 특수성 등에 대한 해설은 레오나르도가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꼽히는 이유임에 고개가 끄덕여 짚니다. 미소에 대해 총체적인 연구를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모나리자의 미소를 다시한번 쳐다보게 됩니다. 정말 웃고 있는 것일까요? 그 미소의 뜻이 무엇인지 무척이나 궁금해지는 것은 다시 보면 볼 때마다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술 아니 미술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을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아니 예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모르는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관심이 없다는 말로 해명 아닌 변경을 늘어놓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할 것 같지만 말입니다. 특히, 두 번째 파트에서 마네의 '올랭피아'와 누드의 미술사를 만나면서 누드화에 대해 다같은 누드화가 아니였고 시대적 배경이나 신화에 대한 허식으로 쌓여 있던 시기의 누드에 대해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랭피아'로 인해 변화되어가는 사회를 꾸미지 않고 담아낸 미술의 시작이라는 생각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21세기라고 하는 시점이기에 되돌아 보며 판단하는 것이겠지만 말입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어디선가 많이 본듯한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오렌지 마릴린'이라는 작품 속의 주인공 '마릴린 몬로'는 '앤디 워홀'의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현대미술에 있어 순수와 상업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앤디 워홀'은 대중의 스타로 자리 잡았다는데 그 대중에는 아직 저와 같은 사람은 조금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순수와 상업의 경계마저도 다가서기 부담스러워하는 위치(?)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대중을 위한 미술에 대중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중을 위한 미술이 아니지 않은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책을 읽어가면서 가장 마음에 와닫는 문장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미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내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자해서일지 모르지만 너무나 마음에 와닫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과 함께 영국의 미술에 대한 지원 프로모션에 대해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미술관의 입장료 뿐만 아니라 미술품을 살 때 돈을 빌려주는 제도와 예비 작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정은 단순히 선진국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술은 그냥 보기 좋으면 좋은 거다. 보기 싫으면 싫은 것이다. 굳이 미술사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 가서 보고 '와우!' 하고 감탄사가 나오면 그것으로 좋다.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
- 데미언 허스트 - p.225
드디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미술 이야기를 만나 봅니다. 아시아를 만나면서 미술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몇 년전 미술품으로 로비를 했던 뉴스가 머리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에 있어서도 중국의 위치에 대해 대단하다는 생각보다 두려움을 먼저 느끼는 것은 왜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하나, 세상은 돌고 돈다는 명언이 생각납니다. 돈도 미술도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 가는 힘도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미술도 이끌어 가는 힘의 중심에 의해 돌고 도는 것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 <다큐멘터리 미술>은 미술을 포함한 예술이라는 분야에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내게 따뜻한 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책에서 설명한 작품들을 다시 한번 누구에게 설명하라고 하면 솔직히 겉핥기 식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데미언 허스트'의 좋은 문장 처럼 보기좋고 가슴으로 느끼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멀어도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미술이 조금은 아주 조금은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