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살의의 쐐기 ㅣ 87분서 시리즈
에드 맥베인 지음, 박진세 옮김 / 피니스아프리카에 / 2013년 1월
평점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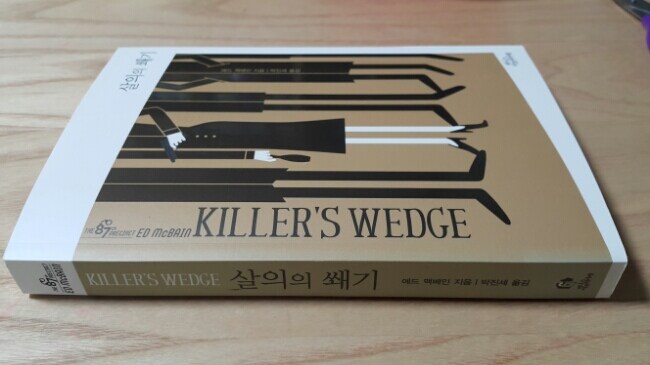
#1. 87분서 시리즈의 재미란..
[살의의 쐐기]는 제가 읽은 87분서 시리즈 중 다섯번째 작품입니다. 에드 멕베인의 87분서 시리즈는 참 묘한 작품이예요. 사실 명성에 비해 막상 읽어보면 거뭐.. 그냥 심심~~~ 하거든요. '의잉?? 뭥미??' 이런 기분이 든단 말입니다. 가장 먼저 읽었던 작품이 아마도 [조각 맞추기]였던 거 같은데, 지금 다시 읽으면 아주 재미지게 읽을 것 같지만 그 당시 첫작품을 읽을때는 87분서 시리즈에 대한 정보도 없고 적응도 안되어서인지 그냥저냥 그랬습니다. 막 하드보일드도 아니고, 심장을 움켜질만큼 쫄깃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섭기를 하나, 잔인하지도 않고, 사회풍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술에 술탄듯 물에 간장탄듯' 하더란 말입니다.
두번째 작품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상강도]는 사실 내용상 잔인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읽다보니 그냥 심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별로 평도 안좋게 했던거 같네요. 등장인물도 배경도 다 생소해서 그랬던거 같습니다. 무엇보다 87분서 시리즈 특유의 그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컸던 거 같네요. 최근에 나왔던 [마약밀매인]과 [사기꾼]을 읽을때는 좀 익숙해졌던지 다른 분들보다 좀더 재미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마도 이 시리즈를 여러권 읽어보신 분이라면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듯 합니다. 읽을수록 읽는 재미가 있는 묘한 시리즈예요. 여튼 피니스아프리카에에서 출간한 87분서 시리즈가 총 6권인데 이중에 [살의의 쐐기]와 [킹의 몸값]만 읽지 않고 뒀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시리즈 중에 수작이라고 평가받는 작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맛난 걸 아껴두는 심정으로 미뤘던 것이죠. 이제야 메인요리를 먹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살의의 쐐기]를 읽었습니다. 역시 시리즈 중 가장 재미있다는 평가를 받을만 하군요. 하지만 작품을 읽는 순서가 바뀌었다면 평가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98분서 시리즈는 한작품 한작품을 읽는 재미도 있겠지만 마치 시리즈 자체가 한 작품인냥 읽는 것이 더 재미지게 읽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2. 처음 느껴보는 긴박감.. 생소하면서도 희한한 재미..
솔직히 이 작품 [살의의 쐐기]를 읽으면서 다섯권째만에 내용전개상 긴박감과 긴장감이 처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전에는 읽으면서 '아무리 오래된 작품이라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쫄깃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꾸역꾸역 계속 읽어오게 되었던걸 보면 나도 모르는 묘한 재미와 매력이 있기는 있었던 모양이지만 여튼 막 스피디하면서 긴장감 넘치는 쪼임이 거의 없었죠. 심지어 주인공 카렐라가 총에 맞아 나자빠질때조차 '어?' 하는 정도의 의아함이 있었을뿐이었을 정도였을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희한한 인질극과 밀실추리가 병행되면서 놀라움이 있었어요. '뭐야? 87분서 시리즈도 긴장감 조성하는거야?'하는 마음에 에드 멕베인 옹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고 싶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하면서 말입니다. "그래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안썼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곁드려 주고 싶더군요.
후기에 보니 이 작품이 시리즈 열두번째 작품이라고 되어있어요.([킹의 몸값] 후기에는 [킹의 몸값]이 열번째고, [살의의 쐐기]가 그 전전작품이라고 되어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여덟번째 작품인 건데 아무래도 저자의 인터뷰 내용을 발췌한 열두번째 작품이라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것도 같고) 여튼 원래 세작품만 쓸려다가 인기가 좋아서 늘리고 늘리고 한건데 한 12번째 쯤되자 이제 '에이 뭐 이런 설정으로도 한번 써볼까?' 하고 쓴거 같습니다. '이것만 쓰면 너무 단순하니 밀실트릭도 좀 써먹어 볼까?' 이런 생각도 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시리즈 면면을 살펴봐도 에드 멕베인이 아주 치밀한 사람은 아닌거 같아서 말이죠..ㅋㅋ
#3. 시리즈를 읽는 소소한 재미
이 시리즈는 특유의 유머코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상황에 따른 유도리있는 유머와 재치를 중시하는 저같은 사람은 이런 미쿡씩 개그에 익숙치 않아요. 전혀 익숙해지지도 않고... 그들만의 코드가 이해는 되는데 용서는 안되는 그런 심정입니다. 웃긴답시고 등장인물이 유머를 막 구사하는데 '아... 왜에.. 도데체 왜 그러는데...'라고 면박을 주고 싶어지죠. 정말 다행인 것은 대체로 작품속 주변 인물들이 이런 저질 유머를 서로 안받아주는 웃긴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어쩌면 서로 서로 면박주거나 무시하는 작품속 상황들이 오히려 웃음을 자아냅니다.
이 작품의 경우는 중간중간 폭팔물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인데 한명 두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등장해서는 상황을 부드럽게 해보려고 썰렁한 농담을 던지는데 그게 차암~~~ 드럽게 재미없죠. 그나마 그 상황이 기가차서 웃기기는 합니다.
오히려 이런 썰렁 멘트보다는 이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사건의 전개로 웃음을 자아냅니다. 일단 기본이되는 두가지 설정. 첫째, 경찰서, 심지어 강력반 사무실이 더 심지어 여자한명에게 점령당해서 폭팔물 위협도 받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희한한 인질극 비스무리한 것의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시리즈 전체의 비중 갑 주인공 스티브 카렐라를 기다립니다. 두번째, 스티브 카렐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살로 보이는 밀실살해사건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경찰서로 돌아오지 않다가 결국 해결해내죠. 그리고는 의기양양 등장하는데(등장전에 다행히 강력반 사무실은 정리가 됩니다.) 이 난리에도 그 핵심 주인공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천하태평을 떨어죠. 이 상황이 무척 웃깁니다. 역시 스티브 카렐라의 매력이 +10정도 올라가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어김없이 등장하는 카렐라의 벙어리이자 귀머거리 장애를 가진(그러나 드럽게 예쁜) '테디'. 이 부부의 애정행각도 볼만 합니다. 아내와의 약속도 잊고 일에 몰두하는 카렐라를 전혀 나무라지 않고 사랑하는 테디의 모습은 거의 테디가 아니라 "테레사"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 만큼 숭고합니다. 경찰들과 범죄자가 우글거리는 87분서 이야기 전체에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이 작품을 읽고보니 이제는 카렐라와 테디가 처음 만나는 시리즈 첫작품인 "경찰 혐오자"를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군요.
참, [살의의 쐐기]에서 쐐기란 단어는 사실 경찰서를 점령한 여인이 카렐라에게 가지는 극한 적대감이나 살의가 형사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고 먼저 정리를 해버렸는데 마지막에 보니 밀실트릭을 깨는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구요. 의외로 일차원적인 제목에 살짝 멘붕이 왔습니다.
참참, 에드 멕베인이 웃긴 것이 사건 전개 중심으로 이야기를 막 전개해나가요. 근데 딱 첫문단과 이야기가 환기되는 중간 중간에 한번씩 뜬금없이 순문학 흉내를 냅니다. 그 외 그런거 있잔습니까? 자연이라던가, 계절의 변화 등등을 유려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서 분위기를 잡는거 있죠? 그런 문장들을 꼭 넣어요. 습작쓰는 작가 지망생들이 소설을 쓰면 꼭 그렇게 되잖아요. 뭔가 신춘문예스러운 문장들 말입니다. 이 아저씨도 그런게 있어요. 저같은 사람이 느낄만큼 촌스럽거나 의도적이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시리즈 다섯권째에서 드디어 이 시리즈의 재미를 알았습니다. 킹의 몸값도 읽어봐야겠어요.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네요. 이 시리즈가 얼마나 더 출간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재미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 맛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