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자 없는 남자들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양윤옥 옮김 / 문학동네 / 2014년 8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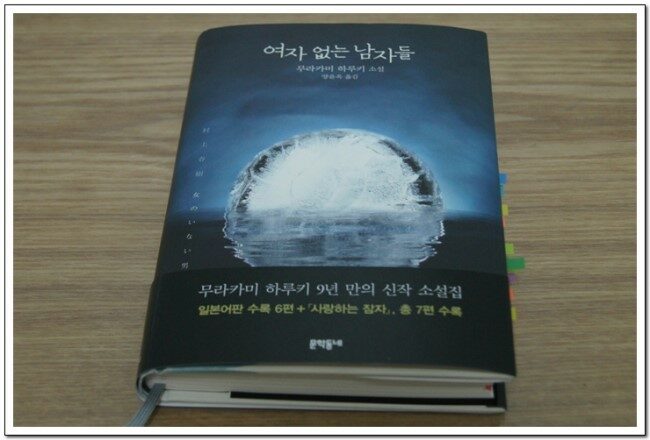
#1. 노장의 귀환이 반가운 이유
일전에 조용필씨의 "Hello" 앨범이 무척이나 센세이션을 일으킨 기억이 납니다. 조용필이라는 레전드 스타의 신규 앨범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올드 중에 올드라 할 수 있는 그가 오히려 더 세련된 음악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한참 흥얼거렸으니까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본 조비의 경우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원래 대중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여튼 락 스피릿을 뽐내던 본 조비가 뭔가 달달하고도 고음조차 없는 "Make a Memory"를 들고 나와 아메리칸 아이돌 같은 무대를 통해 단박에 차트 정상에 오르는 모습은 반가움을 자아내었었죠.
곡 자체는 무척이나 스윗하면서도 뭔가 올드스쿨 정서를 자극하는 웰 메이드 곡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전 본 조비의 거친 느낌은 완전히 사라져서 과연 이 본조비가 그 본조비냐?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들기도 하죠.
하루키 센세의 단편집을 읽고서 뜬금없는 본 조비 드립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때 느꼈던 감정과 지금 [여자 없는 남자들]을 대하는 저의 기분이 묘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없는 남자들]에 수록된 작품들을 하나 하나 읽어가다 보니 90년대 중반 대학시절 멋모르고 읽던 하루키의 초기작의 원형이 분명히 살아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이 든 노장의 연륜이 함께 뭍어 나면서 그 사이의 묘한 긴장감이 기분좋게 느껴졌던 것이죠. 이것은 화려했던 노장들이 또 다른 매력으로 대중곁에 돌아올 때 느끼는 신선함과 안도감?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합니다.
하루키 센세가 이 시점에 단편집을 출간할 거라고는 솔직히 기대를 못했었습니다. 의외 중의 의뢰랄까요. 사실 최근엔 뭔가 시원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장편들 때문에 작가도 지치고 독자도 지치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번 '색채가 없는 다자키~~'의 국내 반응이 신통치 않았던 탓도 있고 1Q84가 마무리 되지 않은 탓도 있어 한편으로는 장편소설에 집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벼운 에세이집 정도가 교차 출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묘한 시기에 단편집이 나왔습니다. 이 작품집을 읽고 나서 생각해도 생뚱맞습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무척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단편집이 그동안의 하루키 피로감이 있으시던 분들께 조금 해소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여자 없는 남자들...
하루키 센세를 이야기할 때 여자를 빼고 이야기가 될까 싶을 정도로 쿨하고 마이너한(대체로 삼각관계가 많은) 사랑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없는 남자들"이 핵심 설정이라니 의아 합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설정에 꽂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뭔가 구체적인 설정을 잡고 연작을 이어가는 방식은 독자 입장에서는 읽는 재미가 있어 좋습니다.
하기야 예전 단편도 달랑 제목만 정해놓고 내용을 만들어 채우거나 특정 단어 하나에서 출발해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었다고 볼 수 있어 '왜 때문에?'라고 묻는 것도 의미가 없기는 하겠습니다. (왠지 물어도 제대로 답을 못할 것만 같으다.)
여튼 [여자 없는 남자들]에는 총 7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한결 같이 사랑하는 여자를 잃은 남자들이 주인공인 작품들입니다. 대체로 각 각의 작품들이 독특한 특색이 있으면서도 크게는 단편집에 자연스레 녹아드는데 반해 여섯번째에 실린 "사랑하는 잠자"라는 작품은 아무리 생각해도 묻어나지 않고 뭔가 조화가 안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단편집에서는 뺐어야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체의 통일성을 상당한 해치는 작품입니다. 차라리 표제작까지 6편을 모두 수록하고 부록으로 "사랑하는 잠자"를 넣었다면 훨씬 좋을 뻔 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출간된 민음사 "세계의 문학 150호"에서 만났던 '드라이브 마이 카'를 비롯 유일하게 20대 젊은 청춘이 주인공인 '예스터데이'도 좋았고 '독립기관'도 상당히 강렬했습니다. '셰에라자드'는 읽을 때는 흥미로웠는데 제목부터 뭔가 마음에 안드는..., 전체 단편집에서 저의 베스트는 사실 '기노'였습니다. 작품 분위기도 그렇고 남자 주인공에게 어느정도 감정이입도 되고 아주 좋았습니다. 주인공의 태도, 주인공이 파고드는 공간인 카페, 그리고 그 주변 환경과 신비한 존재들, 이 모든 설정이 가장 하루키 스러운 작품이었습니다. 대체로 이번 연작에 실린 작품들은 사실주의에 가깝다보니 '기노'가 더 눈에 띈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따로 노는 '사랑하는 잠자'는 그 자체로는 재미있기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제작인 "여자 없는 남자들"은 솔직히 독립된 단편이라는 느낌 보다는 그저 전체를 아우르며 작가가 어떤 의도와 시각으로 바라보는가를 설명해 주는 자료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엉뚱한 하루키씨 답게 단편 그의 작품 안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시각이 돋보이는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우린 스무 살이야. 그런 게 부끄럽다느니 뭐라느니 할 나이는 아니잖아. 시간이 속도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어긋날 수도 있어." - 예스터데이 중
"모든 여자는 거짓말을 하기 위한 특별한 독립기관을 태생적으로 갖추고 있다." - 독립기관 중
"인생이란 묘한 거야. 한 때는 엄청나게 찬란하고 절대적으로 여겨지던 것이, 그걸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버려도 좋다고까지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 혹은 바라보는 각도를 약간 달리하면 놀랄 만큼 빛이 바래 보이는 거야." - 셰에라자드 중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여자 없는 남자들이 된다. 그날은 아주 작은 예고나 힌트도 주지 않은 책, 예감도 징조도 없이, 노크도 헛기침도 생략하고 느닷없이 당신을 찾아온다." - 여자 없는 남자들
#3. 표지에 대해서...
국내판 단편집 표지는 수록작 중 '예스터데이'의 주인공의 꿈 속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실체화한 표지인 것 같습니다. 신비롭고 몽환적인 것이 하루키 센세와 잘 어울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발간된 표지는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전형적인 하루키 센세의 작품들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특징들을 잘 잡아낸 그림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판 표지가 더 낫다는 생각은 별로 안들지만 이 단편집의 표지 느낌은 조금은 더 가볍게 갔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음.. 일본판 표지도 아쉽고, 국내판 문동 표지지도 멋지기는 한데 너무 무거워서 아쉽습니다. 단편집이니 만큼 조금은 더 부담없는 표지였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어차피 개인의 취향이니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사항은 아닌데 국내로 넘어오면 뭐든 무겁고 진지해지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얼마전에 문학동네에서 표지 투표를 했었는데 정작 결정된 표지는 그 당시 투표한 후보들 중엔 없군요. 저는 두 가지 정도가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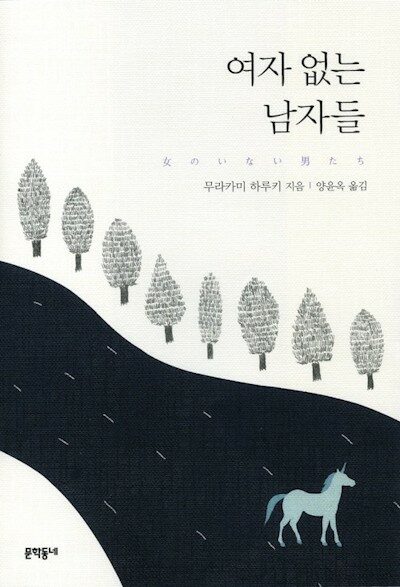
왼쪽 표지 정도의 느낌이 가볍고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말입니다.
여튼 굉장히 재미있게 반갑게 읽은 하루키 센세의 단편집 [여자 없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읽는 관점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저 '명불허전'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작가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