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카소의 색 - 빛의 파편을 줍다
게리 반 하스 지음, 김유미 옮김 / 시드페이퍼 / 2013년 10월
평점 :

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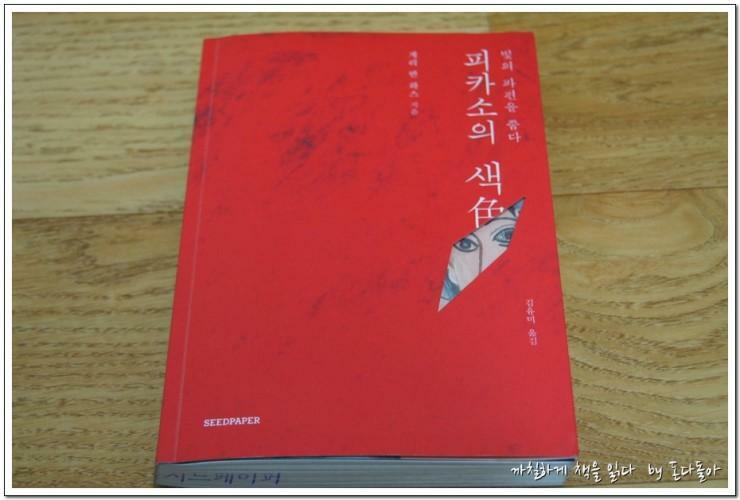
#1. 화가에 대한 책이지만 모노톤인 이유?
미리 말해두자면 저는 피카소가 어느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살아가는데 하등의 불편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알아야 할 이유가 없었을 따름이지요. "괜히 잘 아는척하기 신공"을 위해서라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 주변에는 피카소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어느나라 사람인지, 어느정도 레베루의 화가인지에 대해서 묻는 사람도 궁금해 하는 사람도 없었던거 같습니다. 그리하야 지금에 이르러도 피카소의 국적도 모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양반도 나의 존재를 모르고 돌아가셨으니 어느 정도는 공평하다고 하겠습니다.
'빛의 파편을 줍다'라는 부재가 붙은 [피카소의 색]은 피카소의 성공 이전 스토리가 담긴 책입니다. 뭐랄까? 좀 처절하고 찌질하고 구질구질한 시기 말입니다. 부재인 '빛의 파편을 줍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이 책의 말미에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피카소의 성공 계기가 되는 결정적인 상황(물론 저자가 직접보진 않았을테니 나름 꾸몄을 테지만)을 한문장으로 잘 드러낸 표현입니다. 편집자의 센스가 돋보입니다. 저는 이런 사족스러운 것에 묘한 질투와 찬사를 동시에 보내는 것입니다.
본론이 늦게 나오는 것은 마포 김사장식 천년만년 서두쓰기라 피하고 싶은데 잡설이 길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으레 피카소의 작품이나 화풍을 설명하는 책이려니 했습니다. 그리하여 총 천연색 올컬러 유광 빤짝이 재질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디자인 했을 것으로 지레짐작을 했던 것입니다. 책을 받아들고 보니 오잉? 이것은 그 유명한 재생지 느낌의 모노톤, 그레이 스케일을 자랑하는 저렴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간 제가 접했던 시드페이퍼의 느낌은 책 내용은 물론 디자인이 예쁘고 화사하기에 그것 만으로도 소장가치가 큰 책을 만들어내는 곳이란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 재생지 같은 똥종이에 흑백이란 말인가? 출판사 사정이 급 나빠졌나? 사장님이 급전이라도 쓰셨던가? 아니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갸륵한 노력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이 책의 판매부수를 예상할 때 빠른 손익분기점 돌파를 위해 제작비 절감을 목적으로 그랬으려나? (흑백이라고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나 상식은 당연히 전혀 없음)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저 제작비 절감이 아닐까 막연히 생각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다시 생각해보니 책의 디자인이 모노톤으로 나온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피카소의 작품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피카소의 미술적 기교나 화풍, 미술사적 위치 등을 논하는 책은 더더더더더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그의 어린시절부터 화가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과 주변 인물들에 대해 그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총천연 올칼라 편집이 불필요한 것이지요. 오히려 이런 모노톤 재생지가 이 인물 소설에 더 집중하게 해 준다는 느낌입니다. 그리하여 편집자의 이 선택은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종이 재질만으로 이 책의 성격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점은 놀라운 발상입니다.(내맘대로 해석해서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고 있다고 말 못.....)
#2. QR코드를 대하는 나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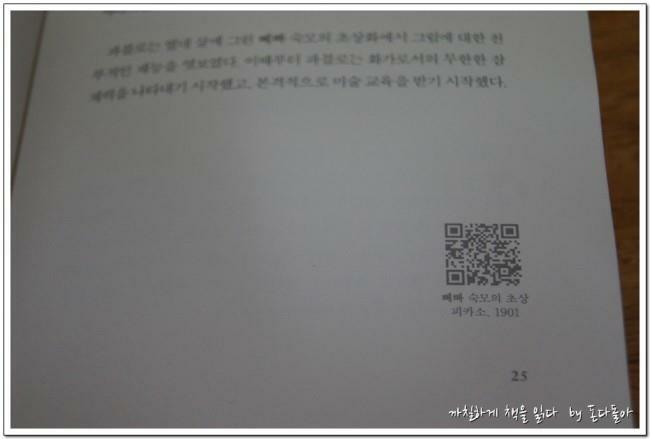
이 소설에는 초반 피카소의 자화상을 제외하고는 이야기 전개중에 등장하는 그림들에 대한 삽화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하단에 QR코드와 간단한 제목이 적혀 있을 따름입니다. 이 QR코드를 만나는 저의 심경은 크게 두가지 정도로 나뉘었습니다. 먼저는 이런 겁니다. '아니, 이걸 날더라 찾아다니며 보란 소리야? 책은 책만으로 완성이 되어야지 왜 핸드폰으로 책 삽화를 찾아 감상하라는거지?' 뭐 요런 고민, 그리고 다음으로 든 생각은 '흠, 이거 막상 찾아보니 어렵지도 않은데다가 은근 재미지잖아? 이런 아이디어도 참 괜찮구만' 이런 거였죠. 저 QR코드를 찍어보면 저 QR코드에 해당하는 그림이 블로그 포스팅 형식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글을 보면 이 책에 찍혀 있는 QR코드에 해당하는 그림들을 순서대로 저장해 두었다는 것(순서가 맞는지 어떤지는 갑자기 급 자신없어 진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요론 식으로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QR코드의 활용은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피카소의 성공전 생애를 다룬 이 소설의 성격과 취지에 맞게 본문은 모노톤으로 가되 그의 작품을 궁금해하는 독자들을 위해 웹에 해당 작품을 올려두고 심지어 칼라로 감상하게 되어있는 것이지요. 핸드폰 화면으로 보는 거니 전문적인 감상은 안되더라도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콤 아쉬운건 작품에 대한 간단한 해설조차도 없다는 점입니다. 약간의 설명이 곁들여 있었다면 더욱 충실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3. 입체파 피카소를 입체적으로 그리다. 그래서 이양반을 좋아해? 말어?
[피카소의 색]은 묘한 느낌이 있는 책입니다. 한편으로는 피카소의 회고록처럼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장면 장면과 내면을 꼼꼼히 묘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제 3자가 관찰하는 듯한 뉘앙스로 피카소 본인과 주변 인물들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에이~~ 이건 저자가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써놓은거지? 뻥아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거참 심심하게 써놨구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읽을수록 저자가 궁금해지는 책입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피카소 친구처럼 이런 글을 써놓았느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것이죠. 게리 반 하스는 처음 만나는 작가인데 작가는 아니고 영화감독인 모양입니다. 게다가 여행 전문 기고가라고 하니 여러곳을 다니며 아마도 장소들을 보고 여러 자료들을 참고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몇 장면들은 정말 영화의 극적인 한 장면같이 느껴집니다. 전형적인 팩션소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 길지않은 책이었지만 피카소라는 이름과 입체파라는 단어 하나만 달랑 알고 있던 저는 이 책을 통해 '피카소의 전문가인척 코스프레 하기 신공'을 어느정도 장착을 했습니다. 더 갈고 닦을 수도 있지만 세상엔 읽을 책도 많고 그림이나 화가에 큰 관심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저에게 피카소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볼 사람도 없으니 그저 어느정도 이 양반의 생과 스타일에 대해서 이해한 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아시다시피 피카소의 생애를 찬찬히 살펴보아도 저랑은 너무 안맞는 스타일입니다. 그의 작품을 보아도 감탄을 할만한 눈과 감성은 저에게 없으니 그저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 정도로 생각하고 말려고 합니다. 저에게 이정도 스탠스를 갖게 해준 것 만으로도 이 책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