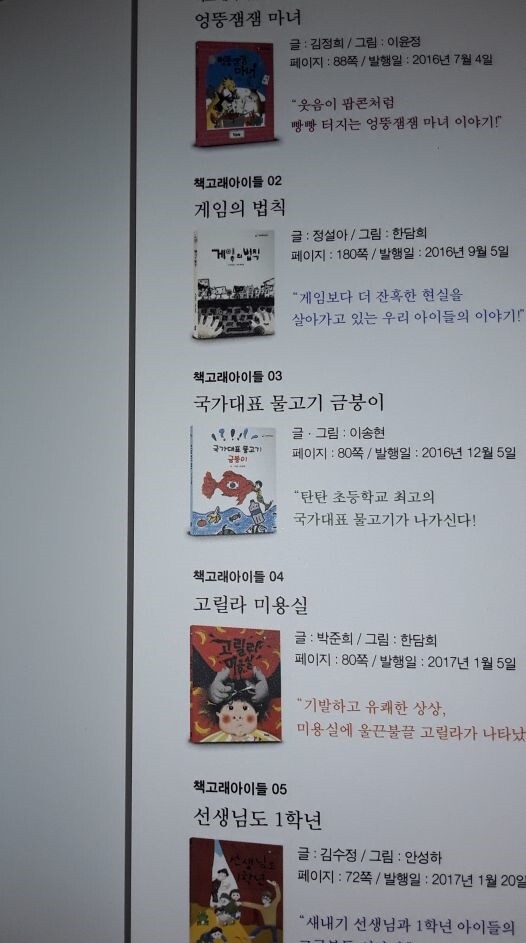-

-
아빠 냄새 -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작 ㅣ 책고래아이들 6
추경숙 지음, 김은혜 그림 / 책고래 / 2017년 4월
평점 :



정겹고
귀여운 스타일의 삽화를 그리시는 김은혜 작가님, 솔직담백하면서도 사물의 이면에 가려진 진실을 따스이 응시하는 사연을 즐겨 쓰시는
추경숙 작가님 두 분의 첫 콜라보입니다. 책고래에서 내는 동화들을 즐겨 읽는 편인데 이번 책도 역시 만족하며 읽었습니다.

작가의 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내 친구 엄마처럼 의사였으면 좋겠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돕느라 하루종일 황태에 묻혀 있던 제 모습이 딸아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싶었지요.
(중략)
".. 왜, 지금 엄마 직업은 마음에 들지 않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의사면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면서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잖아."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분명 또렷하게 기억하지만 혹시 작품 내용(본문)의 일부를 두고 머릿말로 착각했나 싶어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이 대목은 분명, 추경숙 작가님 본인 이야기였고, 따라서 글 중에 등장하는 귀여운 소망을 말하는 아이도
작가님의 딸이 맞죠.
여기에 대해 작가님이 정리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 또한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이, 어쩌면 어른들의 생각과는 사뭇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도전과 위협 따위에 대해 성숙한 소화와 이해 능력을 갖춰 간다는 뜻도 됩니다. 아이들(우리 자신들을 포함하여)은
대개는 활력에 넘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능력" 면에서 어른을 압도하지만, 대신 상처에 매우 민감합니다.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체 해결을 못 하고 엉뚱한 도피구를 찾는 어른을 두고 우리가 비판하기도 하는데, 이는
성인이 되어 마땅히 제 힘으로 해 냈어야 할 숙제를 방치한 데 대한 책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때로는 정반대로, 상처를 받지 않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마땅히 그러려니 짐작하는 상황 속에서도 의연히 넘깁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 때가 묻지 않아서겠지요. 질투와 증오와 타락한 승부욕에 물들지 않은 터라, 어른들이 찌든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을
전혀 몰라서입니다. "그게 뭔 소리에요?" 전혀 아니니까, 그들은 맑은 눈으로 또렷이 세상과 상대를 응시합니다. 왜곡은 언제나
"덜 된 어른들"의 몫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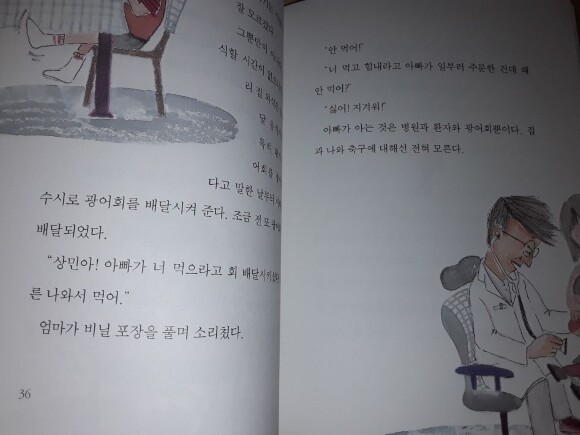
작품
속에는 세 아이가 나옵니다. 애들은 축구에 흠뻑 빠져 사는데, 이제 막 전학 온(아마 지방에서 왔나 봅니다) 도담이, 그 동네에
오래 살던 태영이, 그리고 의사 아버지를 둔 상민이, 이렇게 셋입니다. 이 중에선 전학생 도담이가 축구를 가장 잘 하나 봅니다.
상민이는 축구 잘 하는 태영이가 부러워서 언제나 친하게 지내려 애썼는데, 태영이보다 한 수 위로 보이는 도담이 때문에 친구
뺏길까 하는 걱정이 마음을 덮는군요. 한편으로 도담이의 놀라운 실력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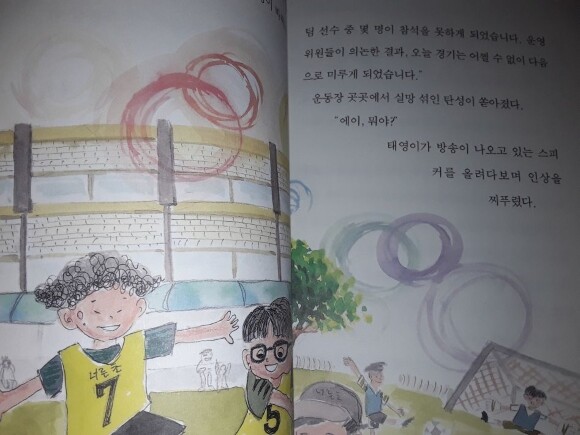
도담이
아빠는 생선 가게를 합니다. 담이는 가게에서 풍기는 생선 비린내가 언제나 마음에 안 들고 창피합니다. 그런데 아빠의 "냄새"에
대해 불만인 건 상민이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물론 소독약 냄새, 환기가 잘 안 된 특수 공간의 냄새는, 그 근원이 해롭거나
더럽지 않아도 계속 맡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죠. 하지만 상민이가 유독 "아빠 냄새"가 싫은 건,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아빠와의
소통이 안 되어서입니다. 같이 안 놀아 주는 아빠가 싫고 원망스러운 걸 냄새 탓으로 돌려 표현하는 거죠.
부족할
것 없는 여건 속에서 자랐는데 인성이 비뚤어진 애들을 흔히 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출장 자주 다니느라 애하고 놀아 줄 시간이
없던 부모 밑에서, 성장한 그 자녀가 진심 뜬금 없이 반미주의자가 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성향상 그런 주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잘 뜯어 보면 이론적 기초가 있거나 소신으로 굳어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에 대한 반항 심리가 이상한 핑계, 탈출구를 찾은
겁니다. 거창한 이슈를 입에 올리니,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한 미숙한 자신이 왠지 훌쩍 커보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사실은 아주
기초적인 숙제도 끝내지 못한 어린이에 불과한데도요(그래서 "어린이" 같은 지적이 나오면 비난조가 아니라도 엄청 싫어합니다).
이런
상처 입은 자존은, 엉터리, 뻥튀기된 가짜 자아를 앞에 내세우기 일쑤입니다. 물론 불행의 대가는 결국 본인이 치릅니다. 과소비나
엽색 행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물건에 대한 페티시적 집착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처방은 하나인데, 그저 그 친부모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자녀와 자주 소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동화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이는 상민이 아빠였는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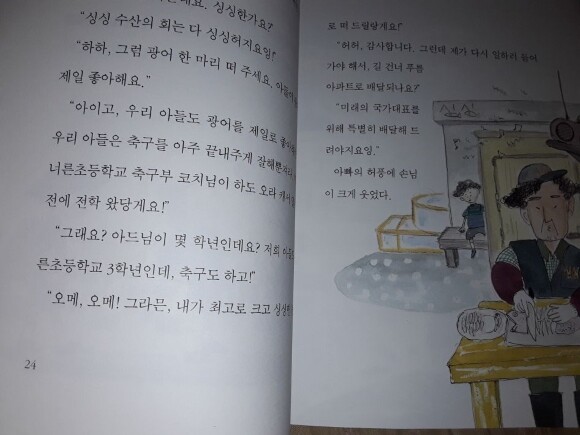
동화는
세 아이의 아빠들이 모두 모여, 서투르면 서투른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가식 없이 넘어지고 헛발질하고 웃으면서 축구 경기를
벌이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성인이 되면 참 불편한 게, 지위와 체면이 있다 보니 정직한 감정을 확 드러내면서 스트레스를 못 푼다는
겁니다. 드러낼 걸 못 드러내다 보니 속병이 생기겠죠. 축구로 친구가 된 아이들 덕분에, 이제 그 아버지들도 힐링을 합니다.
비결은 남의 애도 아니고, 바로 자기 아이와 잘 놀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작가님의 말 인용으로 서평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로의 냄새를 너무 그리워하지 않을 만큼 가까운 자리에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냄새를 너무도 사랑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