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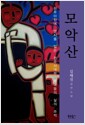
-
모악산
김태진 지음 / 푸른향기 / 2014년 6월
평점 :

품절

좀 창피한 고백이지만 저는 모악산이 어디에 위치한 곳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 이 아름답고 유장한 장편의 작가 김태진 선생은, "황산벌을 자식처럼 아우르고 그 터에 사는 모든 생령을 돌보는, 큰 어머니 같은 산"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 일대의 진산과도 같은 중요한 자연 지물인 셈이죠(아주 속되게 표현하자면요).
유난히 산지가 많지만, 그 자락에 사는 생명체들을 윽박지르거나 기 죽이거나 접근을 거부하는 산은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다 나지막하고 고만고만하며, 들어가서 꼴이라도 베자면 그 넉넉한 품으로 안아 줄 것만 같은 산들이 대부분입니다. 산지남 수지북의 풍수 지리 공식에 딱 들어 맞는, 농사를 돕고 추위와 더위로부터 사람을 지켜 주는. 때로는 흉악한 오랑캐로부터 그 땅의 주인을 보호해 주는, 우리네 심성과 살림살이를 오롯이 만들고 챙겨 주었던 그런 산. 따라서 이 소설의 "모악산"은 보편적인 한국인의 산 일반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액자 소설 <갑오년>을 맨 처음, 그리고 중간에 두르고 있는 구성입니다만, 이씨의 운수가 다하고 새로운 세상의 개벽이 움트던 구한말의 정세와, 일제가 패망하고 해방을 맞이하나 뜻하지 않은 동족 상잔으로 머나먼 외국(가까운 외국도 있었죠)에서 엄청난 수의 군대와 전쟁 무기가 이 아름다운 국토를 침노한 시대, 이 둘을 왔다갔다 하는 교차식 구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더 오랜 과거와 가까운 과거가, 서로 그 닮음꼴을 과거(미래)라는 거울에 비춰 보면서, 모악산이라는 자연, 아니 어머니 대지가 바라보는 가운데 숙명처럼 유사한 질곡을 되풀이하는 게 기본 골격입니다.
액자소설 <갑오년>은 짧은 분량이지만, 엄청 박력 있는 전설의 화소를 찰지게 풀어내면서 서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책을 받아 들었을 때, "아 이렇게 두꺼운 책이었어?"하며 다소 부담이 느껴졌지만, 인트로격인 액자가 워낙 강하게 독자를 빨아들이는 통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다 읽어 버렸습니다. "누가 남의 땅에 함부로 묘를 쓴단 말입니까 당장..." "아닐세, 명당은 원래 임자가 따로 있다지 않은가?"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소작인은 마치 귀신에 홀린 듯 아비의 시신을 잃게 되는데, 이 시신은 그 미스테리한 "명당'에 마치 자석처럼 빨려 들어가며, 태곳적부터 정해졌을 제 운명과 자손들의 팔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일지... 그 신비스러운 전기(傳奇)적 묘사가 너무도 생생해서, 좀처럼 손에서 책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소년 주인공 "금아"는, 작가님의 생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자전적 캐릭터인가 봅니다. 그닥 생활력 강한 가장은 아니지만, 광구 덕대로 주변의 인망을 얻고, 무엇보다 가족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버지, 한센병(나병)에 걸린 동냥아치에게도 넉넉한 대접, 무엇보다 대등한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잃지 않고 자식에게까지 가르치는 어머니, 이 모든 것이 예전 양반님네들의 올바른 가풍과 범절을 근대에까지 유지한, 전라도 교양 있는 지도층의 훈훈한 인심과 도덕이었던 셈이죠. 외세의 침탈과 전란을 겨
으며, 반상의 차별이 사라진 동시에 이런 미풍도 흔적 없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대립, 부와 빈의 격차 심화, 한반도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양보 없는 대립을 또다시 이 좁은 반도에서 노정하고 있는 가운데, 모악산은 그 오랜 사연을 다 지켜 본 눈으로 우릴 어떻게 응시할지, 그 말 없는 입으로 으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을지, 이 길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으며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