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하면 손실이 기대이익을 상회합니다."
"마케팅 차원에서 봐 줄 필요도 있다구."
어 느 새 일상사무의 대화에서도, "마케칭 차원에서"라는 말이, 당장의 대차대조표 분석을 휴리스틱하게 뛰어넘자는 의미로 관용화한지가 꽤 된 듯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근거가 박약한 말입니다. 손해면 손해고 이익이면 이익이지, 마케팅 차원에서 넘어가자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분위기상 그것도 일리있다 싶을 때 그냥 묻어가는 의미로 잘 쓰이는 말입니다.

SNS가 혁명을 일으킨 건 정치나 사교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다소 막연하지만 "소통"의 방식과 수단에서 그 의의를 다하고 마는 것도 아닙니다. SNS의 파워가 진정 큰 파고를 몰고 올 분야는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 소통"이란 비경제적, 비물질적인 정서의 교감이 위주가 되는데, 사업을 끌어들이는 건 벌써 소통의 본질을 이탈하는 것 아닌가 거부감이 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월든 식의 삶을 고집하는 이가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에서건 무엇인가를 구입하 고 소비해야만 문명인으로서의 생존이 가능합니다. 누구에게서 무엇을 사는 문제가 우리를 떠날 수 없다면, 마케팅의 문제는 보편적으로 대중에 밀착된 이슈입니다. 누구한테서건 무엇을 사야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물건과 서비스를 사라고 권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마케팅의 본질입니다. SNS를 통한 소통이 일상화된 시대에, 마치 프라이빗한 친구처럼 다정하고, 가깝고, 신뢰감 있게 다가오는 마케터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SNS 마케팅의 승자이고, 모바일 퍼스트를 넘어 모바일 온리를 예견하는 시대에 SNS는 마케팅 전쟁의 유일한 결전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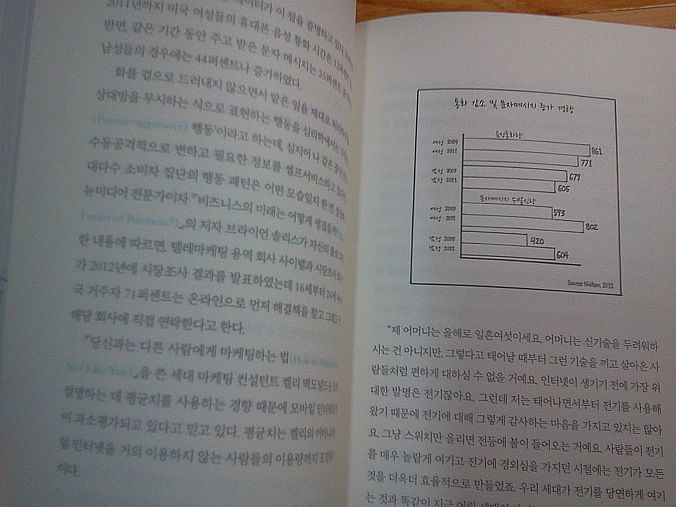
저자는 마케팅의 개념이 어떻게 진화를 거듭해 왔는지에 대해 속시원하면서도 적실성 넘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1세대 마케팅 기법은 "최초상기"입니다. 구 매자, 수요자에게 "그 물건을 파는 내가 바로 여기 있소!"라며 "들이대듯"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시장에서 상인들은 서로 질세라 목청을 높여가며 손님을 끕니다. 유흥가의 삐끼들은 준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갈 길 바쁜 손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일단 고객의 뇌리에 남기 위해, 잦은 반복과 노출로 웨어와 브랜드를 "들이대고" 보는 게 이 최초상기 수법입니다. p28에 나온 "히트곡제조기"라는 트위터리안이 그 좋은 예라며 저자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물론 긍정의 예가 아닌 "대단히" 부정적인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이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나, 책 후반부에서 매우 희화화한 낵맥락에서 다시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합니다) 이 방법은 첫째 노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없는 먼 위치의 상대에게 전혀 쓸 수 없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이 기법이 기업의 신뢰를 깎아먹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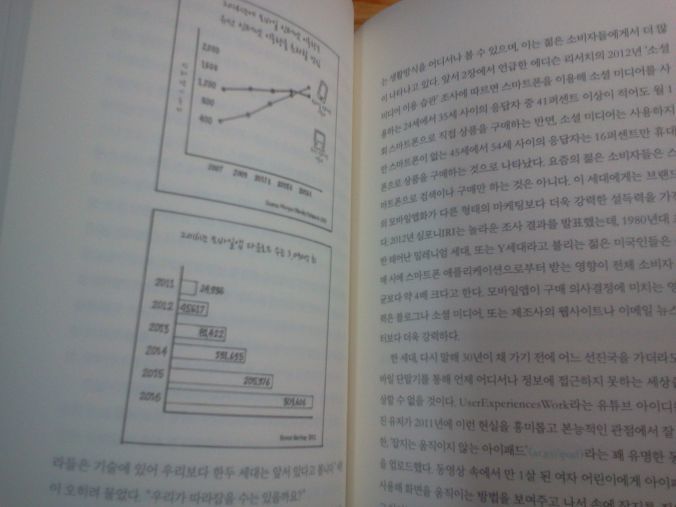
마케팅의 다음 발전 단계는 "상위노출"입니다. 이 기법의 대표 주자는 전화번호부 옐로우페이지입니다.
과 거에는 이 기법에 대해 대단히 혁신적인 발상의 예로 많이 거론하였으나, 월드와이드웹이 등장한 후로는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했죠. 이후에는 주로 검색 포털에서 이 상위노출의 이슈가 많이 문제되었지만, 우리가 이미 겪어서 아는 대로, 한번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는 정보는 의사 결정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큰 변혁을 맞고 있는 시대에 있어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광고라면 그 내용의 양질 여부에 관계 없이 지긋지긋해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무리 도움이 되는 정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인포머셜"이라고 해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마케팅에 삽입해 접근성 제고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이런 기법 역시, 소비자가 결국은 염증을 낼 "트로이의 목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 체 그럼 이 변덕스럽고 까다로운 소비자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충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소비자를 내 고객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게 바른 진로로 들어서는 첫걸음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소비자는 고객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나는 고객에게 판매자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친구로서 접근하는 겁니다. 만약 그가 전정한 친구라면, 당장의 이익이 없다고 냉정하게 서비스 제공을 거절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이미 친구가 아니죠. 친구라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친구를 적시에 도울 줄 아는 게(a friend in need) 진정한 친구(a friend indeed)입 니다.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무엇이 궁극의 마케팅일까요? "소비자를, 친구의 눈높이에서 도와 주라!"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도움을 주는 이를 우리는 친구로서 "믿게" 됩니다.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회사는 충성스러운 고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자는 멋진 격언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움(helping)과 판매(selling)는 글자 두 개 차이이다. 잘 팔려면, 평소에 잘 도와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SNS시대에, 사람들은 지역과 대면 접촉 기회를 떠나 다양한 이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 수단이 바로 모바일 SNS 입니다. 이런 관계의 유지에서, 신뢰는 소통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요건입니다. 이런 친밀한 네트워크 안에, 기업은 더 이상 요란한 구호와 쇼맨십을 앞세운, "광고라는 게 팍팍 표시나는" 구태를 뒤집어 쓰고는 침투할 수 없습니다. 동창생처럼, 여친처럼, 은사처럼, 부모님처럼 그 망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네트웍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판매원의 복장을 하고서는, 더 이상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친구에게서만 무엇을 믿고 삽니다. 친구 아니면 팔 수 없습니다. 친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어 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처자는 그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모바일 기기에 적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광고 따위는 치워버리고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무 속셈이나 계산을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정말 친구에게 하듯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내 업종에서는 경쟂자 그 누구도 그런 방법을 쓰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대답도 명쾌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한 분야에서 종전과는 다른 수위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았다 싶으면, 그 유사 분야가 아닌 전혀 동떨어진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고객의 눈높이가 이미 높아졌는데, 종전의 방식을 고집할 수는 없죠. 더군다나 경쟁자가 안이한 태도를 늑장을 피우고 있다면, 바로 그때야말로 업계 선두로 치고나가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걸 저자는 상기하고도 있습니다.
어 렵사리 개발한 앱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앱이 소비자에게 널리 애용되게 방안을 따로 마련해야 하고, 처음부터 널리 쓰이고 입소문이 날 앱을 골라 개발해야 합니다. 앱의 기능 우수성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그 존재 여부를 모르는 앱은, 벌써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마케팅을 마케팅하라."는 명제의 본 뜻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이의 홍보, 진열은 마케팅 3.0의 한 가지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앱이 아니라, SNS 환경 그 자체고, 어떻게 하면 관계망 안에 "친구"로서 단단한 자리를 잡느냐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