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코스키의 시집을 샀다.

보들레르와 브레히트, 랭보와 백석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부코스키를 선택했다.
이런 날것같은, 의미라고는 1도 없을 것 같은 글을 쓰는 부코스키가 좋았다.
그의 소설도 좋지만 시는 더 꿀렁거린다.
시집을 샀는데 그냥 좋았다고 했더니 친구가 심각하게 (?) 카톡을 보냈다.
-부코스키가 왜 좋아?
라고..
-그냥 좋아 왜? 라고 반문하자.
친구는 불편하다고 했다. 우체국을 겨우 읽고 여자들을 읽다가 덮었다고 했다.
오버스럽기까지 한 마초같은 글이 소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덧붙여 롤리타를 읽으며 거북했었다고 했다.
나보코프를 아주 좋아하는 나..
-내가 아마 피학적이거나 변태적일만큼 적나라한걸 좋아하나봐..
라고 대답을 하고 한참 웃었다.
절친인데, 서로 멀리 떨어져있어도 언제나 사랑하고 서로를 읽고 기댈 어깨를 내주는 친군데 이렇게 취향이 다르다니..



우체국을 읽고, 여자들을 읽고 얼마전 호밀빵 햄 샌드위치를 배송받았다.
항해사 일을 오래했다는, 바다 위의 일을 호메로스의 오딧세이보다 환상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우리 동네 백씨 할배와 닮았다.
할배는 막걸리 한 잔을 묵묵히 드시고, 두 잔 째를 마시며 주위를 살피고 세번째 잔을 따라놓으시면 멀고 먼 바다의 이야기를 하신다.
어쨌든, 부코스키가 왜 좋아? 라는 말에 나는 날것이라서 좋다고 했다. 모순적이며 마초적으로 보일만큼 허세 가득한 유약함을 들켜서 좋다고 했다. 삶의 진실이랄지 의미랄지 하는 것에 묶이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 오히려 애틋하리만치 끌어안은 삶에 대한 애정으로 읽혔다.
부코스키가 왜 좋아?
라는 물음이 자꾸 들린다.
그냥..이라고 대답한다.
그러고보니 나는 사드도 매우 좋아한다.


내 책꽂이 한 쪽에 나란히 세워져있는 책..그 옆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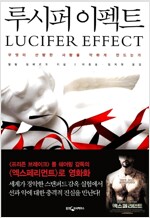
참 맥락없이 읽는다. 닥치는대로..잡히는대로..
어쨌든..아직 부코스키는 본능의 해방구같은 의미인지도 모른다.
당분간은 호감으로..자주 선택될 부분으로 남겨두기로 한다.